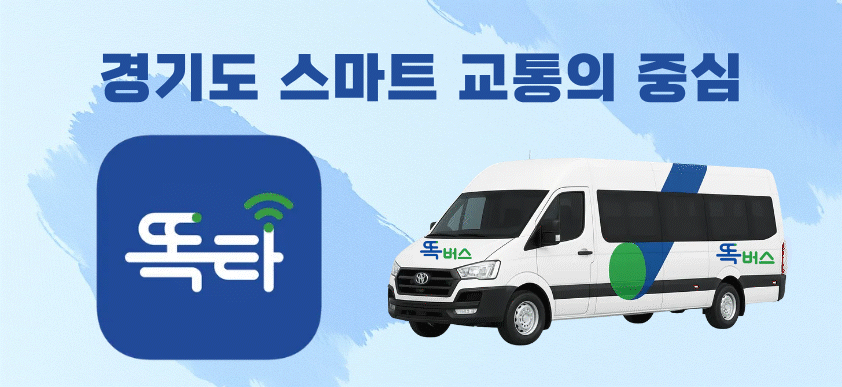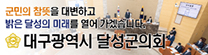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바이오의약품 시대(下)] “자금력만 믿었다간 낭패” 그들은 왜 실패했나
일부 대기업들,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주목 받지 못한 이유
 김유림기자 |
2017.07.05 10:32:14
김유림기자 |
2017.07.05 10:32:14

▲아모레퍼시픽, 롯데, 한화 등 제약산업에 뛰어들었던 대기업들이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생물공학 기술을 응용한 ‘꿈의 약품‘으로 불리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국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약업계 지형이 출렁이고 있다. 이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설비와 연구·개발(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해외시장까지 넘본다. 하지만 한 길만 걸어온 제약회사와 달리 이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CNB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이 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하고 있다. 상(上)편에서 바이오·제약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다룬 데 이어, 이번에는 시장에서 실패한 일부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봤다. (CNB=김유림 기자)
제네릭 시장만 바라보다 ‘닭 쫓던 개’
신약개발 나섰지만 기술력 딸려 포기
리베이트 사건 ‘데쟈뷰‘…접는게 상책
대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분야가 워낙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보니 경험이 부족한 대기업들이 자본력만 믿고 덤볐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화와 아모레퍼시픽은 의약품 시장에서 철수하며 쓴 맛을 봤다.
한화는 지난 1996년 의약사업부를 신설, 2004년 에이치팜을 합병하면서 드림파마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6년 한국메디텍제약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의약품 시장 공략 채비를 마쳤다.

▲드림파마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였던 당시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드림파마는 대기업 계열사라는 간판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했다. 2009년 매출 1234억원, 2010년 1005억원, 2011년 878억원, 2012년 854억원, 2013년 930억원으로 꾸준히 악화됐다.
특히 2011년에는 800억원대의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결국 2014년 드림파마의 지분을 100% 보유한 한화케미칼은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드림파마를 미국 제약사 알보젠에 매각하며 제약사업을 접었다.
뒤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그룹 차원의 투자를 벌인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철수했다. 한화케미칼은 2015년 오송 소재 바이오공장을 의약품위탁생산기업 바이넥스에 넘기면서,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시밀러 ‘다빅트렐’ 품목허가도 자진 취하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CNB에 “애초에 제약이 주력사업이 아니었다”며 “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철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제약의 주력제품이었던 케토톱 CF. (사진=CF 캡처)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13년 계열사인 태평양제약의 의약품 사업을 한독에 매각하면서 제약시장에서 백기를 들었다.
태평양제약은 지난 1982년 태평양화학 의약품사업부에서 분사했다. 그러나 파스 제품 ‘케토톱’ 이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케토톱 매출이 2006년 423억원으로 회사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했지만, 파스류의 건강보험급여 제한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추락하면서 전체 매출도 곤두박질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201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태평양제약의 사명을 에스트라로 변경하면서 태평양제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약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고, 메디컬뷰티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제약 사업부만 매각한 것”이라며 “사명을 에스트라로 바꾼 이후부터는 메디컬뷰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 2002년 아이와이피엔에프를 인수, 롯데제약을 출범시키며 의약품 시장에 진입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사업 집중화 등을 이유로 10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2011년 롯데제약은 롯데제과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으로 흡수됐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한화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신약 개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 보니 기존 제네릭(복제약) 시장에서 무리하게 영업력을 확대하려다 철퇴를 맞았다. 기존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라는 무리수를 두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드림파마와 태평양제약 모두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곤혹을 치뤘다. (사진=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인 태평양제약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전국 병원 120곳의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1692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태평양제약 안모 대표와 김모 영업상무,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박모씨 등 의사 10명 등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여파는 태평양제약의 제약부문을 인수한 한독에게까지 미쳤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한독의 브랜드 이미지마저 실추된 것이다.
드림파마는 한화그룹 계열사였던 시기인 2007~2008년 2년간 의사와 약사들에게 37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 이 과정에서 뒷돈 비용에 대한 법인세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탈루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대표와 최모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두 기업이 리베이트 영업에 목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신약 개발이 사실상 실패하자, 당장의 수익에 급급해 제네릭(복제약)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제네릭은 의약품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똑같은 약품을 수백 곳의 회사가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화가 없다. 따라서 중소형 제약기업들은 ‘리베이트’를 활용한 영업방식에 의존하게 됐고, 잘못된 관행을 대기업 계열사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지난 2월 서정진(가운데)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프랑스 파리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한 ‘2017 글로벌 파트너사 CEO 전략회의(International Summit 2017)’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9개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최고경영자(CEO)와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대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신약은 1%의 성공을 바라보고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한미약품, 셀드리온 등 오직 한 길만 걸어온 전문 제약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R&D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지만, 대기업들의 경우 신규사업이다 보니 기술력의 부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은 오랜 시간 공들이는 R&D 투자가 필요하고, 고위험-고수익 성격이 강한 전문적인 분야다보니,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안정적인 사업을 해온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큰 사업”이라며 “재벌들이 ‘잭팟’을 터트릴 수 있다는 기대로 물불 안 가리고 유행처럼 덤벼들고 있지만, 제약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B=김유림 기자)
[관련기사]
[바이오의약품 시대(上)] 삼성·LG·SK·CJ…‘미래 먹거리’ 전쟁 중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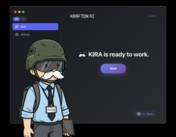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