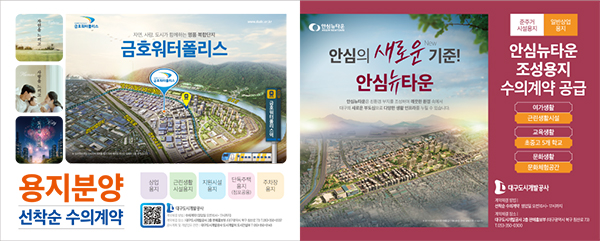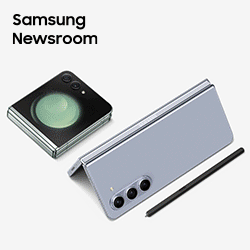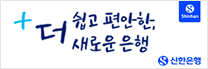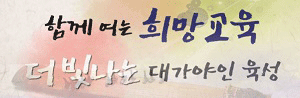▲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 사회와 도시를 들여다보는 키워드로 ‘용적률’을 제시한 한국관 전시.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잘 알려졌듯이 올해 건축전의 전체 주제는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이다. 여기서 한국관은 ‘용적률(Floor Area Ratio) 게임’을 주제로 선택했다. 한국 건축의 전선을 용적률이라고 본 셈인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축 비엔날레에서 전시 주제가 ‘용적률’이라니 어딘가 좀 어색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한국관 전시는 왜 용적률이 지난 50년간 한국, 특히 서울의 변화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최전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줬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용적률에 대한 사적 욕망이 어떻게 도시의 공적 가치로 바뀔 수 있는지도 함께 탐색했다.
이를 이야기로 정리한다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그간 한국 사회의 용적률 게임은 건축주와 정부, 건축가 사이에서 발생했다.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 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려 수익이 극대화되길 원했고, 정부는 공공 영역에서 법과 제도로 시장을 통제했다. 여기에 건축가가 양자를 중재하고, 협상을 벌이면서 건축물을 공급해온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됐다. 건축주들은 더 이상 건물 면적을 늘린다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러면서 중간 단위의 건축물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뛰어들었다. 이로써 용적률 게임은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올해 비엔날레 전시와 같이, 최근 건축계에서 건축의 좁은 영역을 넘어 도시 환경과 사회를 아우르며 건축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흥미롭다. 베니스건축대학(IUAV)에서 진행한 서울시의 9개 도시·건축 프로젝트를 선보인 전시와 세미나 역시 마찬가지다.
‘리사이클/업사이클’을 주제로 한 이 전시는 도시 재생에 초점을 둔 9개의 서울시 사업을 소개했다. 서울역 7017나 동주민센터 프로젝트,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주택 등을 통해 서울시가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공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도해 베니스비엔날레 개막 주간에 맞춰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내년 9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주최할 예정이다. 베니스에서 비엔날레 기간 세계적인 건축가와 도시건축학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세미나와 전시를 연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이제 베니스나 시카고와 같은 대규모 건축 축제가 열리는 셈이다. 더구나 이 건축 축제는 ‘도시건축’이란 이름에서 보듯, 건축의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 도시와 사회를 반추하고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오래된 도시,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바쁜 도시, 서울에 대해 우리 스스로 좀 더 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안창현 기자























![[테크크] 역대급 무더위 예고에…후끈 달아오르는 에어컨 시장](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2883879_176x135.jpg)
![[ESG경영시대(122)] 하이트진로의 ‘푸른 동행’…‘생활 속 친환경’ 이야기](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3060409_176x135.jpg)


![[이현균의 골프 칼럼] 끊임없는 ‘골프장 회원자격’ 특혜 논란…가이드라인 분명히 해야](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4/art_1743391222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