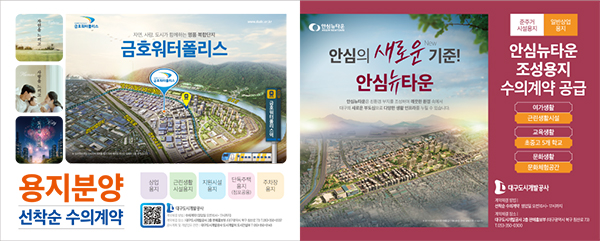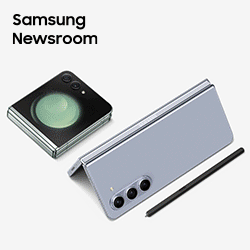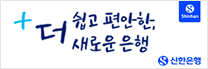2015년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의 원년’이 될 수 있을까?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확실히 곳곳에서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나서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책을 펴고 있고, 소비자들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15년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의 원년’이 될 수 있을까?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확실히 곳곳에서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나서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책을 펴고 있고, 소비자들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벌써 올해에만 국내에서 전기자동차와 관련해 굵직한 국제행사가 두 차례나 연이어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3월 제주에서 국제전기차엑스포가 열리더니, 최근에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28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28)’이 개막했다.
특히 ‘전기차 올림픽’이라는 별칭이 붙는 EVS28은 전기차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7g/㎞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환경부는 ‘2015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700억 원을 투자해 3000여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물론 자동차기업 입장에서도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친환경 이슈에 대한 범국가적인 연대와 국제적인 흐름을 외면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이제 친환경차는 향후 시장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부문이 됐다. 앞으로 급증할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전기차는 얼마나 보급됐을가?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000여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의 0.45%에 불과해 미국(39%), 일본(16%), 중국(12%)에 크게 못 미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부진한 이유로 국내 충전 인프라의 미확보, 배터리 성능으로 인한 짧은 주행거리 등과 함께 전기차의 비싼 가격을 주요하게 꼽는다. 실제 전기차 가격은 같은 차종의 일반 자동차에 비해 2배 가까이 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친환경차 보급 방안으로 보조금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동차회사 입장에서도 정부 보조금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의 큰 변수라고 생각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에서 자사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조금이 되려 친환경차 보급이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보급하겠다는 3000여대 이상은 실제 전기차 보급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여기서 친환경차가 대중에게 어필하는 몇 가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BMW의 1억9900만 원짜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i8’은 올해 사전계약 물량 190대를 한 달만에 완판하는 기록을 세웠다. i8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기존 BMW의 전기차 i3는 한 달간 20여대 남짓 판매됐다.
또 르노의 스쿠터를 닮은 2인승 전기차 ‘트위지(Twizy)’는 그간 교통관련 법규로 국내 도입이 미뤄졌다. 2012년 처음 출시된 트위지는 유럽에서만 1만5000대 이상 판매됐다. 개성 강한 디자인과 다양한 쓰임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끈 모델이다. 카쉐어링이나 일반 가정의 세컨드카, 배달 서비스나 근거리 물류 운송에까지 활용됐다.
최근 정부와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며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인 르노삼성의 트위지나 BMW의 ‘i8’은 친환경차가 어떻게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BMW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고성능의 수퍼카로 분명한 차별점을 줬고, 르노는 친환경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였다. 진정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격적인 혜택 이외의 다양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안창현 기자






















![[생생영상]](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4/art_1743554716_176x135.jpg)




![[테크크] 역대급 무더위 예고에…후끈 달아오르는 에어컨 시장](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2883879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