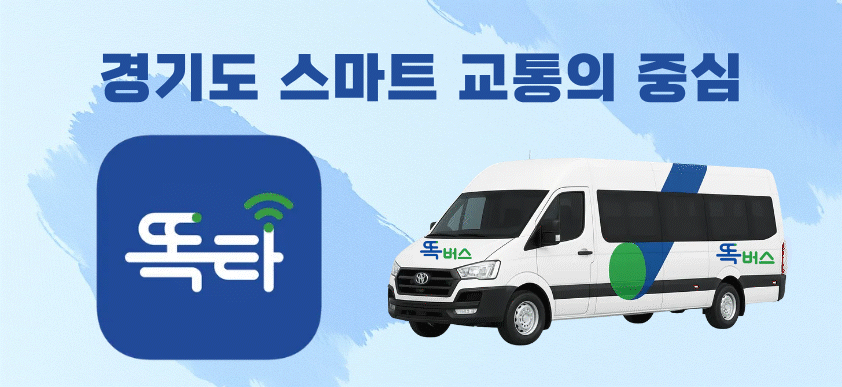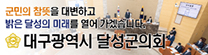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문재인 대통령과 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젊은 사람들이 갓뚜기(God+오뚜기)라고 부른다면서요?” 지난달 청와대 ‘호프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 건넨 덕담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개최를 알리며, 국내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 초대장을 보냈다. 간담회 초청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 순위 14위까지다.
권오현 삼성전자(1위)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2위) 부회장, 최태원 SK(3위) 회장, 구본준 LG(4위) 부회장, 신동빈 롯데(5위) 회장, 권오준 포스코(6위) 회장, 허창수 GS(7위) 회장, 금춘수 한화(8위) 부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9위) 회장, 정용진 신세계(10위) 부회장, 황창규 KT(11위) 회장, 박정원 두산(12위)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13위) 사장, 손경식 CJ(14위) 회장, 함영준 오뚜기(232위) 회장 등 새 정부와 첫 상견례인 만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당시 주택사업으로 재계 15위까지 오른 부영그룹이 밀려나고, 200위대의 오뚜기가 초대받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에서 기업들에 보내는 무언의 경고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앞서 부영은 불투명한 경영과 갑질 논란 등으로 김상조號 재벌 개혁의 첫 고발대상이 된데다, 임대주택의 월세 인상 등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역행했다는 논란이 잇따랐다.
반면 오뚜기는 각종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한국 재벌들 사이에서 남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편법 증여를 일삼는 대기업 2, 3세들과 달리, 함 회장은 아버지 함태호 명예회장이 타계한 후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1500억원을 성실하게 납부 중이다.
또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는 함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1%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직원 3099명 중 36명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오뚜기 역시 ‘완벽한 모범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총수 일가의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오뚜기의 대부분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로 매출이 발생한다. 지난해 오뚜기라면은 매출액 5913억원을 달성했는데, 이중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이 5892억원으로 99.64%에 달한다. 또 오뚜기물류서비스(72.6%), 오뚜기SF(63.9%), 상미식품(97.6%), 알디에스(86.4%) 등도 내부거래의 의존도가 상당하다.
함 회장은 오뚜기(28.6%)와 오뚜기라면(35.6%), 오뚜기제유(26.5%), 풍림푸드(28.6%), 오뚜기물류서비스(16.9%), 오뚜기SF(14.4%). 알디에스(60%). 애드리치(33.3%), 조흥(6.9%)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배당으로 확보한 현금만 1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오너 2, 3세가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싼값에 사들이고 → 일감을 몰아줘 → 회사의 가치를 높여 → 배당금을 챙겨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통상적인 재벌들의 꼼수다.
게다가 오뚜기는 각종 먹거리 안정성 논란에도 휩싸인바 있다. 앞서 오뚜기는 2015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유전자조작식품(GMO) 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오뚜기 포함 동원과 사조, CJ제일제당 등 총 4개 식품 기업만 거절했다. 또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롯데제과 다음으로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식품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처럼 오뚜기는 하얀 가면 뒤에 불편한 진실이 가려지고 있지만, 대부분 국민은 이정도 논란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 규모 363조2000억원의 삼성은 상속세 16억을 납부한 반면, 자산 규모 1조5000억원의 오뚜기는 상속세 1500억원을 내는 것 만으로도 ‘갓뚜기’라고 불릴 만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근로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하지 않는 게 국내 대기업들에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청와대가 재계 순위 100위권도 아니고, 200위권 밖의 중견기업에 초청장을 보낸 것을 보고 총수들은 느낀게 아무것도 없을까?
갓뚜기 열풍이 불고 있는 우리 현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CNB=김유림 기자)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176x135.jpg)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
![[내예기] ‘K-워터’ AI로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도전과 혁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16194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