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사와의 코프로모션(Co-Promotion, 다른 기업의 영업망이나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울고 웃고 있다. 코프로모션 변경은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내사들이 다국적사들의 코프로모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CNB=이동근 기자)
다케다·화이자 변심에 희비 엇갈려
오리지널 판권 이동에 소송전 돌입
“자체 경쟁력 길러야” 목소리 높아
최근 일본계 제약사인 다케다제약이 국내 제약사들을 웃기고, 울렸다. 비타민제제 ‘액티넘’의 공동판촉 파트너를 지오영, 동원약품 등 협력 도매업체에서 4월부터 동화약품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 역시 폐경 관련 증상 및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치료제 ‘듀아비브’의 판매 계약자를 현대약품에서 지난해 12월 한독으로 변경했다.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의 코프로모션 대상 변경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각 제품의 매출이 주는 영향이다. 다국적사들이 국내사에 판매를 맡기는 제품들은 대부분 오리지널(자체개발 신약) 제품들이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판매사에게 상당한 매출액을 안겨준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 중 상당수는 상품 매출(타 제약사의 상품을 도입, 판매해서 얻는 매출) 비중이 적게는 45%, 많게는 75%까지 이른다.
다국적사 오리지널 제품은 다른 제품의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고혈압 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는 해당 제품을 마케팅 하면서 자사의 다른 약물도 함께 마케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작은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물 없이 국산 제네릭만 갖고 영업하기 매우 어렵다. 리베이트도 금지된 마당에 오리지널 품목, 아니 개량신약 하나도 없다면 병원에서 교수 얼굴 보기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실익 적다”는 지적도
하지만 실제로 큰 이익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국적제약사들도 위와 같은 국내사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원가를 최대한 높이려 해서다. 심한 경우 오리지널 약은 팔면 팔수록 손해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현장 제약 영업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국내 B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물론 유한양행처럼 코프로모션을 맺으면 매출을 크게 올려주는 국내사의 경우 꽤 마진(중간이윤)이 많이 남는 식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나 우리(B제약사)처럼 작은 제약사는 남는 게 거의 없다. 다국적사들이 마진을 적게 남겨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는 것은 외형적인 매출을 키울 수 있고,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사 ‘갑질’에 휘청
문제는 이같은 다국적사들의 계약 변경에 따라 국내사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유한양행만큼은 아니지만, 대웅제약처럼 도입 상품 매출(타사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매출)의 비중이 큰 회사들은 다국적사가 계약을 종료할 경우 크게 ‘휘청’하기도 한다.
참고로 2018년 1~3분기 기준 유한양행은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0%가 넘으며, 대웅제약의 상품 매출 비중은 40%에 달한다. 이 외에 국내 상위사들도 한미약품을 제외하면 상품 매출비중이 대부분 40~60%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와 체결했던 뇌 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의 판매 계약이 종료되고, MSD가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자누메트’, ‘자누메트XR’과 고지혈증치료제 ‘바이토린’, ‘아토젯’에 대한 판권을 회수하면서 약 2000억원이 넘는 매출액 감소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 회사는 2009년에도 14년간 판매해 오던 보툴리눔톡신 ‘보톡스’의 판권이 계약기간 종료 1년을 앞두고 원 개발사인 엘러간이 판권을 회수해 감에 따라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안국약품도 독일 엥겔하르트사의 진해거담제 푸로스판을 2000년부터 단독으로 판매하면서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로 키웠지만, 2016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11년 판권을 회수당했고, 한독도 2014년, 다케다제약의 기관지치료제 ‘알베스코’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의 판권을 회수당한 바 있다.
계약이 종료된 측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당장 매출이 많이 감소할 뿐 아니라, 판매 전략을 갑자기 바꿔야 하거나, 해당 제품을 팔기 위해 고용한 인력들을 갑자기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사들은 ‘힘센 다국적사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소송전을 벌이기도 한다. 현대약품의 경우 ‘듀아비브’에 대한 계약이 종료된 뒤 불공정거래혐의로 한국화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안국약품도 엥겔하르트사를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체 경쟁력 키워야”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제품 판매 전략을 벗어나 자체 개발 제품을 보유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중소제약사들은 고가의 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당장 눈 앞에 매출을 키울 방법이 있는데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국내 제약사들을 취약하게 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미약품처럼 자체 개발 제품을 통한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국내 매출의 93.3%를 자체 개발 제품을 통해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중소제약사 중에도 비용 부담이 비교적 덜하고, 개발 기간이 짧은 개량신약을 개발해 경쟁력을 키우는 제약사들도 있다”며 “유한양행처럼 덩치가 큰 제약사들부터 다국적사들의 오리지널 제품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이동근 기자)




















![[CNB뉴스 위클리픽-통신] SK텔레콤, 세계 최초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6/art_1744934512_176x135.jpg)


![[화랑미술제] 지나손, 주목받는 이유(갤러리바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6/art_1744937239_176x135.jpg)
![[뉴스텔링] 건설사들, 매머드급 수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6/art_1744874209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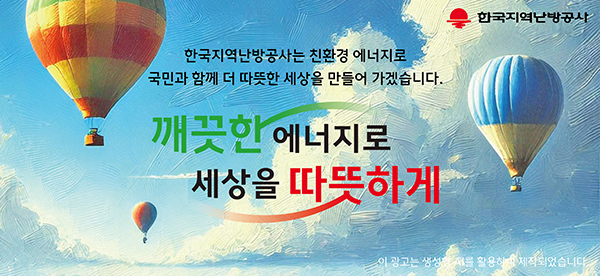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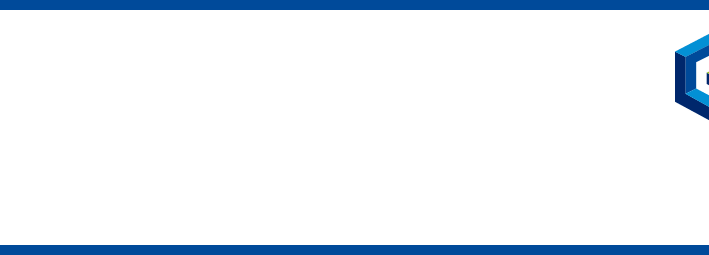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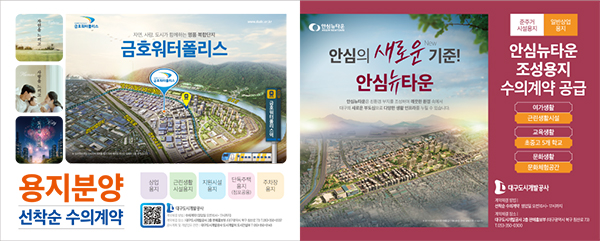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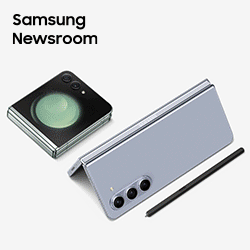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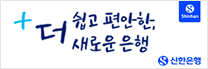








![[CNB뉴스 위클리픽-통신] SK텔레콤, 세계 최초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6/art_1744934512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