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지난 12일 오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철책 너머가 임진강이고 강을 건너면 개성공단이다. 이슬비가 물안개를 만들어 강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다. (사진=도기천 기자)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들이 북한땅을 빠져 나온 다음날인 지난 12일, CNB가 휴전선 최접경 지역인 민통선 마을을 다녀왔다. 이날따라 한반도 상황처럼 날씨가 짓궂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웃고, 봄은 오고 있었다. (CNB=도기천 기자)
물안개 덥힌 ‘분단70년’ 철책선
임진강 DMZ 너머가 개성공단
사드·미사일…마을은 평화로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명 ‘민통선 마을’로 불리는 그곳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가까웠다. 서울에서 불과 40킬로 남짓한, 채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분단 70년의 무게는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 이내에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을 이른다. 민통선 마을의 북쪽 끝 지점이 남방한계선이고 그 한계선을 넘으면 비무장지대다. 원주민 외에는 거주할 수 없고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외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민통선. 검문소에서 완전무장한 해병대 병사가 빗속에서 상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사진=도기천 기자)
마을은 온통 물안개로 덮여 있다. 전날 밤부터 내린 가랑비가 임진강 물줄기와 만나 안개마을을 만들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애기봉이 있다. 155m높이의 산봉우리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곳에 솟은 봉우리.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154고지가 애기봉이다.
애기봉 등탑 점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적 목사는 “남쪽에서의 일방적 점등은 북한을 자극시킬 뿐 남북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북단 교회로 알려진 ‘민통선평화교회’의 이적 목사. 유사시에 대비해 교회 지붕이 위장막으로 덮여있다. (사진=도기천 기자)
이 목사는 대북 전단 살포 반대운동, 평화시 낭송회, 오작교 예술제, 분단체험학교 등 다양한 반전평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2년 전에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해외동포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이 화근이 돼 교회가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는 등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 목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야 한다.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던 시절에도 남북경협이 끊어지진 않았다.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명 ‘민통선 마을’로 불리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난 12일,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도기천 기자)
서울서 1시간 거리, 70년간 길 막혀
교회를 나와 주민들을 만났다. 이곳에는 50가구 12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강물이 아닌 용천수(지하수)로 농사를 지어 이곳 ‘쌀’이 유명하다.
마을경로당에는 20여명의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휴전선이 코앞이지만 공포심은 없어 보였다. 30여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었다는 정유현씨(74)는 “남북 대치상황이 하도 자주 있는 일이라 이제는 무덤덤하다. 북한이 나이든 농군들밖에 없는 이 마을에 설마 포를 쏘겠나. 도시보다 오히려 여기가 안전하다”고 말했다. 떠들고 웃고, 함께 밥을 해먹는 이들의 모습에서 전쟁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민통선평화교회 부설 분단체험학교. (사진=도기천 기자)
군인들이 밤낮으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얼굴에 결기가 넘친다. 촬영이 금지돼 표정을 담을 수는 없었다. 최정예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곳에는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 밤낮으로 북을 향해 선무방송(宣撫放送)을 한다.
풍경은 평화로웠다. 봄비인지 겨울비인지 모를 이슬비가 60년 넘게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땅을 적시고 있었다. 철책 너머가 임진강이고, 강을 건너면 개성공단이다. 평소에는 개성 송악산이 뚜렷이 보이고, 저어새들의 번식지인 유도(留島)가 눈앞에 펼쳐진단다.
강 위의 섬 ‘유도’는 북한이 대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온 소 한 마리를 품어준 적이 있다. 그 소는 남쪽 소와 인연을 맺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새끼소는 제주도로 갔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남북의 슬픈 현실만큼 짙은 안개가 유도를 덮고 있다.
(CNB=도기천 기자)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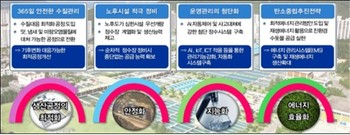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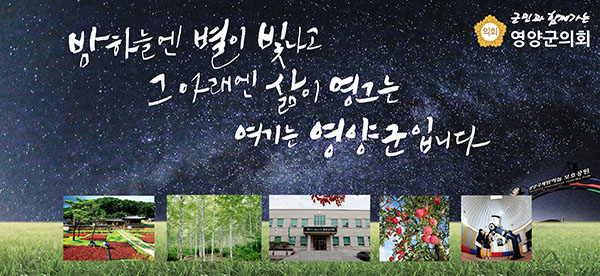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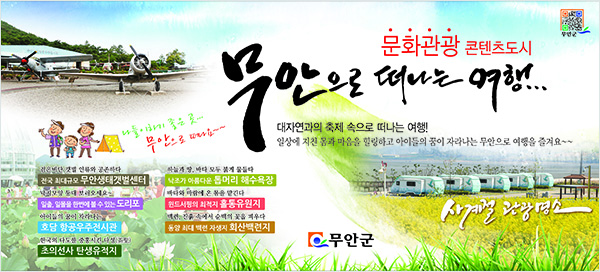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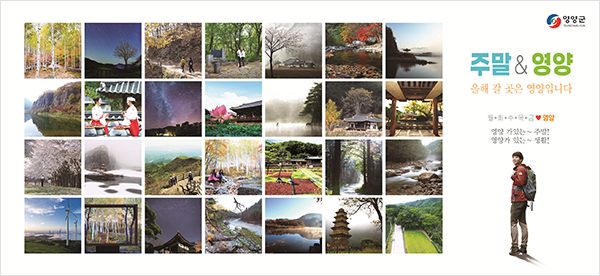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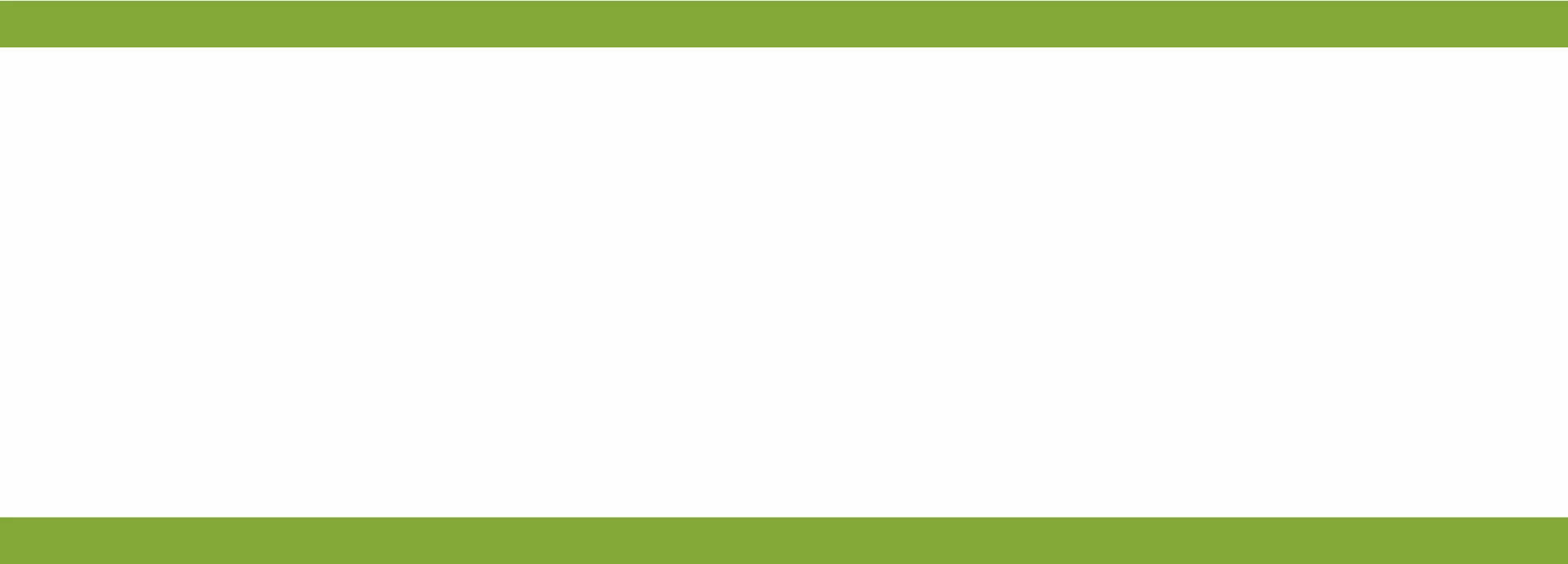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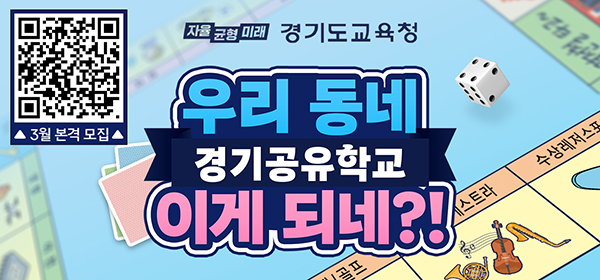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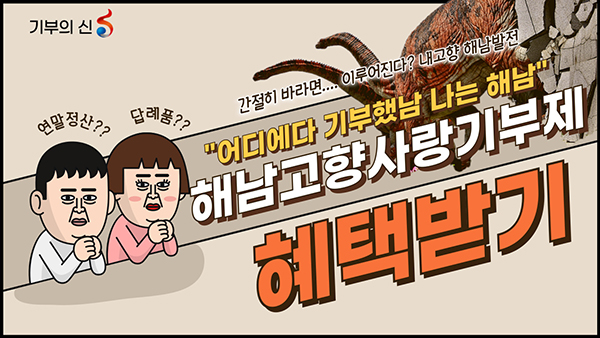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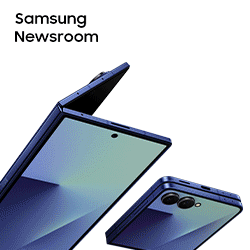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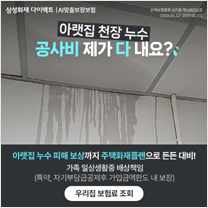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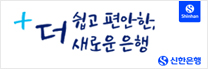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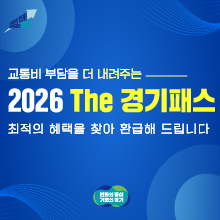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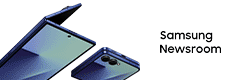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