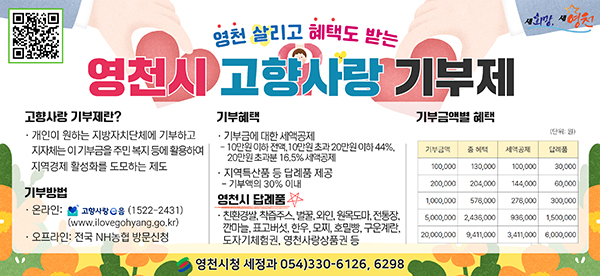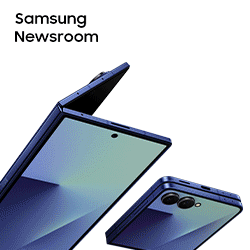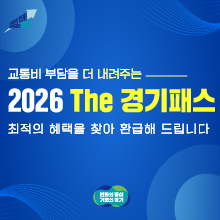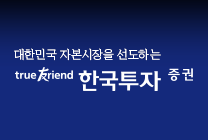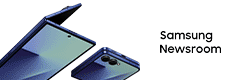경기연구원이 12일 소나무재선충병 치료법 안전한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나무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경기도에서는 89%가 잣나무에서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잣나무 면적이 넓어서 확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06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2015년에는 2000~2001년 대비 58배나 증가했다.
경기도는 2006년 광주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5년 기준 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15개 시군에서 피해가 보고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잣나무 피해가 대부분이며 감염 후 3개월 후 고사하는 소나무에 비해 잣나무는 감염 후 2~3년 후 고사하므로 예찰이 어렵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화학적·물리적 방제작업의 안전성 논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의 실효성 의문,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 부재로 인한 일선 시·군의 어려움 등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과정에 관한 몇 가지 논란을 거론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선충병으로 한반도의 소나무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의한 맹목적 방제작업은 지양해야 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을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하나로 인식하고 소나무 멸종 공포에서 벗어나 논란이 있는 방제사업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제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변화로 한반도 소나무는 70년 뒤 사라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목표지향적 방제사업은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며 국내 모든 발생지역을 100% 완벽히 방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방제용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공개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안전성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선충병 방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전 국토를 대상지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포기할 곳과 꼭 지켜낼 곳을 선별하여 역량을 집중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 재선충병 DB 구축·통합관리로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잣나무 중심의 피해가 크며 대부분 생활권 인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 문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구축 등의 해결을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NB=이병곤 기자)






















![[CNB뉴스 위클리픽-통신] 통신 3사,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 정식 도입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4/art_1769127992_176x135.jpg)
![[생생르포] ‘외국인 맵찔이’도 인증샷…농심 ‘너구리의 라면가게’ 가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4/art_1769071058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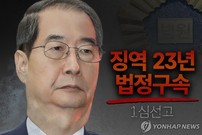
![[CEO신년사 행간읽기②] 증권업계 “코스피 5000은 시작일 뿐…AI·디지털이 新사업 뿌리”](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4/art_1769042129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