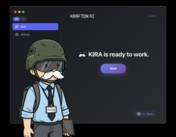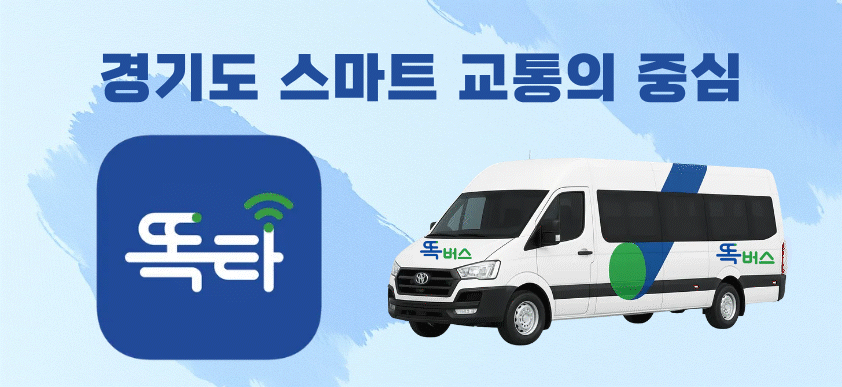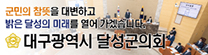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조르지오 모란디(Giorgio Morandi, 1961) photo by Antonio Masotti, Bologna.
열정 하나를 무기로 평생 예술에 일생을 바친 '병의 화가'이자 이탈리아 근대회화의 거장 조르조 모란디(Giorgio Morandi, 1890∼1964)의 작품들이 한국 관객과 첫 만남의 자리가 11월 20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직무대리 윤남순) 덕수궁관에서 마련된다.
모란디는 1948년 베니스 비엔날레와 1957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수상할 만큼 생전에 이미 작가로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사후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회고전이 개최될 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작가다.
모란디는 20세기 미술을 주도했던 그 어떤 특정 유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근대 이후 한국미술계의 관심이 주로 미국과 서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 편중되어 온 탓에, 한국에서 모란디는 낯선 예술가로 불리는 것도 사실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설치된 조르조 모란디의 정물 작품.(사진=왕진오 기자)
하지만 '병의 작가'로 불릴 만큼 '정물' 그림을 통해서 통제와 규율에 따른 선명하고 간결한 흔적, 선, 평행선으로 만들어진 구조, 규칙적인 명암의 강도에 조절된 빛과 그림자 표현으로 모란디를 20세기 이탈리아 판화의 거장으로 불리게 했다.
그는 수채화를 매개로 불안정한 요소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킨다. 그가 마지막 몇 해 동안 제작한 수채화는 자연주의적 시각 안에서 대상을 회화적인 숨결로 환원시킨 것으로, 다른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본질로만 구성된 음악의 12음 기법에 비교할 만큼의 추상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작품도 대상의 배열, 색의 조화, 빛은 물론 캔버스의 크기조차 동일하지 않고, 10호를 넘지 않는 그의 작은 캔버스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혹은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들어있다.
서양미술사에서 정물화는 오랫동안 가장 미천한 장르로 치부됐지만, "가시적인 세계에서 내가 유일하게 흥미를 느끼는 것은 공간, 빛, 색, 형태다"라는 모란디에게 있어 정물화는 회화의 구조와 정수를 밝히고, 존재의 근본과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장르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설치된 조르조 모란디가 작업에 모델로 삼은 여러 종류의 병 들.(사진=왕진오 기자)
모란디는 결혼을 하지 않고 세 명의 누이와 함께 볼로냐의 폰다차(Pontazza)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았다. 그는 침실 겸 작업실이었던 작은방에서 작업하다 생을 마감한 은둔 혹은 고립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청년시절 모란디는 지오토(1267∼1337), 마사치오(1401∼1428)등 초기 르네상스의 거장들과 세잔(1839∼1906), 인상주의 화가들을 연구했다. 조르조 데 키리코(1888∼1978), 카를로 카라(1881∼1966) 등 형이상회화 작가들, 이상적인 이탈리아를 꿈꾸던 당시의 문화예술가들과 교류했으며, 오랫동안 볼로냐 예술 아카데미에서 에칭전공 교수로 지내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모란디가 그린 작은 캔버스에는 단순화된 형태와 모노톤의 세련된 색조가 담겨있다. 이 안에는 유럽의 전통과 근대성, 지역성과 국제성, 구상과 추상, 시간과 공간, 지각과 관념의 복잡한 관계가 그물망처럼 얽혀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설치된 조르조 모란디의 정물 작품을 관람객들이 감상하고 있다.(사진=왕진오 기자)
이번 전시는 모란디 미술관이 소장한 모란디의 유화, 수채화, 드로잉, 에칭 가운데 전성기(1940∼60년대)에 제작되어, 모란디 예술세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40여 작품으로 구성됐다.
또한 '모란디와의 대화'에서는 정물에 중심으로 작업한 도상봉(1902∼1977), 오지호(1905∼1982), 김환기(1913∼1974), 박수근(1914∼1965), 황규백(82), 김구림(78), 최인수(68), 설원기(63), 고영훈(62), 강미선(53), 황혜선(45), 이윤진(42), 정보영(41) 등의 작품에 등장한 정물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전시는 2015년 2월 25일까지.
CNB=왕진오 기자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