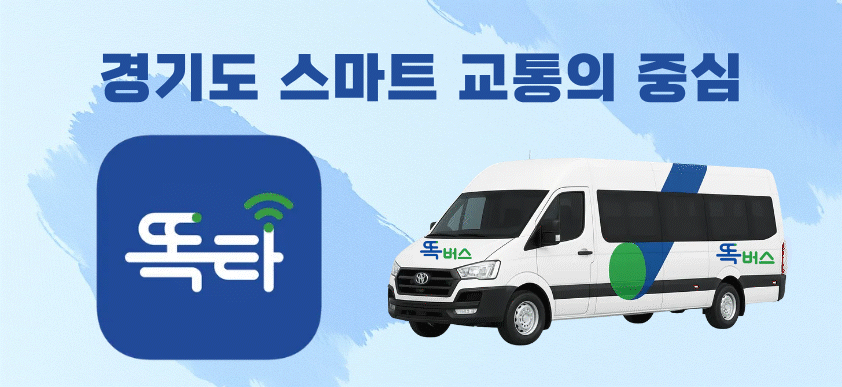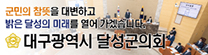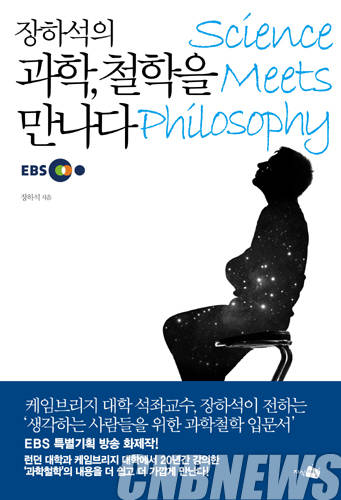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장하석의 과학, 철학과 만나다'의 가장 큰 미덕은 뭐니 뭐니 해도 철학적 질문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것이다.
책은 ‘과학과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과학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과연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등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이야기한다.
‘진리란 과연 무엇이고, 과학이 이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가’, ‘관측결과로 얻은 과학지식은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가’, ‘지식의 토대란 과연 존재하는가’ 등 인간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짚어본다.
또 ‘온도계의 정확성은 무엇으로 잴 수 있는가’, ‘물은 정말 100도에서 끓는가’, ‘물은 왜 H2O인가’ 등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 지식을 의심해보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도 소개한다.
책의 두 번째 미덕은 ‘공부하는 자세’를 일깨워준다는 데 있다. 당연한 듯 여겨지는 것을 한번 의심해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한 번 찬찬히 되짚어보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사고를 전개해야 하는지를 책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진정한 공부는 무조건 암기하거나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껴야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저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닦달하거나, ‘뭐라도 좀 배워서 머리를 채워야 할 텐데’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고 진정한 공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진짜 공부를 시작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탐구하는 기쁨을 끝없이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생각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면 힘들고 혼동되더라도 끈질기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한다.
책을 통해 그 탐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힌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세 번째 미덕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구체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흥미까지 북돋는다는 데 있다. 과학에 아무리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구체성이 결여되면 뜬구름 잡는 소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책은 ‘산소의 발견’, ‘물의 끓는 점’, ‘전지의 발명’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과학의 결과물을 역사를 통해 흥미롭게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이는 과학철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뿐더러 독자들이 부담 없이 과학철학의 세계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
CNB=왕진오 기자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