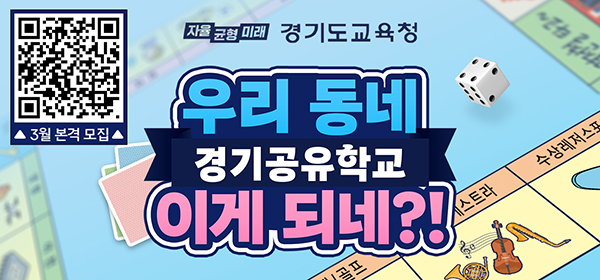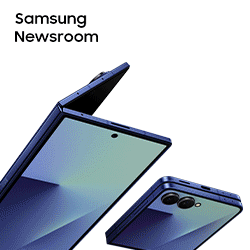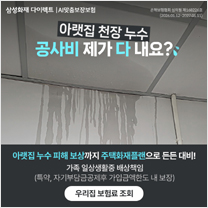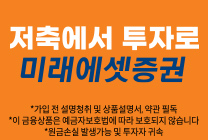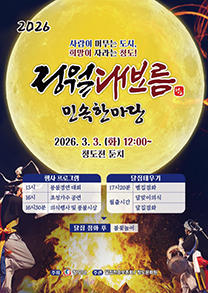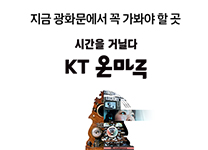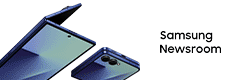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구병두의 세상읽기] ‘방관자 효과’ 막으려면? …“한 사람 콕 집어라”
비상상황 시 주변에 사람 많을수록 도움받을 확률은 더 낮아져
 구병두기자 |
2025.10.30 09:25:25
구병두기자 |
2025.10.30 09:25:25

사람들은 예기치 않는 비상 상황과 맞닥뜨릴 때 당황하게 되어 그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다수의 행동을 따르게 된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운데 자신을 도울 수 있고 또 돕기 원하는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다. 비상 상황에는 될 수 있는 한 주변에 사람이 적게 있는 쪽이 도움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이 봉변당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마침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다. 이는 여러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검증된 바 있다. 이런 현상을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또는 제노비스 증후군(Genovese syndrome)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여성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 살해 사건이다. 제노비스는 1960년대 뉴욕시에서 잔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살해되고 말았다. 그녀를 습격한 강도의 무자비한 폭행은 30분이 넘게 지속되었다. 수사 결과 적어도 38명의 사람이 현장을 목격했거나 최소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 가운데 제노비스를 도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사회심리학계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 후 방관자의 무관심과 관련된 연구가 쏟아졌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비브 라테네(Bibb Latane)와 존 달리(John Darley)의 그것이다. 그들은 제노비스 사건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찾아냈다. 라테네와 달리는 바로 목격자가 많았기에 단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마다 자기가 아니고도 누군가가 더 적당한 사람이 도와주겠거니 생각한 것이다.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사람들 사이에 엷게 그리고 널리 펴지는 책임의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현상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비상 상황에서는 불안해한다. 비상 상황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불안하다. 비상 상황에서는 고민하고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따르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는 ‘연기 실험’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실험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 갑자기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서 연기가 스며들게 조작하였다. 실험 공간에 혼자 있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서둘러 공간을 벗어났다. 다른 방에는 연기자(演技者)를 심어 넣어 연기가 피어오르는데도 대수롭지 않은 모습을 연출했다. 참가자들은 그대로 머물렀다. 심지어 연기가 자욱해져 서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머무는 것을 쳐다보면서도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지레짐작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처신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를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라고 부른다.
방관자 효과는 종종 다원적 무지와도 혼동되는 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다원적 무지 이론이 방관자 효과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원적 무지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 다수와 같다고 착각해 심리적으로 동조하지만 실제로는 다수가 같은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 올 때 한 개인이 타인들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이때 타인들 역시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타인들은 자신과는 달리 그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여겨서 결국 모두가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태연한 행동은 정확히 이해하지만, 타인의 태연한 행동은 그들이 정말로 태연하기 때문이라고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상황과 마주할 때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콕 집어 특정해서 그에게 무엇을 해 주길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거기 초록색 점퍼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 좀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며 그저 지켜보고만 있던 방관자가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일종의 책임 의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목당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특정되고 직접적으로 도움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기서 그 요청을 무시하면 주위의 시선이 부담되어 도움을 강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어야 할 ‘불변의 안전 수칙’으로 새겨들었으면 한다.
*구병두((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주)테크큐 대표이사)






















![[기자수첩] 李 지시 ‘어공이 모든 책임’ 新품의법, X피아들 따를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9/art_1772073860_176x135.jpg)

![[구병두의 세상읽기] 노인 5명 중 1명 치매 온다… ‘습관’보다 중요한 건 ‘환경’](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9/art_1772070791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