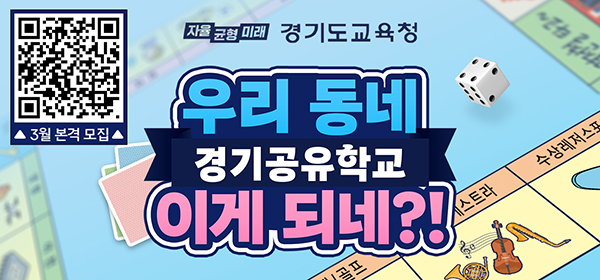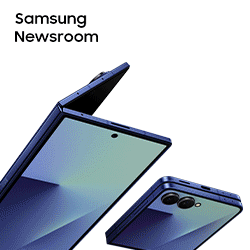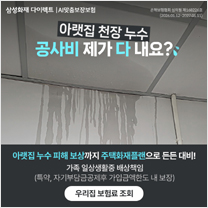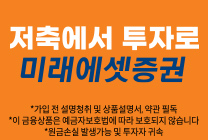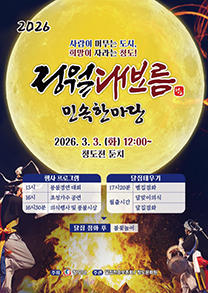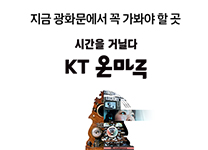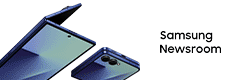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기자'란 직업을 가진 지 6개월이 지났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어려운 건 많다. 그중 질문하는 게 가장 힘들다. 모 기업의 팝업스토어에서 시민에게 말을 걸 땐, 평범한 단어를 잘못 내뱉거나 돌연 삑사리가 나기도 했다. 기업 관계자에게 민감한 질문을 할 때, 핸드폰 너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수첩에 적어놓은 글자가 대체 무엇인지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다.
이런 '질문 공포증'이 100% 내 탓은 아닐 테다. 유난히 내향적인 성격, 사회 초년생이라는 적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게 공포증을 유발한 핵심 요인은 아니다. 원래 난 질문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왜 1+1은 2인지?'부터 '왜 모든 학생이 학교, 학원에 틀어박혀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이런 물음표들은 학창 시절, 내 가슴과 머리를 지나, 밖으로 둥둥 떠다녔다.
그럴 때마다 반응은 싸늘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답변이 비수가 돼 날아왔다. 그 비수는 물음표의 볼록한 곡선을 도려냈다. 그렇게 물음표는 제 넋을 풀지 못한 채 마침표가 됐다. 아, 이제 알겠다. 공포의 실체는 물음표가 아니라, 날아올 비수다. 물음표의 예견된 운명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무서운 것이다. 모든 의문과 생명을 종식해 버리는 죽음의 언어라서. 이 말은 한국 Z세대에게 최초의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사건에서도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근처에서 가라앉고 있던 세월호 객실 안. 불안에 떨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라는 아이들의 물음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날, 처절한 물음과 함께 무고한 영혼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 12월엔 계엄이 터졌다. 이후 정치권에선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당한가?" 혹은 "국민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 "우리가 맞고, 저들은 틀립니다. 그러니 1번/2번/n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4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말만 반복한다. 경험에서 배웠듯, 온점의 언어는 참사를 되풀이할 뿐이다.
대신 시민들이 스스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관해 물었다. 농민, 자폐인, 성폭행 피해자, 성소수자, 고졸 직장인, 중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586세대 민주주의의 한계,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삶의 다양성을 논했다.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도 요구했다.
시민들이 용기를 냈으니, 이제 정치권이 질문 공포증에서 벗어날 차례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침표가 물음표로 만개하길, 그렇게 한국의 봄이 시작되길.
(CNB뉴스=홍지후 기자)























![[기자수첩] 李 지시 ‘어공이 모든 책임’ 新품의법, X피아들 따를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9/art_1772073860_176x135.jpg)

![[구병두의 세상읽기] 노인 5명 중 1명 치매 온다… ‘습관’보다 중요한 건 ‘환경’](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9/art_1772070791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