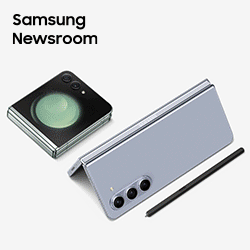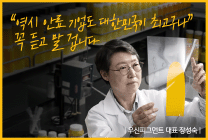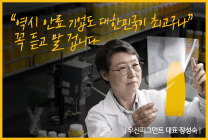[생생현장] “거대한 중진의 풍모”…‘MMCA 현대차 시리즈’ 양혜규展 가보니
현대차와 국현의 ‘10년 프로젝트’, 일곱번째 전시회
 선명규기자 |
2020.10.15 09:35:20
선명규기자 |
2020.10.15 09:35:20

반환점을 돌아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내 중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한 ‘10년짜리 프로젝트’가 올해로 7회차를 맞았다. 매년 작가 1인의 대규모 개인전을 후원하는 성격으로 진행되는데, 일곱 번째 주인공으로 설치미술가 양혜규가 선정됐다.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그는 내년 2월까지 열리는 전시에서 중진(重鎭)의 풍모를 담은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CNB=선명규 기자)
방울 등 일상적 소재로
무거운 주제 쉽게 풀어
대형작품들 압도적 장관
이것은 환청일까. 지난 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5전시장에 들어서자 신산한 방울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암자에 숨어든 바람이 종을 가벼이 흔드는 듯한 낮은 음파다. 잘못된 감지일까? 긴가민가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더니 사실관계가 명확해졌다. 정확하고도 엄중한 경고가 들려왔다. “만지면 안 됩니다” 방울을 촘촘하게 잇대어 쌓은 작품 ‘소리 나는 동아줄’을 누군가 건드린 것이다.
한사코 말리는데 기어코 손대려는 이들이 많다. 이번 전시에선 선을 조심해야 한다. 촉감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작품이 많아 ‘눈으로만 봐야하는’ 규칙을 위배할 수 있다. 하지만 호기심은 묶어두고 관람 제한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는 편이 낫기도 하다. 한눈에 측정 불가능한 대규모 작품이 즐비하기 때문에 한 발 치 떨어져서 봐야 완상의 깊이가 더해진다. 만져봐야 아는 느낌 그것일 뿐이다.

들머리부터 압도적이다. 발들이 지상을 딛고 솟구치는 형상이 맞이한다. ‘침묵의 저장고-클릭된 속심’은 블라인드 154개로 제작한 원통형의 구조물. 높이 10미터에 이르는 이 작품은 관람은 물론 체험도 가능하다. 바닥에 입구와 출구가 쓰여 있다. 드나들 수 있는 이곳 중심에 멈춰서면, 관람객들은 가려진(블라인드) 경험을 하게 된다. 내부에서 시선을 위로 옮기면, 형광등이 소용돌이치는 장관도 바라볼 수 있다.
주제는 무거운데 주로 쓰인 소재가 일상적이라 받아들이기에 까다롭지 않다. 인간의 관계, 사회적 양극화, 재해와 국경 등 묵직한 모티브를 다루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방울, 블라인드 등을 썼다. 건너에 있는 세계를 연결하는 작품 ‘구각형 문열림’을 표현하면서는 현관문에 있는 것과 같은 문고리를 썼다. 단순해보여도 막상 벽에 다닥다닥 붙은 철제 손잡이를 마주하면 이보다 명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잡고 돌리고 열고 나가고 싶어진다.

방문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인해 전시 관람에 제약이 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두 시간 단위로 200명씩만 들인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방문이 어려우면 안방에서 랜선으로 감상할 방법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전시장 투어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지회 학예연구사가 작품 설명과 작업 뒷이야기 등을 상세히 들려준다. 이 학예사는 “전시장을 직접 찾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위해 전시 투어를 준비했다”며 “온라인 오프닝이라 생각하고 감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장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대차 시리즈’에 거쳐 간 이름들은 그야말로 쟁쟁하다. 2014년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 이불을 시작으로 2015년 안규철, 2016년 김수자, 2017년 임흥순, 2018년 최정화, 2019년 박찬경의 개인전이 개최됐다. 작가 한 명만을 집중 조명하기 때문에 밀도 높은 관람을 제공하는 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계 발전과 더불어 관람객에게 새롭고 의미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선명규 기자)
























![[내예기] “필살기는 K-소주”…하이트진로의 해외시장 공략기](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8/art_175204822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