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약성서에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나는 때다.
구약성서에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나는 때다. 현인(賢人)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두 어머니를 두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아이를 갈라 둘이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가짜엄마는 그러자고 했다. 하지만 진짜엄마인 여인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저 여인의 아기다”라고 했다. 자기자식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왕은 아이를 둘로 가르자는 엄마를 벌했고, 진짜엄마에게 아기를 줬다.
한경오(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사태를 보며 다시 그 혹독했던 겨울을 생각한다.
권력은 국민을 줄세우고 좌우, 동서로 갈랐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와 언론을 검열했다. 무전유죄·유전무죄로 재판을 했다. 재벌은 권력과 결탁해 특혜를 누렸지만 노동자의 삶은 더 빈궁해졌다.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쳤지만 그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저항하면 공권력을 앞세워 진압했다. 사상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인권은 수십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 강고한 파시즘 앞에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그 촛불들은 가짜엄마 때문에 ‘아이’를 잃을까봐 마음을 졸였다.
전경버스에 올라탄 가짜엄마를 끌어내리고 설득했다. 나를 맘대로 때려라. 차라리 내게 화풀이를 하라며 가짜엄마를 나무랐다. 그 겨울은 그렇게 위대했다. 진짜엄마들은 마침내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그 엄마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 한겨레 안수찬 기자의 도발성 발언,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김정숙 씨’ 건, 경향신문의 ‘퍼 먹다’ 표기 등을 문제 삼아 적진으로 날렸던 화살을 아군기지로 되돌리고 있다.
한경오의 이 표현들이 신중하지 못했다 아니다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언론의 표기 관행을 따지기에도 시간이, 마음이, 감정이 너무 나갔다. 문제는 진짜엄마의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다.
(오늘만큼은 기자가 아닌 한 사람의 촛불시민으로서) 한경오는 밉던 곱던 내 자식이다. 벌판에서 함께 싸운 내 동지다. 차벽을 함께 흔들었던 벗이다. 그 자식은, 동지는, 벗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진짜엄마는 어디로 간 건가. 자식의 배를 가를 수 없다는 부모는 왜 보이지를 않나?
다시 촛불로 돌아가자. 영하 10도의 혹한에서 촛불은 그냥 촛불이 아니었다. 사람이 촛불이 되고, 촛불이 사람이 되어 온기를 만들었다. 그날 내 곁에 선 이는 단순히 시위에 동참한 이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잊지 말자.
다시 내 속의 진짜엄마를 꺼집어 내자. 그게 우리가 그 엄혹한 겨울을 견딘 이유다. 더구나 오늘은 5.18 아닌가.
(CNB=도기천 부국장)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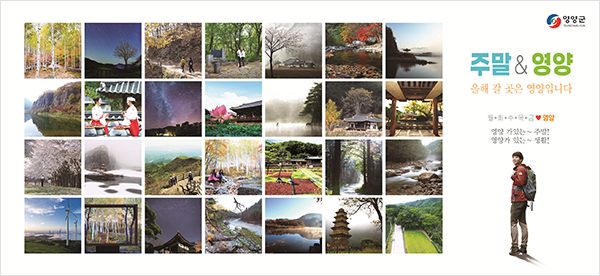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