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비맥주의 대표브랜드인 카스의 생산공장 모습. (사진=오비맥주)
수입맥주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류업계 선두주자인 오비(OB)맥주의 수입브랜드들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다. 간판 브랜드인 ‘카스’의 신장세도 예사롭지 않다. 수입산을 찾는 이들이 늘면 국산(카스) 수요는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오비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유가 뭘까. (CNB=도기천 기자)
수입-국산맥주 경계 무의미
카스 중심 ‘양쪽 날개’ 전략
맥주시장 판 커질수록 유리
‘수입맥주에 맞선 국산맥주의 반격’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맥주 기사를 찾다보면 흔히 접하는 기사 제목들이다. 외국 맥주의 국내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나온 얘기들이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 1위기업인 오비맥주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듯하다. 대표제품인 카스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굳건한데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종의 외국맥주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맥주시장은 2009년까지만 해도 하이트맥주가 업계 선두였고, 오비맥주가 그 뒤를 추격하는 모양새였다. 2008년 당시 하이트맥주는 58%의 시장점유율로 오비맥주(42%)를 16%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2010년을 정점으로 두 회사의 희비(喜悲)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6:4 정도로 오비가 하이트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후발주자인 클라우드(롯데주류)의 점유율은 3~4% 가량이다.
이런 가운데 수입맥주들이 시장에 가세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맥주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97.2%에서 2015년 91.5%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수입맥주는 꾸준히 늘어 2.8%에서 8.4%로 증가했다. 현재는 10%까지 치고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맥주 수입액도 점차 늘어 2008년 3937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8158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비와 하이트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외국맥주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비맥주는 현재 20여종의 세계 유명 맥주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사진은 오비가 수입하고 있는 맥주들. (사진=연합뉴스)
국산맥주의 반격은 없다?
우선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수입 시장이 확대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 오비맥주는 세계 1위 맥주기업인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인베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원래 오비맥주의 대대주였는데 몇 년간 사모펀드에 오비 지분을 넘겼다가 2014년 되찾아 왔다.
AB인베브는 2008년 벨기에-브라질의 인베브 그룹과 미국의 안호이저-부시가 합병한 세계 최대 양조회사다. 버드와이저, 스텔라, 코로나, 호가든, 레페 등 유명 맥주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한다. 지난해 페로니 등의 브랜드를 지닌 세계 2위 영국 사브밀러를 인수하며 한 번 더 거대공룡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다
오비맥주는 영국 에일맥주 ‘바스’를 선보인 이후 독일 밀맥주 ‘프란치스카너’, 룩셈부르크 ‘모젤’, ‘호가든 로제’, ‘그랑 크루’, ‘포비든 프룻’, 중국 ‘하얼빈’ 등 20여 종의 수입맥주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가든 고유의 밀맥주 맛에 상큼한 체리의 풍미를 더한 ‘호가든 체리’를 봄 시즌 한정판으로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오비 입장에서는 ‘판’이 적당히 커지는 게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하다. 대주주인 AB인베브가 세계 맥주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토불이’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오비맥주 기념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명 맥주들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대표 국산브랜드인 카스에만 집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카스는 외국 기업이 대주주임에도 국내에서만 생산된다는 점에서 국산맥주로 분류된다)

▲오비맥주 한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오비 생맥주를 맛보고 있다. (사진=CNB포토뱅크)
“카스 확장은 제로썸 아니다”
하지만 수입맥주의 지나친 확장은 경계하고 있다. 여전히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카스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맥주 점유율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카스의 설 자리가 좁혀질 수도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카스 확장’은 회사의 최우선 정책이기도 하다. ‘오비=카스’가 되어버린 데는 역으로 다른 제품들의 부진이 배경이 됐다. 2015년부터 선보인 ‘프리미어 OB’ 시리즈, 지난해 출시한 칵테일 발효주 ‘믹스테일’ 등은 맥주시장의 주변부만 맴돌고 있다. 한 해에 10가지 신제품을 내놔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오비맥주는 카스 확산에 집중했고, 그 결과 지난해 치열한 맥주시장에서 나름 선방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2016년 매출은 1조5453억원을 기록해 전년(1조4908억원)보다 3.7% 늘었다.
이는 ‘카스 위기’의 완전한 불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승승장구해오던 카스는 2014년 여름에 불거진 ‘산화취 논란’으로 이듬해 9년 만의 매출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카스는 더운 날씨로 맥주가 산화하면서 생긴 냄새인 산화취를 없애는데 성공했지만 구겨진 이미지는 좀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다가 작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오비맥주는 이런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체질 개선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23년 만에 처음으로 ‘카스 후레쉬’의 병 디자인을 젊은 취향에 맞춰 개선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경에 중국 진출을 시작한다. ‘카스’라는 이름으로 해외시장에 나가는 건 몽골에 이어 두 번째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CNB에 “카스를 AB인베브의 아시아 대표브랜드로 키우는 게 당면 목표”라며 “‘카스의 혁신’을 키워드로 내걸고 시장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앞뒤 상황을 종합해보면, 오비맥주는 ‘카스’와 ‘수입맥주’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듯 보인다. 적당한 수입 시장의 확대와 카스의 독보적인 시장점유, 이 두 가지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무게 중심이 기우는 것은 바라지 않는 듯하다. 결국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면서 그 중심에 카스를 놓겠다는 것이다.
정세현 경영컨설턴트는 CNB에 “맥주시장은 한 쪽이 줄어들면 한 쪽이 증가하는 제로썸(zero-sum) 법칙이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오비맥주가 가장 바라는 것은 수입·국산 시장 모두가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NB=도기천 기자)
기사 속 기사
‘광주 공장 호가든’은 어느 나라 맥주일까?
쌉쌀한 맛이 일품인 호가든은 벨기에 호가든 지역에서 제조되는 전통 에일 맥주다. 맥주의 발효방식은 에일(Ale), 라거(Lager)로 나뉘는데 에일은 18~25℃의 고온에서 발효시킨 맥주로 라거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고 색깔과 맛, 향이 진한 편이다. 그래서 애주가들은 에일을 라거보다 고급 맥주로 쳐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호가든은 실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만드는 국산 맥주다. 오비맥주가 벨기에 호가든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200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호가든은 전량 광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맛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벨기에 호가든 본사(AB인베브)가 전수한 까다로운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매달 정기적으로 벨기에 본사에서 실시하는 품평회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원산지에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맛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벨기에 호가든 본사(AB인베브)가 전수한 까다로운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매달 정기적으로 벨기에 본사에서 실시하는 품평회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원산지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밀맥주인 호가든은 제조 과정에서 오렌지껍질이나 고수 같은 재료가 들어가는 등 공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벨기에 본사가 아무 해외공장에서나 생산하도록 허가해주지 않는다. 이런 엄격한 기준 때문에 해외공장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오비맥주 공장에서만 호가든이 생산되고 있다. 호가든 뿐 아니라 원래 미국에서 탄생한 버드와이저도 지금은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국산맥주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알고 보니 호가든이 아니라 오가든이었다”며 실망하기도 한다. 특히 맥주병 목부분 라벨에 큰 글씨로 적힌 ‘오리지널 벨기에 밀맥주’(The Original Belgian Wheat Beer)라는 영문 표기를 보고 벨기에산이라고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은 배신감(?)이 들기도 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호가든 같은 저도수 맥주는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2개월이나 걸려 선박편으로 벨기에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신선하고 맛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산맥주라는 사실을 일부러 감출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CNB=도기천 기자)
|























 그렇다고 맛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벨기에 호가든 본사(AB인베브)가 전수한 까다로운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매달 정기적으로 벨기에 본사에서 실시하는 품평회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원산지에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맛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벨기에 호가든 본사(AB인베브)가 전수한 까다로운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매달 정기적으로 벨기에 본사에서 실시하는 품평회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원산지에 뒤지지 않는다.![[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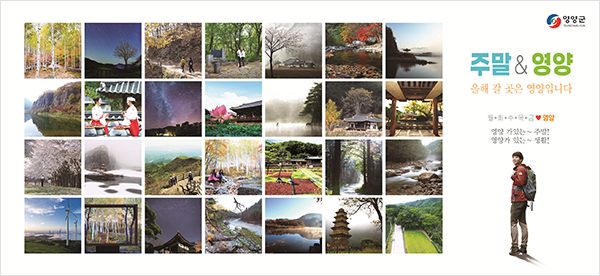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