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사진=현대차)
‘자율주행=전기차’ 운명공동체
전기차, 글로벌 유가 혼란 초래
너무 나간 기술력 부담 줄 수도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7’에서 전기차가 바탕인 ‘아이오닉 일레트릭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며 자동차산업의 시즌2를 선언했다.
현대차가 가솔린·디젤 자동차를 두고 전기차에 자율주행기술을 도입한 이유는 간단하다. 가까운 미래에 전기에너지가 차를 움직이는 중요 동력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CNB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고려해야할 점이 많아 2020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미래 기술인만큼 전망이 좋은 미래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전기차에 탑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차의 역사는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자동차 역사를 보면 전기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앞서 설계됐지만 상용화되지는 못했다. 도로 곳곳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거리를 운행하기 힘든 점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자원부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전기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친환경자동차이다 보니 배출되는 배기가스나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191km를 비롯해, 기아차 ‘쏘울 EV’ 148km, 르노삼성 ‘SM3 Z.E’ 135km, 닛산 ‘리프’ 132km, BMW ‘i3’ 132km, 기아차 ‘레이 EV’ 91km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최소 한 번 이상의 충전소를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등장하는 전기차들은 이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나올 전기차는 평균 주행거리가 30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웬만한 곳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전기차는 각종 혜택도 받고 있다. 2017년 전기차 보조금이 개선되면서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예산을 국회로부터 확정 받았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약 105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충전 인프라 예산 또한 420억원에서 55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차종별로 200~1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하면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갈수록 자동차 시장은 가솔린·디젤에서 전기차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은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서도 전기차 R&D(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
‘로봇 자동차’에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전기차의 상용화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외에는 자율주행기술을 소화할 하드웨어가 없다. 현대차 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전기차에만 로봇 운용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결국 전기차가 실패한다면 자율주행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가 갖고 있는 열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전기차의 상용화는 국가재정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막대한 유류세를 국가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상용화로 인한 글로벌 유가 생태계의 혼란도 우려해야 한다. 유가 하락이 경제에 끼칠 영향도 크다.
이런 복잡한 변수들을 극복하고 전기차가 먼저 자리 잡아야 로봇이 운전대를 잡는 날도 가까워 질수 있다.
이미 인류의 기술은 로봇이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현대차는 지난달 열린 ‘CES 2017’에서 국내자동차 역사상 최초로 미국자동차공학회(SEA) 기준 4단계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내 4㎞ 구간을 달렸다. 4단계는 운전자가 차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수준이다. 운전자 없이도 알아서 달리는 5단계 기술의 직전 단계다.
인텔은 ‘로봇 운전’을 뛰어 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동차들이 모두 방대한 클라우드 서버 형태의 데이터 센터에 연결돼 운전자 없이 차가 다니는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한마디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도로 위의 모든 차를 하나하나 관장토록 해 자동차 스스로 운행 하도록 한다는 프로젝트다.
전문가들이 5년 이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키는 전기차가 쥐고 있다.
ICT업계의 한 전문가는 CNB에 “드론의 대중화에 안보논리가 개입하고 있듯이, 자율주행차에서도 산유국과 강대국 간의 복잡한 경제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경제 먹이사슬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전기차와 자율차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황수오 기자)




















![[뉴스텔링] 정청래-조국의 대권 욕망? ‘합당 밀약설’ 실체](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0891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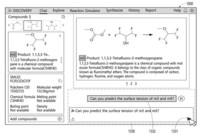
![[뉴스텔링] ‘K푸드’ 격전지 된 공항(空港)…누가 웃고 누가 울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669114_176x135.jpg)

![[민주-혁신당 ‘합당’] ‘찬성’ 28% vs ‘반대’ 40%…12%p 격차로 반대 우세](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69970853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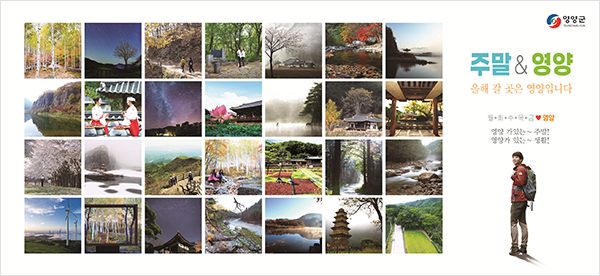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뉴스텔링] 정청래-조국의 대권 욕망? ‘합당 밀약설’ 실체](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0891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