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맥주는 대형마트의 매대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당국의 맥주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한국화’ 돼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주와 섞는 ‘소맥용 맥주’, 대기업 주류사들의 독과점 등 한국 맥주시장 만의 특징이 ‘맛없는 맥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NB=김유림 기자)
폭탄주에 맞춘 싱거운 맥주 대세
찐한 몰트맥주 아직은 계륵 신세
수제맥주 규제 풀고 활성화 해야
2011년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로 국내 소비자들이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유럽지역의 맥주 뿐 아니라 호주, 중국 등 전 세계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접하게 되면서 주류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층은 국산 맥주에 대해 “맛없고 싱겁다”, “맛이 다 똑같다”는 악평을 쏟아냈다. 오랫동안 특정 한국 맥주만 마셔왔던 소비자들이 시장 개방 등으로 해외의 다양한 맥주를 만나면서 맥주 고유한 맛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2011년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맥주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사진=인터넷)
왜 한국 맥주는 악평을 받을까? 전문가들은 소맥 문화를 1순위로 꼽고 있다.
성격이 급한 한국인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여유를 가지고 술의 맛을 음미하기 보다는 빨리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저도수 주류로 분류되는 맥주를 단품으로 마시기보다는 소주랑 섞어 마시는 폭탄주(소맥) 문화가 정착하게 됐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절반(45.7%) 가까이가 올해 폭탄주를 마신 경험이 있을 정도다.

▲소비자들 사이에 국산 맥주는 소맥용, 제대로 된 맥주 고유의 맛을 보려면 수입 맥주를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사진=방송화면캡처)
이에 따라 카스(OB맥주)·하이트(하이트진로)·클라우드(롯데주류) 등 국내 대표적인 맥주 제조사들은 ‘소맥’에 맞춰 목넘김이 시원하고, 톡 쏘는 청량감을 우선으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다. 소맥 문화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맛의 맥주 출시를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것이다.
‘맥주 카르텔’ 넘을 수 없는 벽?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주류 정책도 맥주 산업의 다양화를 방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이트와 오비맥주는 각각 1933년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세운 조선맥주와 쇼와기린맥주가 전신이다. 이들 양사는 일본 규정에 따라 맥아를 66.7%를 함유한 맥주를 만들어야 했지만, 지금 한국의 주세법은 맥아 비율이 10%만 넘어도 ‘맥주’라고 말한다.
반면 500년 넘게 맥주 종주국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1516년 공포한 법령인 ‘맥주순수령’으로 인해 맥아 함량 100%를 맥주로 인정하며, 일본 역시 최하 66.7%가 넘어야 한다.
맥아 함량을 낮게 넣어서 맛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내 맥주 업체들은 맥아 비율을 70%대까지 끌어올리며 최대한 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맥아가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다. 과자, 사탕, 음료수 등 먹거리 공산품들 거의 대부분은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맥주의 성분은 뭘 넣었는지만 표기하면 된다. 첨가 비율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과도한 시장 규제도 맥주의 맛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발표한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는 하우스맥주, 지역특산맥주 등 수제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신세계(데블스도어)와 SPC그룹(그릭슈바인), YG엔터테인먼트(케이펍) 등 대기업들도 수제 맥주 시장에 뛰어들 정도다.

▲수제 맥주가 인기지만, 규제 탓에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살 수 없다. 사진은 서울 성수동의 수제맥주 펍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사진=방송화면캡처)
그러나 주세법에 따르면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맥주 사업자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300킬로리터가 넘으면 안되며, 저장 시설규모도 75킬로리터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늘리고 싶어도 생산량 제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것이다. 반면 독일, 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은 시설 기준 자체가 없다.
유통 규제도 문제다. 소규모 맥주 사업자도 자신의 가게가 아닌 다른 음식점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2014년 4월 주세법이 개정됐지만, 중간 유통업자를 거쳐야 한다.
주류도매상은 총 1200여 곳인데, 이들과 거래를 트기가 어렵고 설령 거래가 성립되더라도 계약 규모가 커 소규모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존 맥주업체들의 압력과 텃세도 상당해 주류도매상들이 제3의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기가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제 맥주를 마시고 싶으면 강남, 이태원 등 특정 가게에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국내 맥주 시장은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빅3 맥주기업들도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나름 노력하고 있다. 2013년 하이트진로(5개), 오비맥주(4개)가 시판하는 국산맥주 브랜드는 총 9개에 불과했지만, 2014년 롯데주류의 ‘클라우드’ 출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맥주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오비맥주는 8개, 하이트진로 7개, 롯데주류 2개 등 총 17개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5일 CNB에 “하이트, 맥스, 드라이디 등 기존의 라거 맥주를 세분화하며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며 “2013년 대기업 맥주 기업 중 최초로 에일 맥주인 퀸즈에일도 출시했지만, 시장에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1년 내내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라거 맥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며 “그럼에도 다양한 맥주 맛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맥주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김유림 기자)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176x135.jpg)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
![[내예기] ‘K-워터’ AI로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도전과 혁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1619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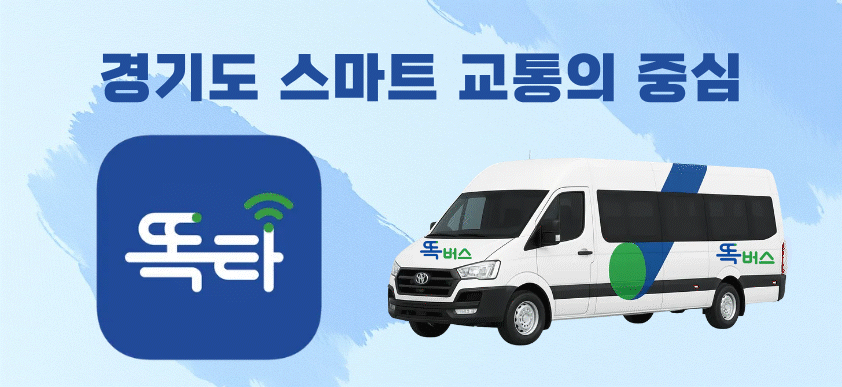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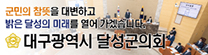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