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품에 안긴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과 통합하면서 증권사명에서 ‘현대’ 두 글자를 내리게 됐다. 현대가(家)의 복잡한 분화 과정에서 금융사로서는 유일하게 ‘현대’ 사명을 지켜왔던 ‘현대증권’이 사라지게 되면, 이번 기회를 통해 ‘현대’ 브랜드를 다시 가져오려는 범(凡)현대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누가 증권업계에서 ‘현대’를 부활시킬까. (CNB=도기천 기자)

▲범현대가 증권사들. (왼쪽부터)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증권, 현대차그룹 계열사 HMC투자증권, 현대중공업 계열인 하이투자증권. (사진=CNB포토뱅크)
해묵은 집안 갈등…브랜드 신경전
현대그룹은 2000년 3월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승계 다툼으로 인해 여러 갈래로 나눠졌다.
정주영 회장의 장남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등 10개사를 이끌고 현대그룹으로부터 독립했으며, 현대그룹 경영권은 5남 정몽헌 회장에게 넘어갔다. 이후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으로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3개의 범현대가 증권사들이 탄생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과 현대중공업 계열인 하이투자증권,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증권이다.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 이는 현대가 적통(嫡統)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현대그룹을 설립한 정주영 회장은 8남 1녀의 자녀를 뒀는데, 장남 정몽필은 46세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이때부터 차남 정몽구 회장이 큰아들이 되어 집안을 이끌었다.
하지만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거치며 정몽구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분화돼 나갔고, 그룹의 승계는 다섯 번째 아들인 정몽헌 회장에게 돌아갔다. 이후 정몽헌 회장이 급작스레 숨지면서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지금의 현대그룹을 이끌게 된다.
시숙과 제수 사이인 정몽구 회장과 현정은 회장은 이런 배경에서 갈등을 빚었다.
범현대가의 모태인 현대그룹을 현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현대가 형제들은 현 회장으로부터 현대그룹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벌였다.
2003년에는 시숙부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집중 매입하면서 현 회장을 압박했고, 2006년에는 시동생인 정몽준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 지분을 사들이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10년에는 정몽구 회장과 현 회장이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충돌했다.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과 통합하면서 증권가에서 ‘현대’ 사명이 사라지게 됐다. 향후 업계에서 누가 ‘현대’ 사명을 부활시킬지 주목된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CNB포토뱅크)
현대증권 팔아도 ‘현대’ 두 글자는 못넘겨
이런 과정을 거치며 범현대가 증권사들 간에도 분쟁이 벌어졌다.
HMC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사명을 ‘현대차IB증권’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현대그룹에서 ‘현대’ 두 글자의 사용금지 가처분을 내 승소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난 HMC 측은 영업점 간판·로고 등을 원래대로 되돌렸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현 회장은 최근 현대증권을 KB금융지주에 넘기면서 ‘현대증권’ 브랜드를 현대상선으로 가져왔다. KB 측은 현대증권 브랜드를 현대상선에 넘기는 대신 “5년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고, 현대상선이 이에 동의했다.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통합증권사명은 ‘KB증권’으로 확정됐다.
이후 현대상선이 채권단 손으로 넘어가게 되자 현대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증권’ 상표권을 현대상선으로부터 110억원에 사들였다.
이를 두고 현 회장과 현대가 형제들 간의 앙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회장이 ‘현대’ 브랜드를 범현대가에 넘겨주기 싫어한다는 것.
‘현대’ 브랜드에 대한 현 회장의 의지는 단호하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현대’ 브랜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핵심인 현대상선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면서,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 상표권에 대한 범현대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현대상선)
돌고 돌아 현대엘리베이터 손에
하지만 현대그룹 사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나빠진 만큼 적당한 시기에 ‘현대증권’ 브랜드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대그룹의 핵심인 현대상선은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을 통해 대주주로 올라선 상태다. 조만간 감자와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현대그룹의 지분율은 0.5% 미만으로 줄어들어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으로부터 완전 분리된다.
그동안 현대그룹 매출의 70% 정도를 책임졌던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사라지면, 현대그룹은 자산규모 2조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조만간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현대유엔아이 정도만 갖고 새 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현대그룹이 다시 증권사를 설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이 ‘브랜드 되찾기’에 가장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 불황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현대중공업그룹은 보유 중인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와 경영권을 매각할 예정이라 ‘현대’ 브랜드에 신경 쓸 여력이 현재로는 없다.
현대차그룹의 HMC투자증권은 과거에도 여러 번 회사명에 ‘현대’ 두 글자를 넣으려 했지만 현대그룹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 됐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14일 CNB에 “현대상선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증권’ 브랜드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다시 상표권을 가져가는 바람에 실망이 크다”며 아쉬워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범현대가가 ‘현대’라는 이름에 강한 미련을 갖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와 더불어 현대 가문에서의 적통성 때문”이라며 “결국 현대가 사람들 간의 관계 여부에 따라 증권가에서 ‘현대’ 브랜드를 다시 볼지 못볼 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도기천 기자)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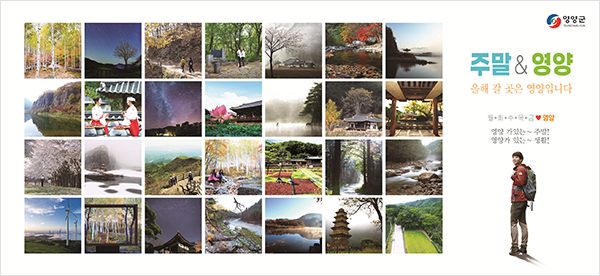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