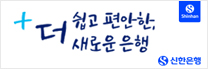▲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강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철강업계와 건설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지을 때 건축자재 원산지 공개
철강업계, ‘안전’ 내세워 적극 찬성
속내는 국내산 철강재 유통확대 노려
건설업계 “지나친 행정규제” 볼멘소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건축자재를 사용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 부실시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철강업계는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재 원산지 표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62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43개 현장에서 불량자재가 다수 적발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저가 수입산 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면서 건설공사의 안정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철강협회 오금석 팀장은 CNB와 통화에서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기하듯이 국민들이 사는 주택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지나친 ‘행정규제’란 입장이다.
이미 건설현장에서 자재나 설비에 대한 품질시험을 시행 중이고 필요하다면 납품서에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기 때문에 표지판에까지 표기하란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아파트 분양 비중이 큰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도 한 눈에 자재의 질을 가늠할 수 있게 되면, 각종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급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사업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실장은 CNB에 “만약 수입산 철강재의 안전문제가 걱정된다면 수입 또는 유통단계에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완공된 아파트의 머릿돌에도 자재 원산지가 표기 되어야 한다. 사진은 완공정보가 담긴 서울시의 한 아파트 머릿돌. (사진=손강훈 기자)
양측이 이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이유는 ‘수익’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건설에 필요한 철근, H형강, 시트파일 등 철강재는 대표적인 ‘1물1가(一物一價)’ 상품으로 수요가 한정된 탓에 가격도 단일화 돼 있다. 이에 분기별로 철강업체와 건설업체가 협상을 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회사 이윤이 걸린 만큼 과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게 ‘수입산 철강재’다. 상대적으로 국산에 비해 저렴하다보니 그동안 건설업계는 수입산 사용을 협상 무기로 활용해 가격상승을 억제해왔다. ‘여차하면 수입산을 사용하겠다’는 으름장으로 가격 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국산 철강재 사용을 장려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협상에서 철강업계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미국이 도금컬러강판류(내식강)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결정으로 현대제철 47.8%, 동국제강 8.75%의 관세를 내게 되는 등 수출 악재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철강유통을 통해 손실을 만회해야할 처지가 된 점도 철강업계가 법안 통과에 발벗고 나선 요인으로 해석된다.
건설업체는 ‘안전’을 내세운 철강업체의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고 ‘KS마크 획득한 수입산 자재 사용’ 등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이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알권리 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쩐의 전쟁”이라며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CNB=손강훈 기자)






















![[CEO신년사 행간읽기①] KB·신한·하나·우리금융…“AI로 새판짜기” 한목소리](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2/art_1767918997_176x135.jpg)

![[기자수첩] 조용히 ‘윤봉길 현장’ 찾고도 “협력 외교” 강조한 李대통령의 실용-공익](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2/art_1767840869_176x135.jpg)

![[뉴스텔링] ‘국회의장發 개헌’ 속도내나…헌법에 ‘5.18정신’ 담아 국민투표 가능?](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2/art_176783660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