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억원짜리 임시직원? 인기 연예인, 프로야구 선수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 임원을 이르는 말이다. 임원이 임시직원의 줄임말이 된 지는 오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휴일도 없다. 일반직원에 비해 10배 넘는 연봉을 받고, 100여개에 이르는 혜택을 받지만 2~3년 내에 짐을 싸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려한 임시직원’의 두 얼굴을 들여다봤다. (CNB=도기천 기자)

▲재벌그룹에 속한 임원은 실적은 기본이고, VIP(오너 일가)의 심중을 간파하는 뛰어난 정치 감각을 겸비해야 장수할 수 있다. SK그룹 주요계열사 임원들이 지난 1월 신년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과 함께 단상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급차·법인카드·골프이용권 ‘기업의 꽃’
‘연봉 6억’과 ‘파리 목숨’ 동전의 양면
직장인들 “임원보다 만년 부장이 낫다”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2015년도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주요 52개 그룹 상장 계열사 241곳을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 등기임원(등기이사)의 급여는 직원 평균 보수보다 10배 가량 많았다. 삼성전자는 무려 66배나 차이가 났다.
임원 1인당 평균 보수(연봉)는 6억2600만원으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6190만원에 비해 약 10.1배의 격차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임원 보수는 66억5600만원으로 52개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CJ제일제당(33억 600만원), SK이노베이션(29억 6000만원), 현대자동차(28억 7880만원), LG(25억 70만원) 순이었다.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16.6%(40개사), 20억원 이상을 준 기업은 2.5%(6개사)였다. 1억~5억원인 기업이 47.7%(115개사)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 사이는 29.5%(71개사)였다.
삼성전자의 임원 보수는 66억5600만원으로 52개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CJ제일제당(33억 600만원), SK이노베이션(29억 6000만원), 현대자동차(28억 7880만원), LG(25억 70만원) 순이었다.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16.6%(40개사), 20억원 이상을 준 기업은 2.5%(6개사)였다. 1억~5억원인 기업이 47.7%(115개사)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 사이는 29.5%(71개사)였다. 임원과 직원 간 보수 격차가 20배를 넘는 곳은 20개사였다. 삼성전자가 66.1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CJ제일제당(58.6배), 신세계푸드(48.4배), 현대백화점(44.1배) SK이노베이션(38.9배), 효성(32.9배), 롯데쇼핑(31.4배), 이마트(31.0배), 현대차(30.0배), 동국제강(28.4배), LG(27.9배), 호텔신라(27.1배), 아모레퍼시픽(26.8배), 두산(23.4배), 두산중공업(23.4배), GS(23.2배), GS리테일 (22.9배), 오리온(22.7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20.4배) 순이었다.
임원은 ‘기업의 꽃’으로 불린다. 회사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평직원에 비해 임원이 받는 혜택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
별도의 사무공간이 마련되며, 자동차, 법인카드, 골프장 이용권 등이 지급된다. 대리기사 이용, 경조사 화환,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수리비 등이 무제한 무료다. ‘월급쟁이의 꿈’이라 불릴 만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1000명 중 임원이 되는 사람은 7.4명에 불과하다. 기업 평가 회사인 CEO스코어의 지난해 조사 결과, 삼성 계열사 전체 임직원 22만여명 중 임원 비율은 0.9%, LG와 현대차는 각각 0.6%, 0.5% 뿐 이었다.

▲대기업 임원은 수억대 연봉에 수십 가지 특혜가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고용보장을 받지 못해 ‘쉬운 해고’의 0순위가 되기도 한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최근 동부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임원워크숍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원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하지만 ‘임원’의 법적 지위는 ‘임시직원’과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이른다.
대법원 판례는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회사의 경영진(사측)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단, 사용자가 임의대로 직원을 형식상 등기 임원으로 올려놓는 경우는 해당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만, 대기업 이사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원을 마음대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적용을 받기 힘들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이 자신이 해임됐다고 고용노동부에 제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런 처지다보니 ‘임원이 되면 최소 3년은 보장된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임원은 2년도 하기 힘들다’는 뜻의 ‘임불이년(任不二年)’이 낯설지 않은 세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불어 닥친 핀테크(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시스템) 바람으로 구조조정이 심한 금융권에서는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임원 승진’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실제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대대적인 인력·점포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주로 차장·부장급에 한정됐던 희망퇴직 대상이 대리급까지 낮아져, 지난해 신한·국민·하나·우리·SC제일·농협·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는 희망·특별퇴직을 통해 총 4361명이 회사를 떠났다. 농협·기업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의 지점은 2014년 말 4473개에서 지난해 말 4356개로 1년 새 117개나 줄었다.
이런 대대적인 구조조정 틈바구니에서 가장 손쉽게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임원’이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은 CNB에 “회사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보낼 직원이라면 일찍 승진시킨 뒤 임원으로 퇴직시키는 게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그러다보니 갈수록 간부급 직원들이 임원 승진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계 사상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으로 화제가 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최근 한 대학캠퍼스에서 자신의 성공담을 강연하고 있다. 그녀는 1985년 삼성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원보조로 입사해 30년 만에 임원이 됐지만, 최근 삼성을 떠나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사진=연합뉴스)
장수 하려면 정치 감각 ‘기본’
임원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는 기본이고, 토요일은 골프 약속으로 채워진다. 일요일 오후에 미리 출근해 월요일 회의 준비를 해야 할 경우도 다반사다. 차량 이동 중에도 늘 노트북을 켜두고 실적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휴일 오후만 되면 불안·초조해져서 일이 있든 없든 회사에 나가 있는 게 마음 편하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기업의 임원은 “오찬 때 반주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10회 이상 술자리를 갖는 셈이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원이 자리를 내놓는 경우는 실적 부진 때문만은 아니다.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와 사생활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장 한번을 잘못 찍거나, VIP의 심중을 제대로 못 헤아려 찍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뒤처리’를 위해 사령탑을 맡게 되는 ‘시한부 임원’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수백억원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고가 터진 부실 프로젝트를 1년간 떠맡은 뒤 퇴직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임원은 ‘자본시장의 꽃’이지만 화려해진 만큼 질 날이 가까운 서러운 존재다.
한 대기업의 부장급 팀장은 “임원 승진이 축하할 일이 아니다. 간부급 직원들 사이에는 ‘일찍 임원으로 승진해 회사를 나가느니 만년 부장이 더 낫다’는 말이 정설로 통한다”고 전했다.
정세현 경영컨설턴트는 CNB에 “기업 1세대(60~70년대) 시절의 임원은 한평생 회사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보응의 자리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실력 뿐 아니라 조직문화에 맞는 품성, 타고난 정치 감각을 갖춰야 하는 만능엔터테인먼트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이런 추세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도기천 기자)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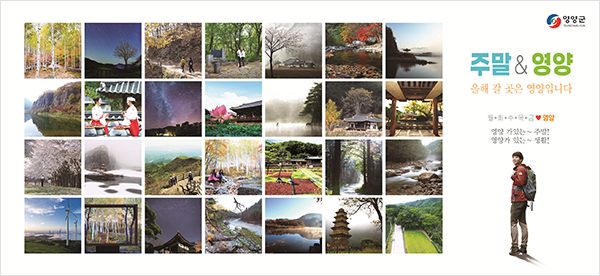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