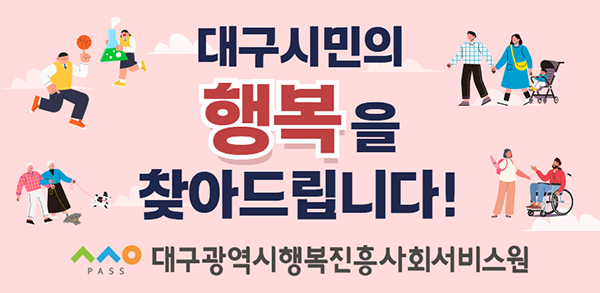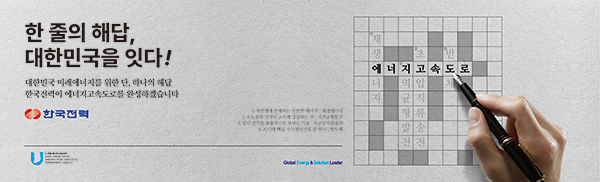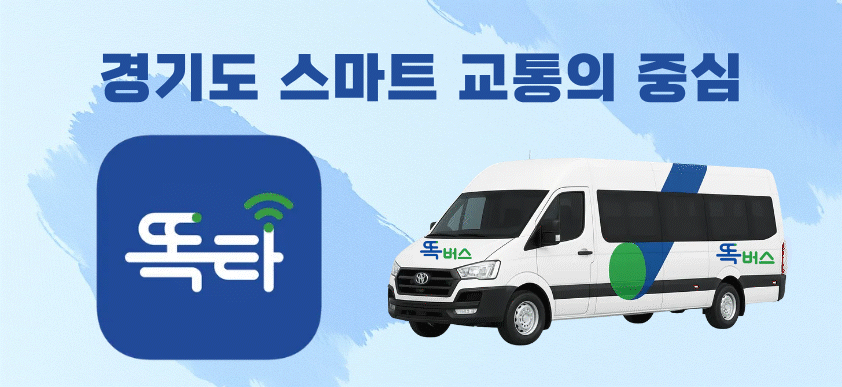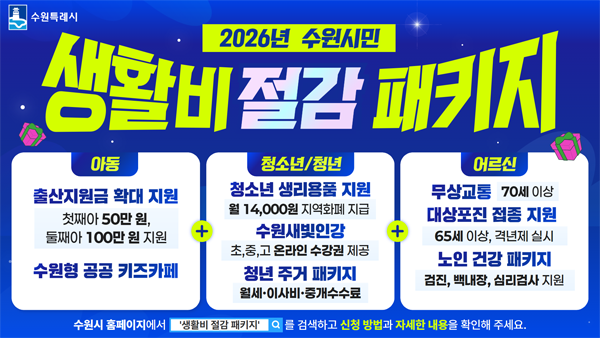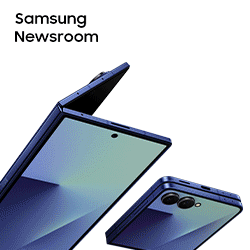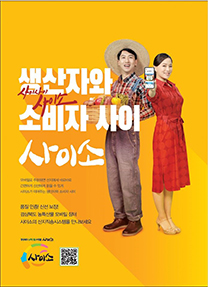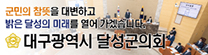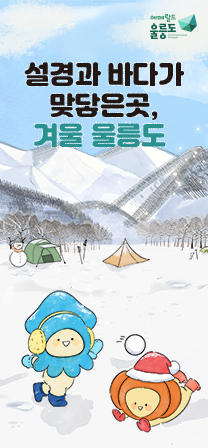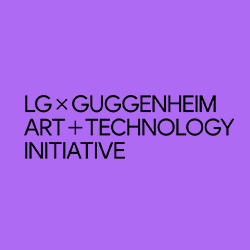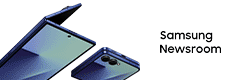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레노보 태블릿 ‘팹 플러스’와 샤오미 체중계 ‘미 스케일’. (사진=레노보·샤오미)
상황1)
지난 10월 19일 중국의 글로벌 IT기업 레노보는 6.8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팹 플러스(Phab Plus)’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출고가 39만 9000원의 중저가에 태블릿을 방불케하는 대화면을 장착한 팹 플러스는 불과 20여 일 만에 초도물량 3000대를 완판하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 제품은 1일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전파인증과 관련한 논란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난해 7월 이후 국내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LTE 유심이동성제도’라는 명목으로 ‘VoLTE’라는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VoLTE를 지원하면 이통 3사 모두 유심 칩 교체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팹 플러스는 이를 지원하지 않아 SK텔레콤과 KT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LG유플러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문제를 체크하지 않고 정식 출시를 허용했고, 출시 한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레노보는 전파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간단히 수정되는 문제인 것을 감안하면, 전파인증 단계에서 이같은 부분이 지적되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터였다. 레노보 측에서 보면 출시 초기의 금쪽같은 시기에 판매를 못하게 되어 손해가 막심하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팹 플러스가 의외의 인기를 끌자 국내 경쟁사들이 굳이 문제삼지 않아도 될 문제를 지적해 판매를 중단하게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것.
음모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VoLTE 관련 규정은 외산 스마트폰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막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과거 피처폰 시절의 ‘위피(WIPI)’처럼.
상황2)
‘샤오미 체중계’로 잘 알려진 ‘미 스케일(Mi Scale)’은 샤오미 제품다운 세련된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능을 겸비한 독특한 체중계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족 모두의 체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물론 체질량지수(BMI)까지 측정해줘 알음알음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이 제품 역시 1일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비법정단위’를 사용했기 때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조 및 수입을 금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샤오미 체중계는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램(g), 킬로그램(kg)’ 외에 ‘파운드(lbs)’, ‘근(斤)’같은 단위도 지원하는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위법이라는 것.
국내법은 미터법 기준에 맞는 단위만 허용한다. 마일(mi), 인치(in), 피트(ft) 등의 단위는 모두 불법이다. TV나 모니터 크기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인치를 사용함에도 제품명이나 광고에서는 ‘형’이라는 어색한 용어로 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법조항의 합리성, 효용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현행법은 킬로그램은 물론 파운드나 온스 단위로도 잴 수 있는 저울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샤오미 체중계를 판매하던 상당수의 판매업자들은 빠르게 판매를 잠정 중단조치했다. 일부 판매업자들은 제품을 개봉한 후 ‘킬로그램’ 단위로만 무게를 잴 수 있게 고정한 후 파운드, 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편법을 선택하고 있다.
예로 든 두 사안은 진행된 양상도, 문제된 지점도, 현재 상황도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 중국의 매력적인 신제품이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고, 이를 불편해한 경쟁사 혹은 정부당국이 법률·규정을 뒤늦게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두 제품 모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졌다.
일종의 ‘텃세’ 또는 ‘보호무역장벽’이 작동한 셈이다. 마치 과거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할 때 적지 않은 규제 관문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물론, 이 모든 사례들은 법과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반발이 일어난다. 상대방도 자국의 특수한 법률, 규정을 내세워 우리 제품에 트집을 잡을 수 있다. 무역 마찰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본전도 찾기 어려운 판을 벌리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심지어 양국은 완전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FTA 시대’에 돌입한다. 전자제품은 가장 대표적인 ‘무관세’ 분야다. 양국의 전자제품이 관세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때,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제품 그 자체의 경쟁력이다. 괜한 꼼수, 텃세에 의지할 생각을 버리고, 본연 경쟁력에 집중해야만 미래가 보일 것이다.
(CNB=정의식 기자)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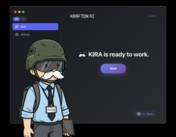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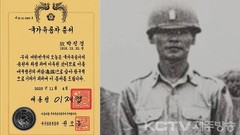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