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내년에도 조선·철강·자동차 등 수출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해당 업종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완성품들이 울산항에 정박 중인 현대글로비스 선박 앞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도기천 기자)
삼성 필두 대대적 구조조정 시동
줄이고 팔고 ‘다이어트’만이 살길
매물 내놓은 회사 팔릴지 최대 관건
우선 눈길을 끄는 곳은 삼성이다. 삼성그룹은 내달 초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인사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이건희 회장이 장기투병 중이라 결정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고 있다.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를 맞는 내년에는 빅딜과 사업재편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 전체 인력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경영혁신은 2013년 연말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을 삼성에버랜드에 넘기면서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엔 삼성SDS,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SDI 등 핵심계열사들이 줄줄이 합병·이전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삼성생명은 금융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룹내 금융지주사로의 전환 채비를 사실상 마쳤다.
올해 들어서는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등 4곳을 한화에 매각한 데 이어 삼성SDI의 케미컬 부문 등 3곳을 롯데에 넘기는 등 방위·화학 사업을 정리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성사시키며 몸집을 상당히 줄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맨=정년 보장’이라는 오랜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에서의 인력감축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최소 5천여명 이상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룹 내부에서는 ‘어느 계열사에서 몇백명이 떠났다더라’ 등 소문이 돌지만 회사 측이 공개한 바 없어 정확한 퇴직 대상자,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분기보고서의 재직자 현황을 보면 ‘삼성맨’이 얼마나 줄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동료가 떠난 곳은 스마트폰 사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다.
삼성전자의 임직원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9만9556명에서 올해 3분기 9만8557명으로 1천명 가량 줄었다. 삼성전자로부터 2012년 분사된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같은 기간 2만6938명에서 2만5599명으로 1400명 가량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부진은 삼성전기와 삼성SDI 등 다른 전자계열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삼성전기가 1년새 814명, 삼성SDI가 687명의 인력을 줄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 역시 1년 새 600명 가량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지난 3분기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로 ‘어닝쇼크’를 낸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1년 간 700명이 넘는 직원이 옷을 벗었고 삼성SDS 214명, 삼성카드 141명, 삼성증권 56명, 삼성생명 51명, 제일기획 28명 등 주력 계열사 대부분이 1년 전에 비해 직원수가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구조조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내년에는 인력 재배치 등 조직슬림화가 더 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그룹이 최근 1년간 주요계열사들의 인력을 상당부분 감축하는 등 재계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입구에 비친‘삼성맨’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철강·조선·중공업… 팔아도 팔아도 끝이 없다
LG는 주력인 휴대전화와 가전부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CJ헬로비전이 경쟁사인 SK텔레콤에 넘어간 상황이라 내년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미 LG전자는 연구원들을 상대로 인력 재조정에 들어갔다.
LG디스플레이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조명 사업을 넘긴 LG화학은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고, LG디스플레이는 그룹 내 OLED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전자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을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SK는 지난 6월 SK㈜와 SK C&C 간 합병을 완료하고 통합지주회사 체제로 거듭난데 이어, 최근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키로 했다.
SK㈜-SK텔레콤-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3단계 지배구조를 단순화 하는 것도 과제다.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지분을 SK하이닉스홀딩스(가칭)로 분리한 후 SK㈜와 합병을 통해 현재 SK㈜-SK텔레콤-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를 SK㈜-SK텔레콤·SK하이닉스 2단계 구조로 줄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악화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조선·중공업 기업들은 비주력 사업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해운·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의 매각·합병 등이 예고된 상태며, 현대중공업그룹과 포스코도 부실계열사 매각에 나선 상태다.
기업 경쟁력, IMF 직전보다 못해
이처럼 기업들이 너도나도 다이어트에 나선 이유는 갈수록 재무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00대 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은 잠재적 위험 요소가 높은 기업군이 무려 295개사(14.8%)에 달했다. 이 중 117곳은 영업손실(적자)과 당기순손실까지 더해져 심각한 수준의 경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벌닷컴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국내 30대그룹(공기업·금융사 제외)의 1050개 계열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이 모두 236개사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음을 뜻한다. 영업 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기 직전인 1996년보다도 기업 경쟁력이 더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한은이 연초에 발표한 올해 예상치는 3.5%였다.
무디스는 중국의 성장 둔화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해왔던 대중국 수출실적이 최근 크게 둔화됐기 때문.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의 엔저 기조도 내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유 화학 철강 건설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계속 될 것”이라며 “버릴 것은 버리고 알짜사업만 챙기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최근 일부대기업들이 부실계열사 매각에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 매수자가 있을지가 관건이며, 만약 인수할 기업이 없다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CNB=도기천 기자)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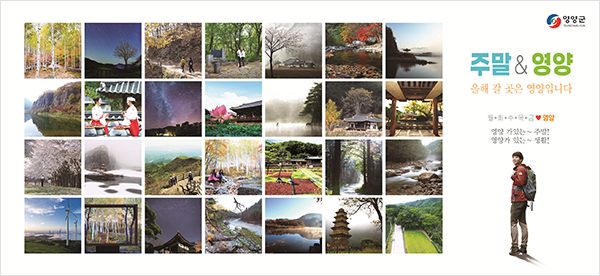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