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왼쪽)과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오른쪽)의 최근 모습. 검찰은 두 사람 간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았지만 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정그룹이었다는 점에서 ‘표적’이 됐다는 말이 돌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 중견업체들에까지 불똥이 튄 상황이다. 검찰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뭘까? (CNB=도기천 기자)
배성로 동양종건 회장 ‘먼지털이식 수사’ 논란
‘진퇴양난’ 포스코 의혹 5개월만에 종결 국면
‘영포라인’ 소문만 무성… ‘수사 실패론’ 솔솔
검찰은 올해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실세와 포스코그룹 수뇌부 간의 유착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대표적인 MB맨으로 알려진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주변을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칼끝은 조금씩 중심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당초 검찰은 두 갈래로 포스코를 압박했다. 첫째는 포스코 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다. 수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나 해외 현장을 이용해 검은돈을 챙긴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전직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 박모(52) 전 상무는 2009년 8월~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100억여원을 전달받아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여직원이 109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돈이 정 전 회장 주변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숙소 보증금을 빼돌려 횡령한 이 여직원은 부동산과 차량, 명품 등을 구입하는데 50억~60억원 가량을 사용했는데 나머지 돈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두번째는 포스코 그룹과 협력업체들 간의 각종 특혜 의혹이다. 포스코로부터 철강 중간재인 슬래브를 사들여 철선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협력업체 코스틸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과거 포스코가 비싸게 인수한 성진지오텍 역시 검찰 칼끝을 피해가지 못했다. 두 업체 관련자들은 모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비리 사건들의 정점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있고, 그 윗선에 정준양 전 회장이 있다는 게 검찰이 그린 밑그림이었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준양 회장 체제에서 ‘2인자’로 불린 정동화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지난 5월,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실치 않다며 기각했다. 정 전 부회장을 징검다리 삼아 정 전 회장을 엮겠다는 검찰의 전략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것이다.
검찰은 우회로를 모색했다. 포스코 주변에서 이권을 챙겼다고 의심받는 업체들의 범위를 넓혔는데 그 가운데 동양종합건설(동양종건)이 있었다. 검찰은 배성로(60) 전 동양종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모두 7가지 죄명의 범죄혐의를 적용하는 등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동양종건은 지난 2010년 포스코가 수주한 인도 CGL 제철소 공사에서 토목 공사를 따냈는데, 이 과정에서 약 300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돈의 일부가 정 전 회장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50여명의 수사진을 구성해 배 전 회장 자택을 비롯, 동양종건과 관계사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양종건 임직원 50여명이 무려 60여 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회사 임원 몇 명은 브라질에서 3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왜 배성로에 집착하나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배 전 회장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
포스코 수사는 지난 3월 당시 막 취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사정의 칼’을 뽑아든 것.
특정 현안을 겨누는 ‘원포인트 사정’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검찰 내 최고수사기구인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 대상은 전 정권과 호흡을 맞춰온 포스코, 효성그룹 등이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에 선임될 당시부터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인사설’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포스코가 시행한 각종 개발사업이 구설에 올랐고 그럴 때마다 정 전 회장과 박 전 차관의 이권개입설이 나돌았으며, 회사 내부인의 투서가 검찰과 언론사에 수시로 전달됐다.
박 전 차관은 대통령 고향출신 그룹인 ‘영포라인(영일-포항)’의 수장이자, ‘왕차관’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권력실세로 군림했다. 포항에 기반을 둔 포스코는 ‘영포라인의 자금줄’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동양종건과 영남일보의 대주주인 배 전 회장도 포스코와 얽히면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다.
대구 출생인 배 전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인물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전 회장과는 포항제철 시절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배 전 회장은 2003년 동양종합건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2005년 법정관리 상태인 대구지역 일간지 영남일보를 인수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양종건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앉은 2009년부터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10건 안팎의 대규모 해외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 제철소 등 포스코의 굵직굵직한 해외 건설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1600억원, 전국 도급순위 117위로 포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 가운데 하나다.
이 과정에서 해외공사 특혜수주, 정 전 회장과의 커넥션 등 각종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검찰 수사도 인도 현지법인 회계담당이던 현지인 M씨와 하도급업체 대표였던 P씨의 투서가 언론과 사정기관에 배포되면서 비롯됐다.
루머가 언론 등을 거쳐 계속 확산되자 배 전 회장이 직접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양종건은 수시로 해명 보도자료를 냈고, 영남일보 또한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배 전 회장 측은 “포스코의 해외 공사 수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가 물가상승, 파업손실, 돌관공사(짧은 기간에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 등에 따른 금액 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아 오히려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 실제로 포스코를 상대로 4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영포라인’으로 MB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 전 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포항·영일 출신을 지칭하는 ‘영포라인’과는 무관하며 정 전 회장과는 포스코에서 함께 근무한 것은 맞지만 근무지가 다르고 지연과 학연도 없다는 것이다.
동양종건 관계자는 CNB에 “30년 가까이 포스코의 협력업체로서 인연을 맺어왔으며, 해외사업도 포스코의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며 “적자를 내 원청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마당에 비자금 조성이라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동양종합건설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간기업인 포스코가 외풍에 약한 데는 ‘주인없는 기업’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00년 9월 완전 민영화 됐지만 외압 논란은 공기업 시절이나 매한가지였다. 민영화 후 첫 회장인 유상부 전 회장은 다른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게 문제가 돼 물러났다. 후임자인 이구택 회장도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중도 하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 회장들의 전철을 밟았다.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지만 지분은 7.81%에 불과하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포스코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재계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어오는 ‘외풍’ 탓에 포스코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재계 서열 6위인 민간기업을 사정당국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배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며 “포스코 수사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짧게 말했다.
(CNB=도기천 기자)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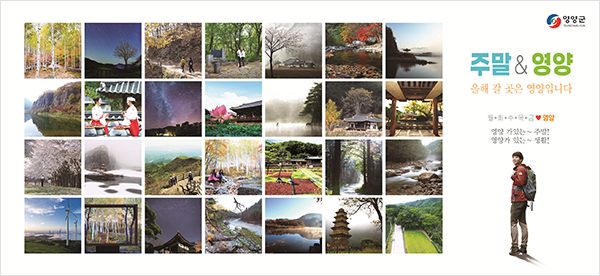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