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경제부장
구순을 넘긴 아버지는 손가락을 휘둘러 차남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임하고, 장남은 아버지의 뜻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외에도 친족들을 자신의 뒤에 줄 세워 쿠데타를 준비하고, 차남은 그룹의 전문 경영인들을 내세워 방어막을 치며 형과 일전을 치를 태세다. 이는 막장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롯데그룹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민낯이다.
지난 2011년 초에 신동빈 회장은 향후 경영 체제와 관련해 “형(신동주)은 일본, 내가 한국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밀려나자 신 회장 체제로 사실상 후계 구도는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일본에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운 신 전 부회장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배구조는 그간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런데 이번 경영권 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왕자의 난’이 불거지며 숨어 있던 지배구조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독특한 주주구성 때문이다. 직원 3~4명의 소규모 포장지 회사인 광윤사를 비롯해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 없는 투자전문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출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수 일가의 지분이 2.4%에 불과함에도 80개 국내 계열사 사이에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마치 봉건시대의 왕조와 같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신 총괄회장 특유의 폐쇄적인 경영 스타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증시에 상장하는 것조차 회사를 내다 파는 것으로 여길 정도의 독특한 경영 마인드가 오늘날 경영권 분쟁의 씨앗을 잉태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일 양국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분구조를 정리하지 않는 한, 롯데그룹의 형제 간 골육상쟁은 신 총괄회장이 과거 자신의 형제들과 그러했던 것처럼 대를 이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12개의 L투자회사가 98%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일본 기업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롯데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롯데의 순환출자를 조사하라고 연일 성토하고 있다. 또 올해 말에 있을 롯데면세점 재허가 여부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악재들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에 걸쳐 불명확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며 누리던 것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롯데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로 볼 수도 있다. 아직 경영권 분쟁의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골목 상권을 붕괴시킨 주범으로 몰리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아울러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35만 명을 먹여 살리는 국내 고용 1위 기업의 지위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왕자의 난’이라는 막장 드라마로 시작한 롯데그룹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제과, 푸드, 칠성음료 등의 식품과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주로 유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업은 총수 일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마치 개인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는 롯데 일가의 행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경고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도 “경영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로부터 승인받는 것임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LG전자,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WIS 2025’ 참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538877_176x135.jpg)


![[기자수첩] 한국에도 봄이 올까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479574_176x135.jpg)
![[뉴스텔링] ‘이재명 재판’ 4개의 시나리오…어떤 경우든 대선 출마 ‘이상 無’](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472701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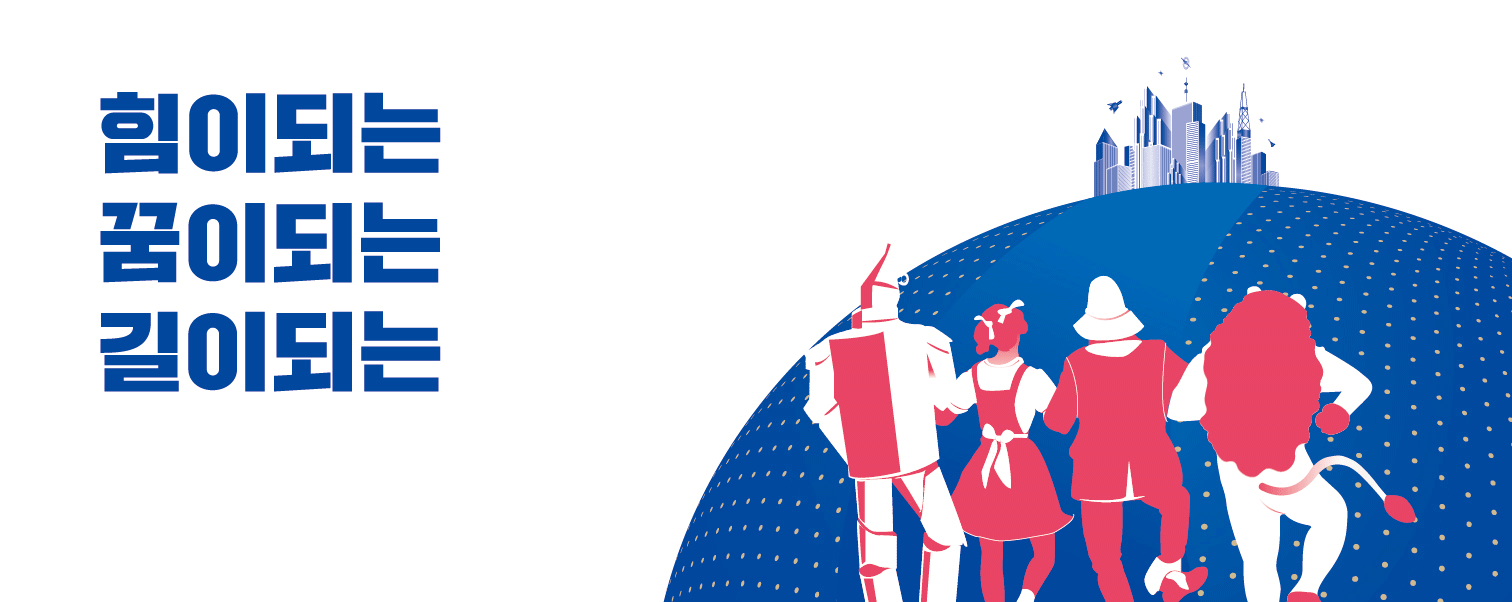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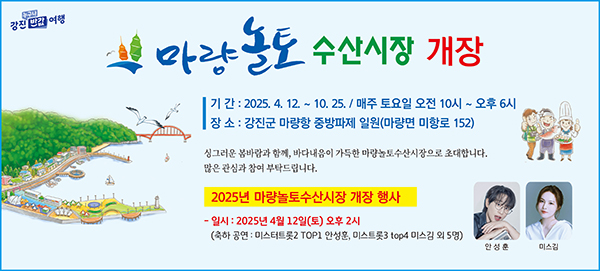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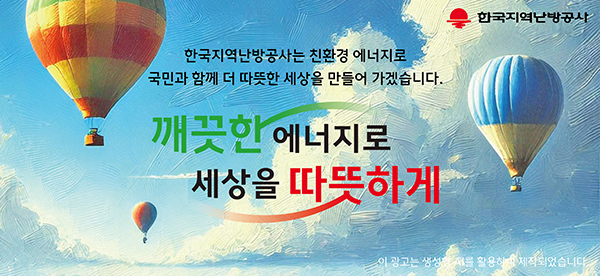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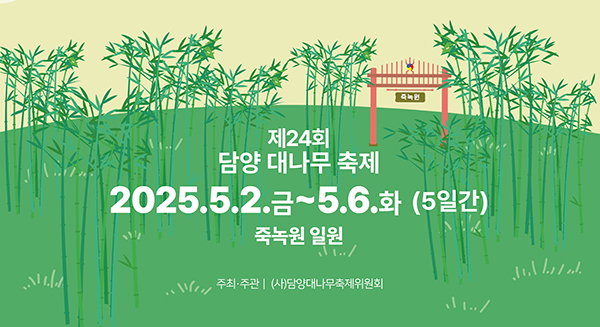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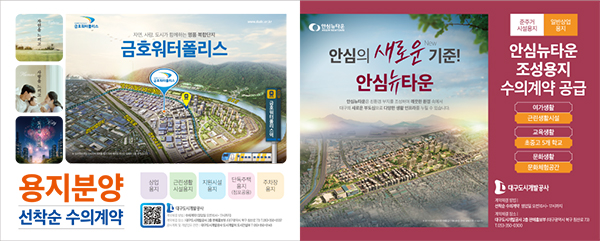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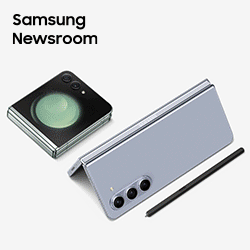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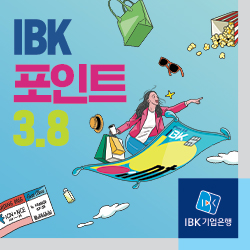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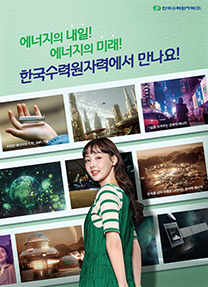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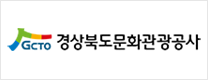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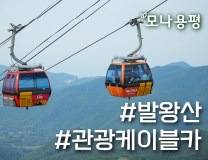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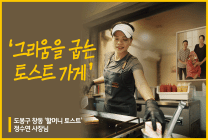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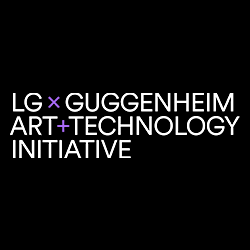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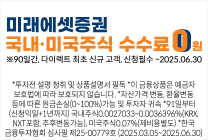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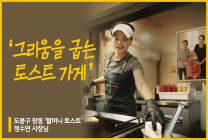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LG전자,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WIS 2025’ 참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538877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