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경제부장
(CNB뉴스=이진우 기자)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부채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영향 등으로 1089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 일인당 2150만 원으로 4인 기준 가구당 빚이 8600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증가 속도도 빨라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8조 원의 가계 빚이 늘어났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총부채비율’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데 있다. 한 국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총부채비율이 무려 314%에 달하며, 재정위기 직격탄을 받은 그리스의 267%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29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경기 회복을 이끌어왔다. 저금리의 달콤한 함정에 빠져 소위 ‘빚더미 정책’을 남발해오다 한계상황에 다다랐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됐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의 숨결을 이어가고 있다.
빚더미를 부풀려 경기 불황을 모면하겠다는 정책이 만약 눈에 띄는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곧바로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빚더미를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에서 가계대출이 항상 소득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소득 대비 더 높은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 결국엔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경기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빚더미를 부풀리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미국마저도 빚더미로 유지하며 위태롭던 경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경제도 파국을 맞을지 모른다.
우리 경제는 현재 인구구조의 악화 속에서 혁신의 속도도 정체되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빚더미에만 의존해 가까스로 경제를 유지한다면, 결국 우리 경제는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변함없는 성장 동력이라 여기고 모든 자원을 이곳에 융단 폭격하듯 쏟아 넣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5년 전 똑같은 정책을 썼던 일본이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을 지켜봤고, 또한 2008년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로 대기업과 부동산 정책을 남발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빚더미에 허덕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경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LG전자,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WIS 2025’ 참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538877_176x135.jpg)


![[기자수첩] 한국에도 봄이 올까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479574_176x135.jpg)
![[뉴스텔링] ‘이재명 재판’ 4개의 시나리오…어떤 경우든 대선 출마 ‘이상 無’](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472701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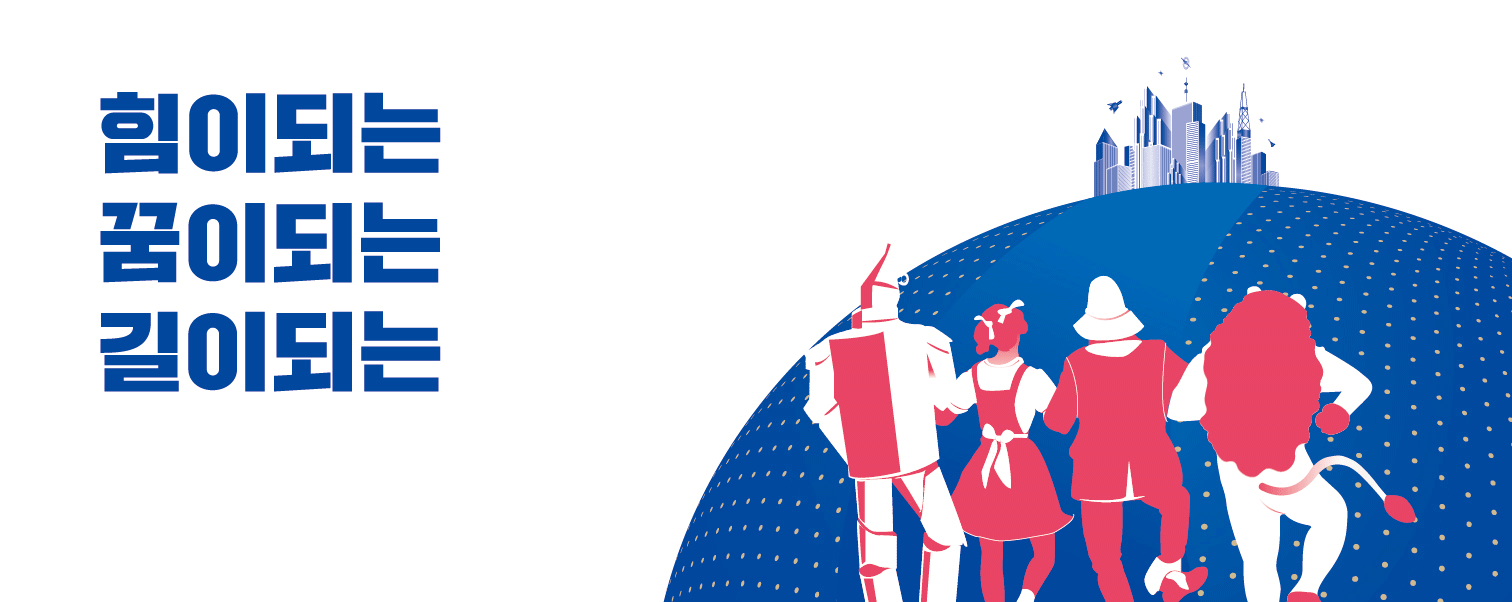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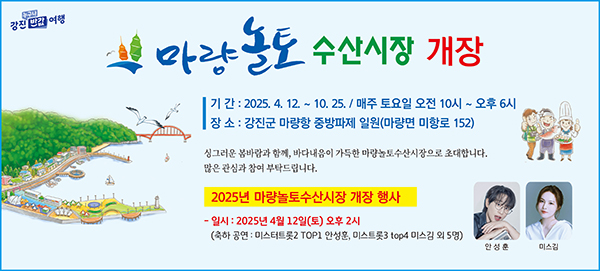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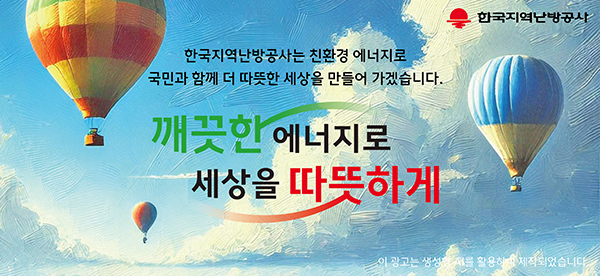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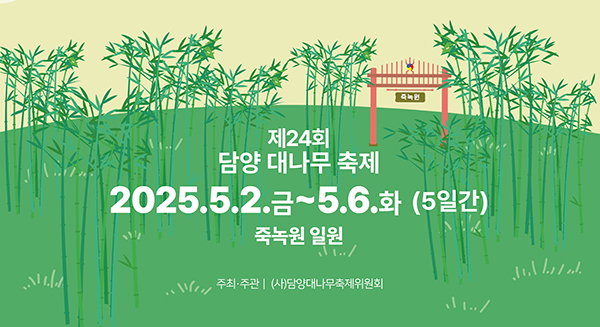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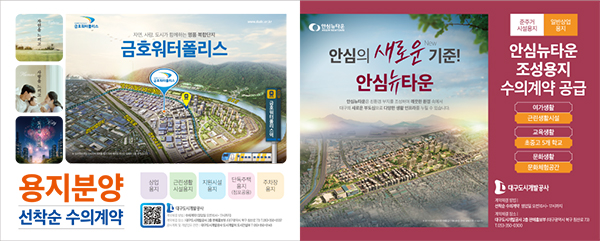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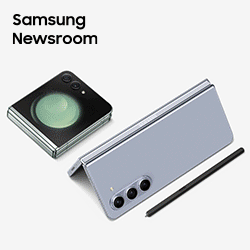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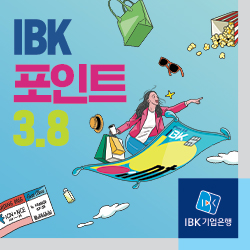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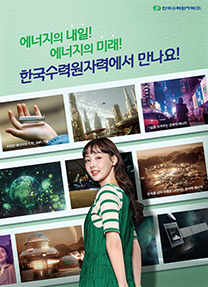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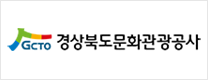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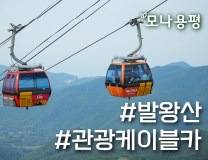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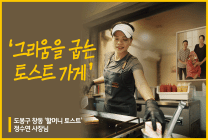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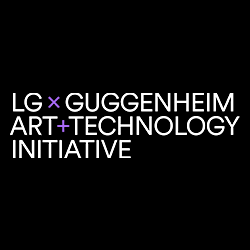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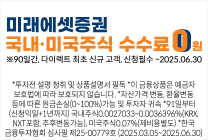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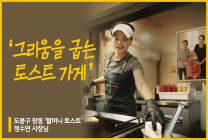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LG전자,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WIS 2025’ 참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538877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