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좌로부터 송 연숙의 연화루각, 원대 연우루각
24일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따르면, 서금석 학생은 최근 ‘고려시대 물시계에 대한 시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한국사연구’(한국사연구회) 165호에 주저자(교신저자 김병인)로 등재했다.
서금석 학생은 논문에서 “고려시대 물시계 이름은 루상수(漏上水)였으며, 별칭으로 궁루(宮漏)·금루(禁漏)·은루(銀漏) 등으로도 불렸다”고 밝혔다. 또 물시계의 제작과 시간 질서가 전통사회의 통치기제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특히 서금석 학생은 김병인 교수의 지도 아래 올 한 해에만 여섯 편의 논문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발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학생은 지난 2월과 3월, 고려시대 시간 질서가 당시 동북아시아 정치 단위체간의 세력 교체와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요나라와 금나라의 ‘기삭술(氣朔術)’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학생은 논문에서 “당시 고려는 송나라 뿐 아니라 요나라와 금나라, 그리고 원나라의 시간 질서를 수용하면서도 자체적인 시간 체계를 지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중세사학회’(제38호)와 ‘역사학연구’(제53호)에 ‘보기삭술(步氣朔術) 분석을 통해 본 고려전기 역법(曆法)’, 그리고 ‘고려 중기 역법(曆法)과 금(金)의 중수대명력(重修大明曆) 보기삭술(步氣朔術) 검토’라는 제목으로 각각 게재됐다.
또 지난 6월에는 고려시대에 지금과 비슷한 ‘호미’가 발견된 것을 단서로 호미의 변화가 고려시대 다양한 밭작물의 출현과 여성의 노동력 유입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증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려시대 소형 호미의 이용과 밭농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역사학계 권위지인 ‘역사학보’(역사학회) 222집에 게재돼 고려시대 농업경제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이미 사라진 절일(節日)·세시(歲時) 중 하나인 ‘납일(臘日)’을 추적, 고려시대 납일(臘日)의 위상을 밝혔다. 납일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한 해의 액을 막고, 또 다른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중요한 절일(節日) 문화중 하나였다. 이 논문은 ‘역사적 추이를 통해 본 고려시대 납일(臘日)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한국사학보’(고려사학회) 제56호에 게재됐다. 그리고 ‘조선시대 납일(臘日)의 위상’이란 논문은 ‘진단학보’(진단학회) 122호에 투고됐다.
서금석 학생의 이런 연구성과는 사학과 김병인 교수의 지속적인 지도가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멀게는 전남대학교 사학과가 지난 7년 동안 수행해온 BK사업의 결실로 해석되며, 가깝게는 8월부터 국문과, 철학과와 함께 지방대특성화(CK) 사업의 하나로 ‘글로컬 문화가치 문사철 융합인력 양성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전공능력 함양에 힘쓴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게임 인사이드] 신작에 희비 갈린 게임업계…올해도 키는 ‘뉴페이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84888_176x135.jpg)



![[생생르포] ‘열린 공장’을 체험하다…평택 ‘hy팩토리+’ 가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78463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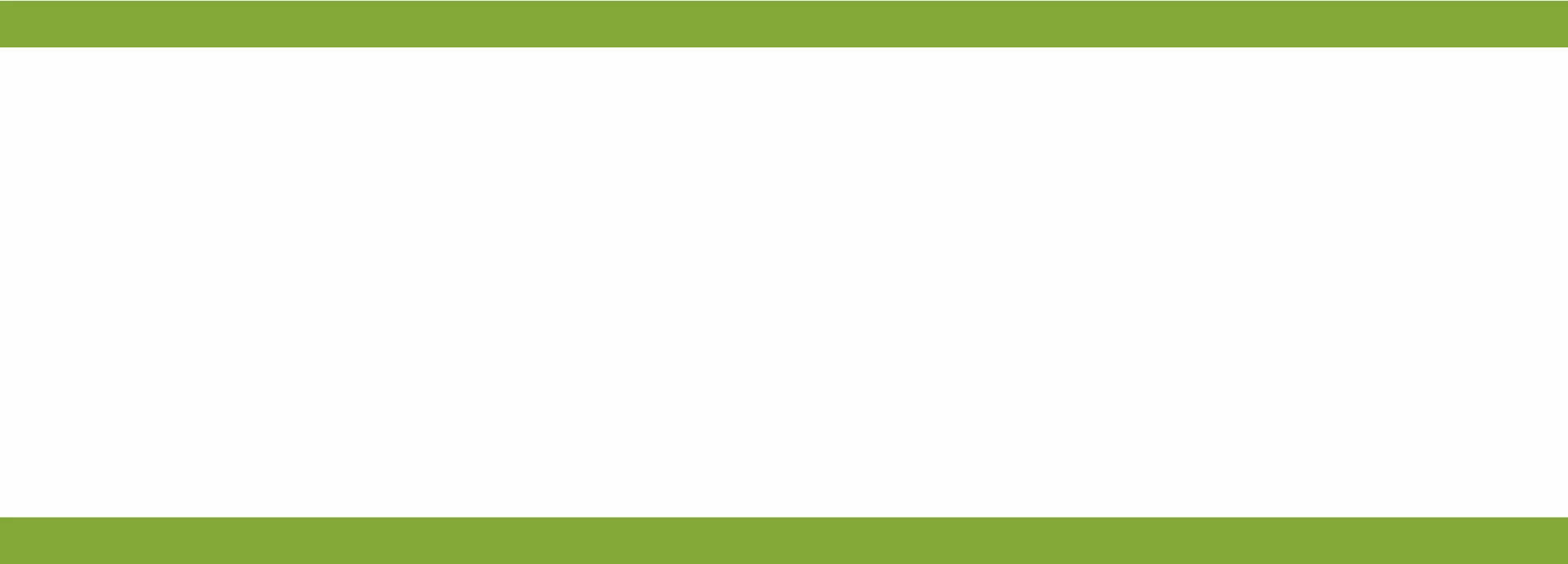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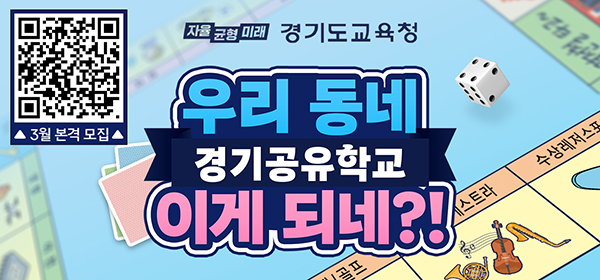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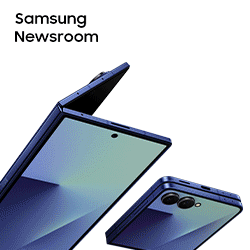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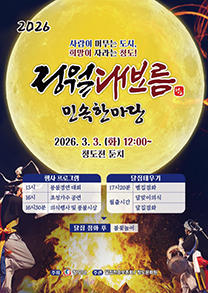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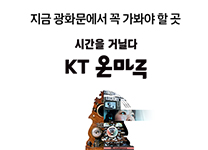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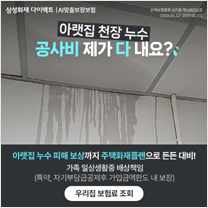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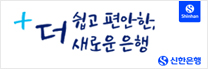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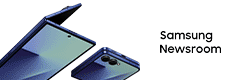
![[게임 인사이드] 신작에 희비 갈린 게임업계…올해도 키는 ‘뉴페이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84888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