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도기천 정경부장
이번 분란은 지난 6월9일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KB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과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내부 잡음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금감원 징계에 태클을 걸었고, 전산기 교체 또한 은행 내부적인 일인데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면서 징계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금융권에 파다하게 퍼졌다.
아니나 다를까 이달 초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내린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중징계(문책경고)로 번복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행장은 즉시 사퇴했지만 임 회장이 버티자, 금융위는 한 술 더 떠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몇시간 만에 검찰이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임 회장은 행정소송(직무정지 처분 취소)으로 맞섰지만, 17일 열린 KB이사회는 결국 임 회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중징계 통보에서 해임까지 정확히 100일이 걸렸다.
이쯤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의혹을 ‘팩트’로 봐도 무리가 없을듯 싶다.
‘서민의 벗’이 어쩌다 이리됐나?
국민은행은 각종 예금제도 등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국책은행으로, 1962년 제정된 국민은행법에 의해 설립됐다. 1995년 국민은행법이 폐지되면서 일반상업은행으로 탈바꿈했고, 2003년 정부가 지분 9.1%를 모두 매각하면서 완전 민영화됐다.
하지만 CEO 교체 때마다 외풍이 불었다.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회장은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져 왔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행장과 지주회장은 정권 실세나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몫이라는 관행이 굳어져 갔다. BH(청와대)의 의중이 누구냐에 따라 행장과 지주회장이 결정됐다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임 회장 또한 모피아 출신(행정고시 20회)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이자 최측근이었던 어윤대 전 회장이 영입한 케이스였다. KB를 제재한 신제윤(24회) 금융위원장, 최수현(25회) 금융감독원장도 모피아 출신들이다.
이런 분위기라 때가 되면 자리를 비껴줘야 했다. 분위기를 못읽고 ‘버티기’에 들어갔단 사정없이 철퇴를 맞았다. 황영기·강정원·어윤대 등 전 KB 회장들은 줄줄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물러났다. 이번에도 임 회장의 자리보전 욕심이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달의 가장 큰 피해자는 3만여 KB구성원들이 됐다. 모피아들끼리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는 동안 1등을 달리던 국민은행의 실적은 올해 상반기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예금·대출 시장 점유율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외부 ‘낙하산’들이 내려올 때마다 KB는 줄서기 문화와 세력 다툼으로 내홍을 겪었다. 왜곡된 승진문화는 KB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됐다.
KB가 관치 논란을 딛고 1위금융기업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CEO 선임과정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KB금융의 회장은 사외이사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이 추천위에 임직원 대표, 경제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 추천 기준 및 선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보군을 공모형태로 정하는 방식도 도입돼야 한다.
회장과 행장의 볼썽사나운 알력 다툼이 KB사태를 더 키웠다는 점에서 행장 위에 지주 회장이 있는 ‘옥상옥’ 구조도 이번 참에 손봐야 한다.
한때 서민들의 땀이 밴 쌈짓돈을 지켜주고 희망을 안겨주던 곳이 ‘국민은행’이었다.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고 봉급생활자를 위해 재형저축을 만들었으며,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바꿔준 ‘서민의 은행’이었다.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CNB=도기천 정경부장)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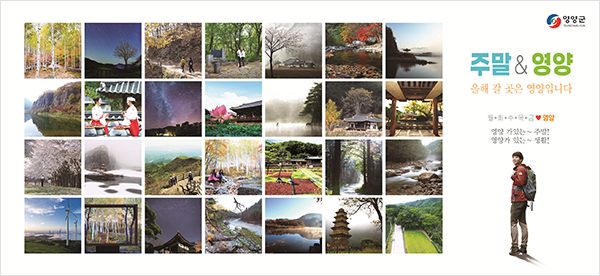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