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뉴스=신규성 기자) 보건의료 신기술이 임상과 돌봄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주관으로, 신기술의 혁신성과 국민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서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기술 규제는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위험기반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며 현장 참여형 거버넌스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신뢰 형성, 실행 가능한 규제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구체적 기술 사례와 제도적 과제가 제시됐다. 엔젤로보틱스 조남민 대표는 의료재활용 웨어러블 로봇의 현황을 소개하며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사회적 수용성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림대 김근태 교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통한 하지 외골격 로봇 제어 연구를 발표하며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의대 김한나 교수는 “AI·로봇 융합의 위험과 기대를 공론화할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규제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과 함께, 피지컬 AI를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협력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보험 급여체계의 한계, 공공 데이터 공유 및 파이낸싱 체계 개선 등 정책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은 “기술 발전에 비해 제도적 투자가 부족하다”며 “전체 연구비의 일부만 수용성 연구에 투입해도 사회적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 AI 규제 및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공공-민간 협력과 R&D 투자 확대, 그리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수용성과 형평성, 설명 가능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게임 인사이드] 신작에 희비 갈린 게임업계…올해도 키는 ‘뉴페이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84888_176x135.jpg)



![[생생르포] ‘열린 공장’을 체험하다…평택 ‘hy팩토리+’ 가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78463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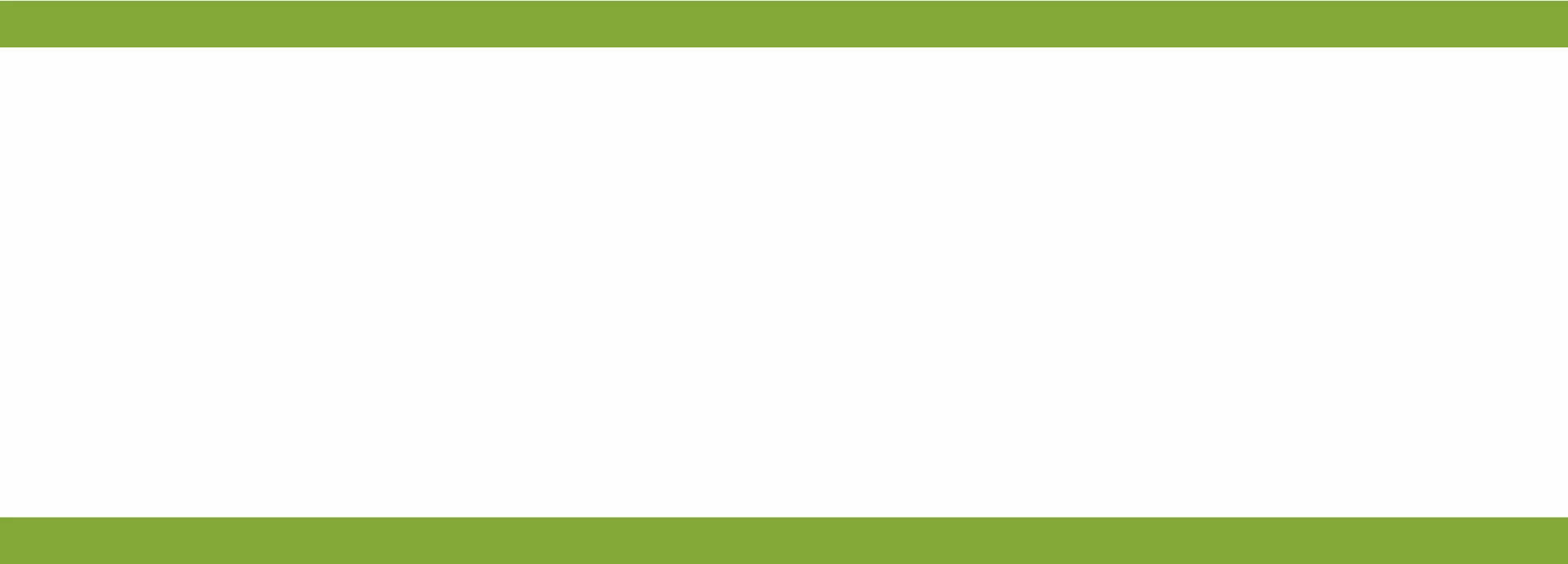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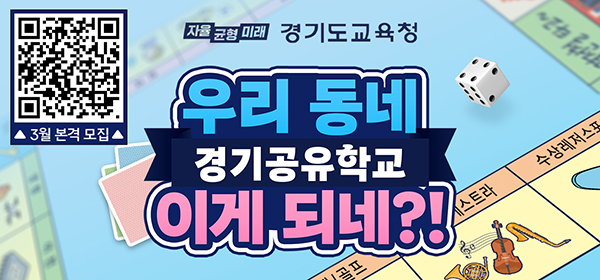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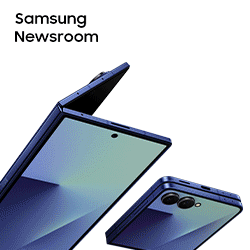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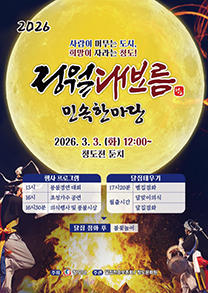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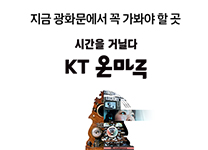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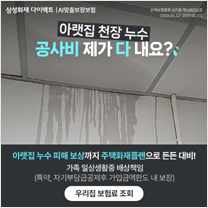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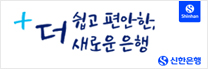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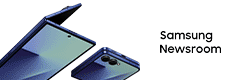
![[게임 인사이드] 신작에 희비 갈린 게임업계…올해도 키는 ‘뉴페이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84888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