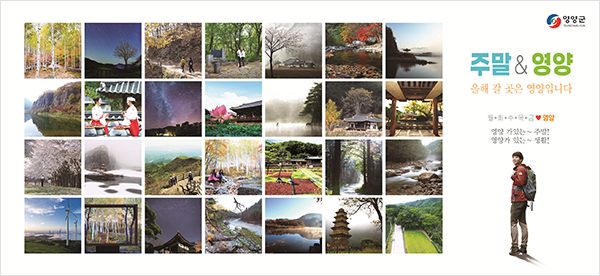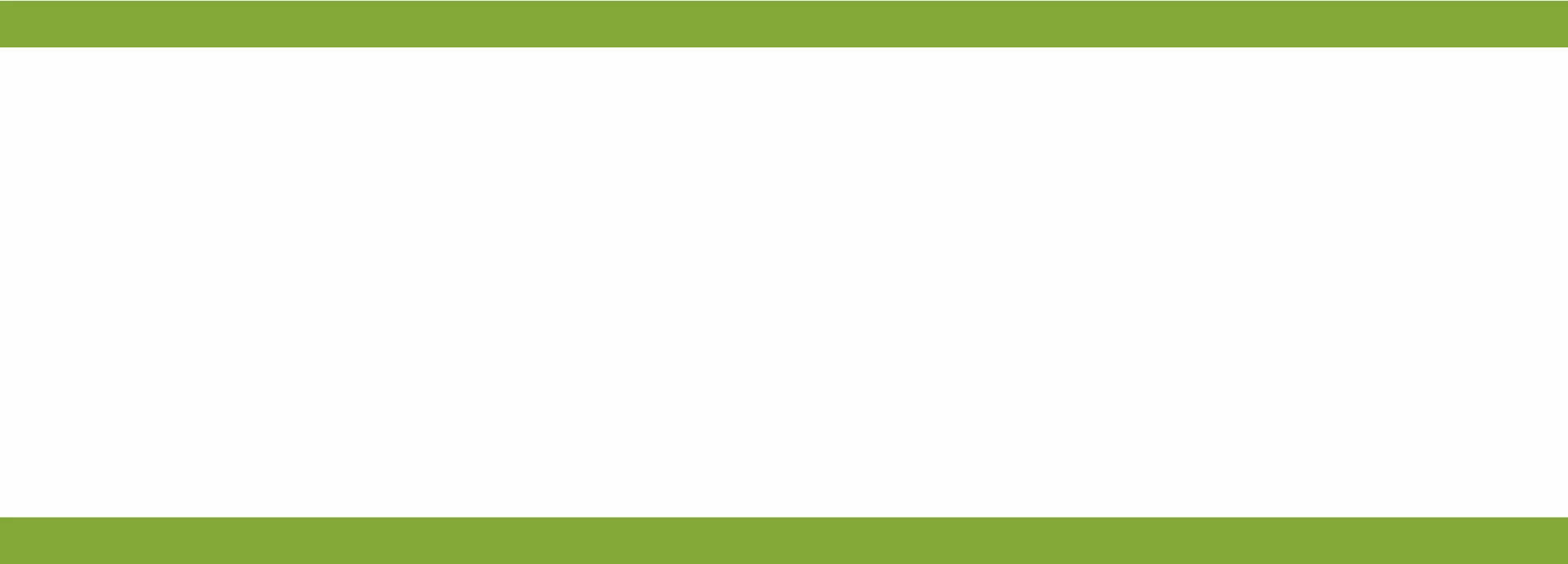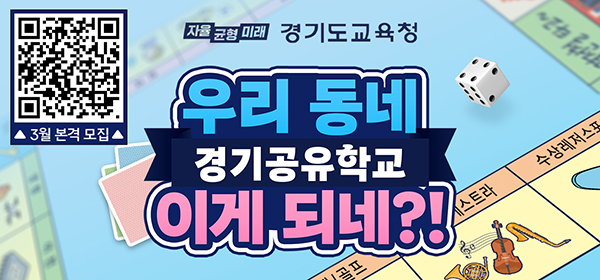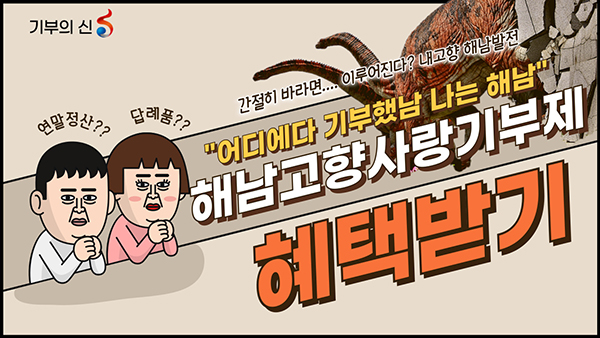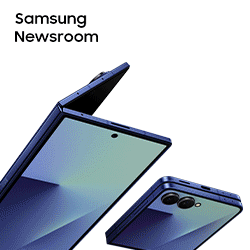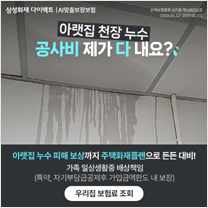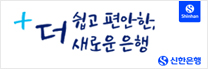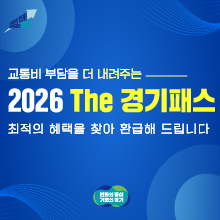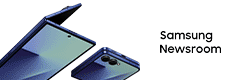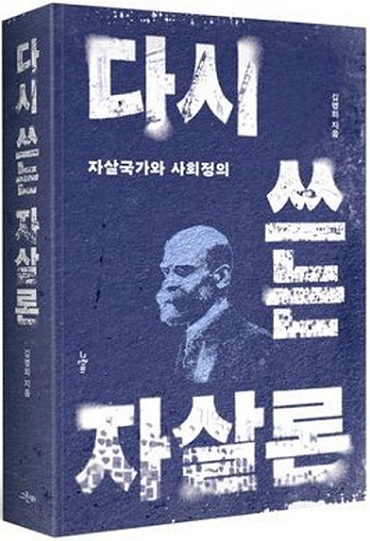
경상국립대학교는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김명희 교수가 '다시 쓰는 자살론: 자살국가와 사회정의'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사회 자살 문제와 사회학의 창시자인 에밀 뒤르케임 연구에 10년 넘게 천착해 온 사회학자 김명희 교수는, 오늘날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로 ‘자살공화국’, ‘자살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의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세기 말 뒤르케임이 자살론에서 선보인 사회학적 사유방식을 현대 한국사회 자살 문제의 진단과 해법에 접목한다. 말하자면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자살론을 다시 쓰고, 한국사회 자살현상을 자살론으로 다시 읽는 작업을 통해 자살 문제가 사회정의의 문제이자 곧 인권의 문제임을 치밀하게 드러내 보인다.
'다시 쓰는 자살론: 자살국가와 사회정의'는 크게 3부의 편재와 9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부의 주제는 ‘자살론의 현대적 해석’이다. 먼저 제1장 ‘자살과 통치’에서는 한국의 국가수준 자살예방정책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의료화와 생명정치에 포섭된 한국 자살예방정책의 한계를 면면이 짚어본다. 제2장 ‘자살의 사회학’에서는 '자살론'을 성공으로 이끈 뒤르케임의 사회과학방법론을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제3장 ‘숙명론적 자살의 수수께끼’에서는 뒤르케임의 자살유형학에서 주변화된 숙명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 개념이 현대 한국사회의 지리-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의미한 개념임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뒤르케임의 '자살론'이 이론과 방법론 모두에서 한국사회 자살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위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 책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자살은 한국의 국가성의 문제와 긴밀히 맞닿아 있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그렇기에 곧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2부 ‘자살과 정치’에서는 한국사회 자살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한국 현대사의 여러 자살 초점 집단의 사례를 통해 드러내 보이는 사회학적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자살과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제4장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국가폭력이었던 5·18 자살자 사례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부검을 통해 국가폭력 트라우마가 매개하는 숙명론적 자살의 작동방식을 탐색한다. 제5장 ‘자살과 가족’의 관계를 다루는 제5장에서는 5·18 자살자 유가족의 사례를 통해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가족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잠재적인 자살 생존자가 돼가는지를 살펴본다. 제6장 ‘자살과 분단’에서는 분단국가의 주변부에 위치한 탈북민들의 자살 문제를 통해 전쟁정치와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가 얽혀 들어가는 독특한 국면을 탐색한다.
제3부 ‘자살과 인권’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자살현상을 사회재난의 한 형태이자 생명권과 안전권, 연대권 등 인권의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대안적인 생명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제7장 ‘자살과 재난’에서는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의 자살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시도한다. 제8장 ‘자살과 직업집단’은 2023년 ‘서이초 사태’로 가시화된 초등교사들의 자살 사례를 통해 직업집단의 자살 문제와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제9장 ‘자살레짐을 넘어서’에서는 뒤르케임의 연대이론과 도덕과학을 윤리적 자연주의의 계보에서 새롭게 조명하며, 인권기반 역량 접근이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적 해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융합의 시대 요청되는 학제성의 철학을 뒤르케임의 통합적 인간과학의 기획으로 거슬러 올라가 되불러오고, 다학제적 자살연구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김명희 교수는 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적 치유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통합적 인간과학의 가능성: 맑스와 뒤르케임의 실재론적 귀환', '경남 근현대사: 사건, 공간, 운동', '5.18 다시 쓰기', '계몽된 상식: 비판적 실재론의 철학' 등의 저술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참사가 낳은 사회적 고통과 치유를 위한 학제간 연구에 주력해 왔다.
























![[뉴스텔링] “중국을 뚫어라”…게임업계 ‘서브컬처’ 전략은 성공할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673961_176x135.jpg)
![[뉴스텔링] 정청래-조국의 대권 욕망? ‘합당 밀약설’ 실체](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089184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