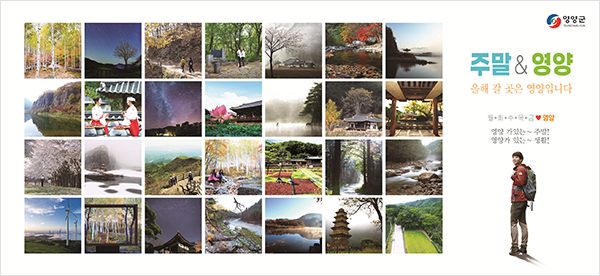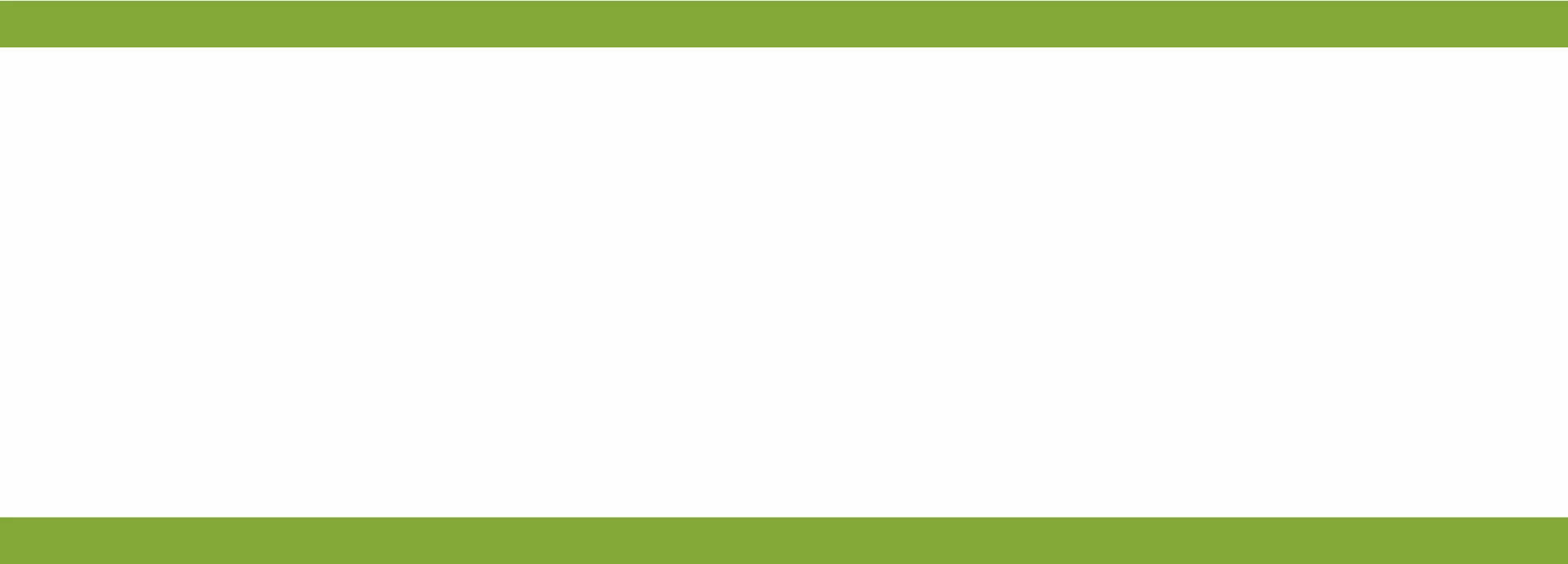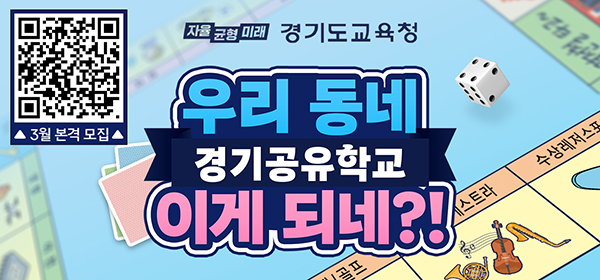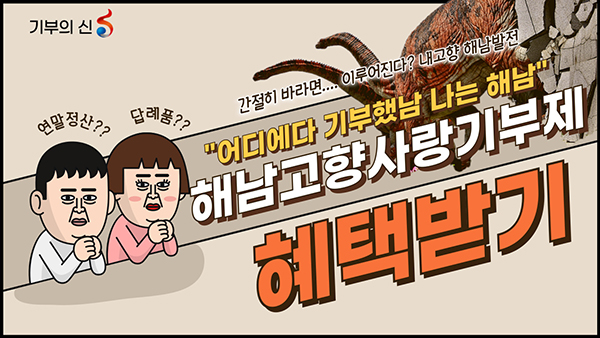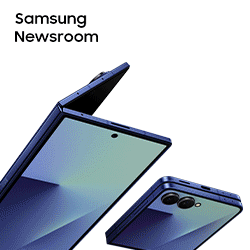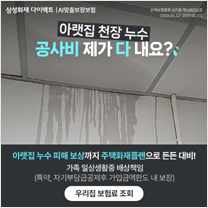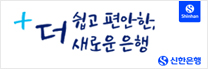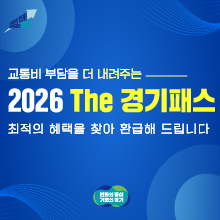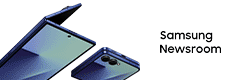부산대, 한글 읽기의 병렬 처리 효율성 밝혀
주성준 교수팀 “의미 연결된 한글 단어쌍 정보 처리 효율적”…1440개 단어 실험 결과 발표
 손혜영기자 |
2025.07.22 10:31:06
손혜영기자 |
2025.07.22 10:31:06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러 단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단어를 끝내야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지, 이 오래된 의문에 국내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영어 단어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두 단어 병렬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머물렀지만, 한글 단어를 사용한 이번 연구는 결과가 달랐다. 한글은 영어보다 정보 처리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자주 함께 쓰이는 한글 단어는 병렬 처리까지도 가능했다.
부산대학교는 심리학과 주성준 교수 연구팀이 보통 동시에 두 단어에 주의를 배분해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예: 눈+사람)’와 ‘의미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예: 연필-지우개)’에는 두 단어 모두에 자연스럽게 주의가 분산되고, 뇌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병렬 처리함을 밝혀냈다고 22일 밝혔다.
합성어를 만드는 두 단일어는 함께 쓰이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읽을 때 나머지 하나의 단어가 동시에 뇌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통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며, 예측이 가능한 단어가 나올 때가 많다. 연구팀은 이러한 맥락 단서와 한글 쓰기 체계의 특징이 한글 단어의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19~28세 남녀 42명을 대상으로, 각 한글 단어쌍을 보여주고 생물/무생물을 명확하게 분류하게 했다. 제시된 단어는 1440개로, 총 720개 단어쌍이었다.
이때 단어쌍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눴다. 첫 번째 유형은 자주 함께 등장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연결이 없는 ‘무관련 단어쌍’, 두 번째 유형은 ‘합성어 내 단일어 단어쌍’, 마지막 유형은 뉴스 기사나 일상 언어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고 의미적으로도 관련 있는 ‘의미 연관 단어쌍’이었다. 무관 단어쌍은 가위-마당, 모래-대학생, 단일어 단어쌍은 고추-잠자리, 척추-동물, 의미 연관 단어쌍은 고모-이모, 연필-지우개와 같은 단어들의 모음이다.
연구팀은 각 단어쌍을 동시에 제시한 뒤, 참가자들에게 단어를 생물/무생물로 분류하는 의미 범주화 과제(semantic categorization task)를 수행하게 했다. 누이(생물)-동생(생물), 가족(생물)-사진(무생물), 모래(무생물)-시계(무생물)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제시된 단어쌍 중 하나의 단어에만 주의를 주어 과제를 수행하는 단일 과제와 두 단어 모두에 주의를 주어 과제를 수행하는 이중 과제 조건의 결과를 토대로 각 조건의 단어쌍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조사했다.
실험 결과, 영어 단어쌍을 사용한 선행 연구에 비해 이번 연구에 사용한 한글 무관련 단어쌍의 두 단어의 의미 파악이 더 효율적임을 확인했다. 그러한 한글 단어 처리의 효율성에 더해, 합성어 내 단일어 단어쌍과 의미 연관 단어쌍과 같이 두 단어가 연관이 있을 때에는 두 단어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합성어 내 단일어 단어쌍과 의미 연관 단어쌍에서 한쪽 단어(누이)를 맞힐 경우에 다른 한쪽(동생)을 맞힐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주 같이 등장하는 단어나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은 한 단어를 읽을 때 다른 단어를 뇌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러 글자를 ‘이어쓰기’로 단어를 만드는 영어와 달리 자모를 ‘모아쓰기’해 단어를 구성하는 한글의 쓰기 체계, 음운 소리와 글자가 거의 일대일로 대응되는 음절구조, 규칙적인 철자법 등의 차이가 두 단어에 효율적으로 주의를 할당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발견은 언어별 읽기 메커니즘과 주의 집중 전략을 새롭게 조명하며, 다국어 학습과 독서 교육법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성준 교수는 “읽기는 지식 습득, 의사소통, 그리고 개인적 성취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간 행동이다. 읽기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미적으로 연관된 한글 단어들에서는 한 단어의 활성화가 관련 단어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 관련 없는 단어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자음 대응 및 단어/음절 경계와 같은 문자 체계의 차이가 읽기에 필요한 지각 및 인지 처리의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에서 병렬 처리가 어렵다는 선행 연구에 비춰 볼 때, 읽기의 기저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문자 체계가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연구팀은 앞으로도 언어별 차이를 정교하게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 읽기 교육과 난독증 등 인지 재활 분야에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한글 읽기에서 속독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속독은 한 페이지에 흩어진 수많은 단어를 초고속으로 훑어 정보를 파악하는 기법이지만, 복합적인 의미 이해나 깊이 있는 독해가 요구되는 글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주성준 교수는 “우리 연구가 보여준 한글 단어의 병렬 처리 가능성은 단어 간 의미가 강하게 연결될 때에 한정된다”며 “본문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전히 순차적 처리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보호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부산대 심리학과 전임연구원 유상아 박사가 제1저자, 주성준 교수가 교신저자로 수행했다. 해당 논문은 '저널 오브 익스페리멘털 사이콜로지: 제너럴(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7월호에 게재됐다.























![[뉴스텔링] “중국을 뚫어라”…게임업계 ‘서브컬처’ 전략은 성공할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673961_176x135.jpg)
![[뉴스텔링] 정청래-조국의 대권 욕망? ‘합당 밀약설’ 실체](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089184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