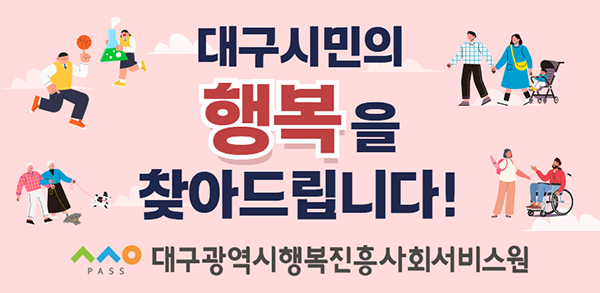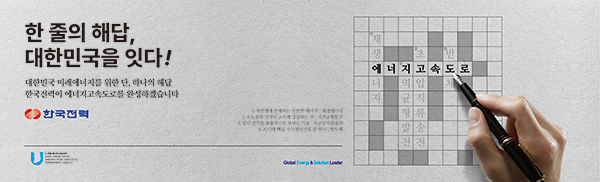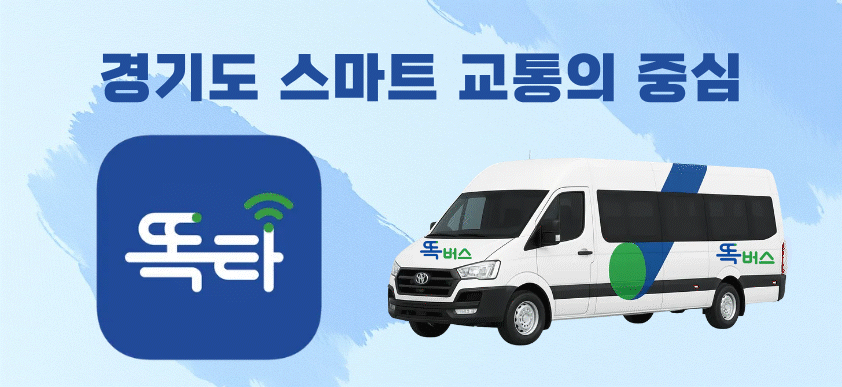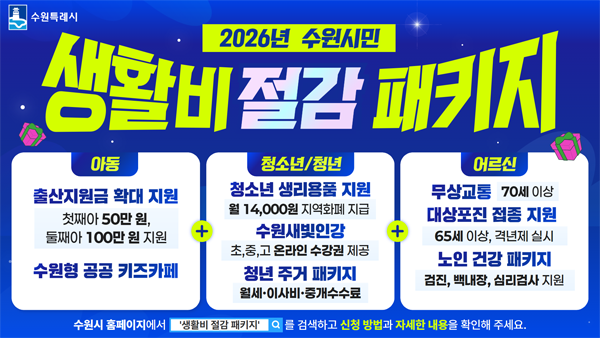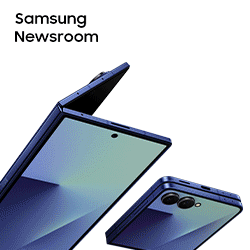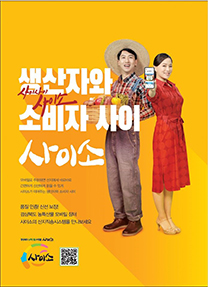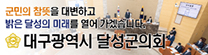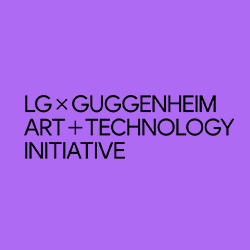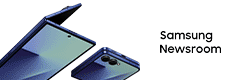지난 5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밖에 남지 않게 됐다.
피처폰 시대부터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막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었다는 생각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LG전자 MC사업본부의 실적이 적자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건 2014년 10월부터다. 그해까지만 해도 LG전자 MC사업본부는 매출액 15조1053억원에 영업이익 3161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15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바로 1196억원의 적자를 봤고, 2016년엔 기록적인 1조218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로도 적자 추세는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피처폰에 집중하다 스마트폰 시장에 한 발 늦게 뛰어든 것, 삼성전자, 애플과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어려운 경쟁을 한 것, 모듈형 스마트폰(G5) 같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혁신 시도의 실패,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급성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 속에서도 LG전자 스마트폰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다.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은 가장 큰 시장인 북미와 두 번째로 큰 시장인 국내 소비자들의 존재였다. 하지만 2020년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2019년 3조3000억원이었던 북미 매출액은 2020년 3조2200억원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지만, 국내 매출액은 2019년 1조5000억원에서 2020년 7646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다. 문제는 국내 시장이 비록 시장 규모는 북미에 뒤처졌지만 플래그쉽 위주의 국내 소비자 성향 때문에 수익성은 오히려 높았던 것. 그런 중요한 시장에서 실적이 급감하자 LG전자로서도 더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바꾸어말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존속의 필수 조건 중 하나였다는 얘기다. 사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의 집중적인 소비를 기반으로 사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스마트폰 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가전과 자동차는 물론 음악,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같은 양상이 반복된다.
단통법 시행 8년…스마트폰 사업 위축만 초래
하지만 2013년 단통법 제정 당시 박근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료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런 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실수를 저지른 이유다.
시계를 돌려 8년 전으로 가보면 당시의 스마트폰 거래 구조는 혼란 그 자체였다. 이동통신사들은 신형 스마트폰을 무기로 번호이동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예산을 쏟아부었고, 그 예산에는 스마트폰 제조사들로부터 받아온 ‘단말기 판매 보조금’이 합산돼 있었다. 그 돈으로 이통 3사는 수시로 ‘천원폰’ ‘10만원폰’ 등의 게릴라성 특가 판매를 일삼았고,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들만 이를 이용해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정보에 어두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호갱’이 된 소비자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규제하는 방식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단통법 시대가 되며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이통 3사의 마케팅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단통법 시행 직후 이통 3사의 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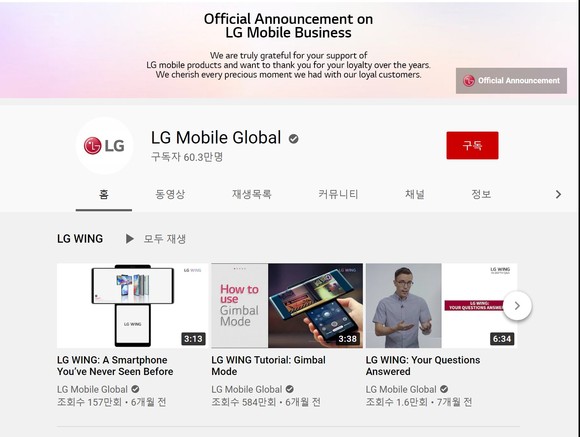
반면, 소비자들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피해를 봤다. 이전처럼 특가판매되는 저렴한 최신폰은 은밀하게 유통되어 극소수의 이용자들만 구입할 수 있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거보다 비싼 가격에 폰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호갱’을 막자고 제정한 법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셈이다.
이렇게 되자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충동적으로 새 스마트폰을 마구 구입하지 않고 다소 비싸더라도 ‘똘똘한 한 폰’을 구입하게 됐는데, 그 대상이 되는 건 애플과 삼성전자의 플래그쉽 스마트폰이었다. 결국 선택을 받지 못한 팬택이 먼저 문을 닫았고, LG전자가 한 발 늦게 그 뒤를 따르게 됐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과소비를 문제삼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당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보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민원과 이에 편승한 관료들의 엉뚱한 규제 정책이 결국 대한민국의 막강한 경쟁력이던 스마트폰 제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차치하고 2021년 4월 현재 단통법은 ‘분리공시제’를 담은 개정안으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이 나뉘어져있지 않은 현재와 달리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제조사들로 하여금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가 삼성전자 한 곳만 남은 상황인데, 과연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지원금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이쯤되면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언제쯤 시의적절한 법안을 하나라도 만들어낼지 정말로 궁금해진다.
(CNB=정의식 기자)





















![[기자수첩] 생방 나선 대통령과 당하는 공직자+기자… 쥐-바퀴벌레 튀는 소리?](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6109774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