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문학자 이민희 교수의 비엔나 본격 탐방기다. 201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년 동안 살며 곳곳을 누빈 저자는 여덟 번째 비엔나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이 도시가 그의 보물이 됐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의 비엔나’는 2019년 서울에서 책으로 다시 살게 됐다. 학자의 집요한 시선으로, 때로 산책자의 즐거운 마음으로, 비엔나를 향유하는 그 길에 발을 들인다.
1부는 ‘역사와 건축의 문화사회학’이다. 여느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비엔나에도 바로크 형식의 건물들이 즐비하다. 이 사이에서 장식을 일체 없앤 루스하우스를 지은 아돌프 루스,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훈데르트바서, 대리석과 유리가 반반 섞인 파격적 파사드의 한스훌라인의 하스 하우스까지 확실히 유럽의 다른 도시와 차별된 건축물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소설 ‘장미의 이름’의 배경으로 알려진 멜크 수도원, 벨베데르 궁전, 링 스트라세의 다양한 건축물에 얽힌 오스트리아의 역사까지 두루 조망한다.
2부는 ‘카페 속 인문학 산책’이다. 커피 좀 마신다는 사람치고 비엔나커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말, 비엔나의 ‘비엔나커피’에 대해 들어본 이가 얼마나 될까? 비엔나커피 한 잔에는 왕궁과 박물관, 음악당, 고딕식 바로크식 성당과 미술관, 각종 동상들, 그 밖의 많은 역사적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 비엔나의 유명 카페 첸트랄과 시인 알텐베르크를 만나 커피 한 모금을 삼키고 나면 섬광같이 클림트와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과 칼 포퍼까지 스치고야 만다. 귓가에는 하이든과 쇤베르크, 기어코는 비발디의 ‘사계’까지 울려 퍼진다. 마지막 모금을 넘기기 전 눈앞에 아른거릴 것은 비엔나 골목의 고서점과 거리 풍경이다.
3부는 ‘생활의 유혹, 비엔나의 속살’이다. 긴 영화를 보듯 책을 따라 경주했다면, 마지막으로 누릴 것은 그저 비엔나 거리를 걷는 것이다. 골목의 다양한 간판을 구경하다 스노우글로브를 흔들어 보고, 알프스의 한 자락에 올랐다가 잔잔한 그의 시편에 기대 보는 것이 이 산책의 마무리다.
이민희 지음 / 1만 5000원 / 글누림 펴냄 / 336쪽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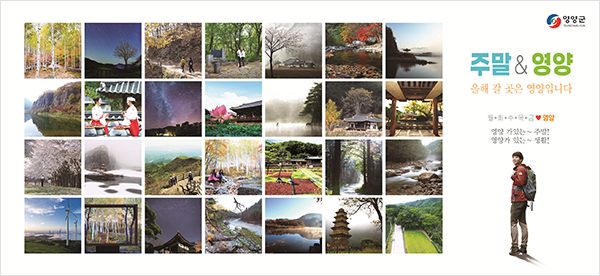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