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들어선 롯데리아 1호점 매장 안에서 햄버거 등을 주문하기 위해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사진=롯데리아)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중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형식이지만 지난 6월 롯데리아 1호점이 몽골에 들어섰고, 이런 협력 사례는 유통 분야 뿐 아니라 의료, 금융, 건설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CNB가 중앙아시아 붐의 원인과 현황을 들여다봤다. (CNB=이병화 기자)
사드에 막힌 대륙 넘어 중앙아시아로
유통·건설·의료 등 전 산업 진출 활발
폐쇄성과 정보 부족은 ‘넘어야 할 산’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중앙부를 지칭한다. 주요 국가의 인구수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약 1800만명, 우즈베키스탄은 3000만명, 투르크메니스탄은 580만명, 몽골은 300만명이다. 이를 합치면 5700만명 가량 된다.
인구 수만 기준으로 하면 잠재적 가치는 5000여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한국과 비슷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빠른 편이다. 인구분포는 소비 성향이 높은 20대~30대 비율이 높다.
이처럼 성장 동력이 탄탄해 ‘기회의 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성장 동력이 꺾인 유통업계의 관심이 높다.
롯데리아는 지난 6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몽골1호점을 개설했다. 미국, 호주, 중국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클라우드 맥주를 수출하고 있는 롯데주류는 지난 8월부터 몽골 현지 대리점에 맥주 공급을 시작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CNB에 “기존에도 몽골에 진출한 국산 맥주들이 있지만 프리미엄급 맥주는 클라우드가 처음”이라며 “기존 맥주들과 차별화된 맛으로 한국 맥주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 몽골인이 지난 8월 몽골에 수출이 시작돼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클라우드 맥주병에 명시된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롯데주류)
이마트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2호점을 개설했고 요리하다 등의 자사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 롯데마트 역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브랜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업계에서는 CU가 진출했다.
이들 기업의 현지 점포는 대부분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테리어, 운영방식, 로고는 국내와 동일하지만 운영 주체는 현지 국가의 기업이다. 운영사가 국내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구조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CNB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몽골에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진출해 있다”고 밝혔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이마트 2호점 매장 안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이마트)
‘숨은 진주’인가, ‘늪’인가
유통업 외에도 여러 산업 분야가 속속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8~9월 기준으로 몽골 샴푸와 페인트 시장에서는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고, 엘리베이터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의 무역량은 지난해 10월과 대비해 21.6% 늘었다.
국내 중소기업인 천을이엔지(대표 박종용)는 중앙아시아 공해의 주범인 유연탄을 무연탄화하는 기계를 개발해 특히 몽골 지역에 납품이 확정되기도 했다.
의료분야에서도 교류가 활발하다. 지난 10월 초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시범시술과 라이브 수술을 진행했고 의료협약도 체결했다.
금융분야에서는 다음달 BNK캐피탈이 카자흐스탄에 금융업 인가를 앞두고 있다.
건설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김지영 우즈베키스탄 전문가는 ‘역동적인 우즈베키스탄, 외환 개혁 이후와 미래’라는 기고문에서 “2018년 1월~6월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완료된 건설 공사 규모는 약26억 달러에 달한다”며 “전년 동기간 대비 109.7% 성장했고 올해에만 총 350만㎡에 주택 2만8435채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이 활발한 바탕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지 인건비가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중앙아시아는 특유의 폐쇄성과 현지 시장 정보공개에 대한 ‘불투명성’이 유독 심한 곳으로 꼽힌다. 이곳의 경제상황에 대한 국내 연구 성과가 아직 적은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우지수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한-카자흐 협력 방안’이라는 칼럼에서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 문화, 교육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CNB=이병화 기자)




















![[생생르포] “손맛 제대로”…크래프톤 ‘성수 펍지’서 배틀 체험해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01/art_1767155114_176x135.jpg)


![[기자수첩] 이혜훈처럼 국힘이 ‘빈집털이’ 당하는 중이라면 왼쪽 빈집엔 누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01/art_1767150456_176x135.jpg)


![[비즈&Art⑪] “교육에 문학을 입히다”…교원그룹의 첫 ‘창작문학 공모전’](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2/art_1766554052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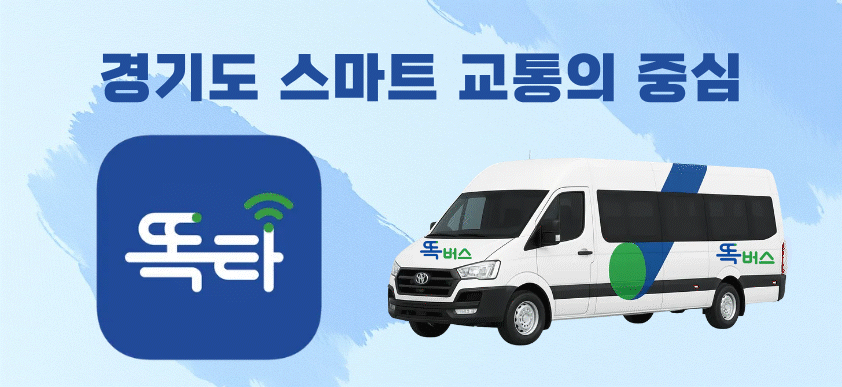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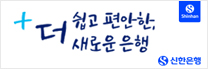




![[생생르포] “손맛 제대로”…크래프톤 ‘성수 펍지’서 배틀 체험해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01/art_176715511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