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임시 공공극장 블랙텐트.(사진=김금영 기자)
완전 긴 것은 아니지만, 나름 짧지도 않게 문화부 기자를 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다. 광화문 광장의 블랙텐트 현장을 찾으면서부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빼앗긴 극장을 다시 되찾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로 세워진 블랙텐트는 ‘임시 공공극장’을 표방한다. 올 초 개관식 이래 많은 공연이 블랙텐트를 찾았다. ▲극단 고래의 ‘빨간 시’를 시작으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그와 그녀의 옷장’ ▲마임 ▲극단 드림플레이 테제21의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이 시즌 1 공연을 채웠다. 이후 ▲연희단거리패의 ‘씻금’ ▲무브먼트 당당의 ‘광장 꽃, 피다!’ ▲극단 돌파구의 ‘노란봉투’ ▲여기는 당연히, 극장의 ‘킬링타임’ ▲안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몸, 외치다!’ ▲33명의 예술가가 세월호를 기리는 304분 동안의 퍼포먼스 ‘삼삼한 날에’가 시즌 2를 이어가고 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위의 공연들을, 문화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 자신도 모르게 공연을 볼 때 ‘편식’을 해 왔었다는 것이 느껴졌다. 무용,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등 공연 분야는 폭넓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주로 뮤지컬 현장을 찾았었다. 그리고 밝은 코미디극을 주로 봤다. 지금까지 봐 온 공연들도 물론 좋았다. 하지만 ‘폭 넓은 시각을 갖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안 해 왔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됐다.
특히 블랙텐트의 현장은 가슴에 새로운 감동을 줬다. 또 문화 예술의 힘을 무엇보다 느끼게 됐다. 극장 환경은 열악하다. 항상 블랙텐트를 가는 날이면 옷을 두껍게 입고 간다. 30평 남짓한 공간에 바람을 막기 위해 천막에 부직포도 붙이고, 난방기구도 설치했지만 일반 극장과 일반적인 조건을 단순 비교한다면 추울 수밖에 없다. 배우들이 연기할 때 입김이 나오기도 하고, 차들이 움직일 때마다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 온다. 공연을 볼 때 나눠주는 무릎담요를 덮고 공연을 보는 내내 패딩도 벗지 않는다.
그런데 손발은 꽁꽁 얼지언정, 공연을 보면 무엇보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블랙텐트에 오르는 공연들은 의미가 남다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따라 현 정권이 외면해 온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극장장을 맡은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는 블랙텐트 개막식에서 “박근혜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극장들이 외면했던 동시대 고통 받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문을 읽었다.
살펴보면 그렇다. ‘빨간 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그와 그녀의 옷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은 검열 사태에 관해 다뤘다. 이밖에 ‘씻금’은 굿극을 통해 세월호의 아픔까지 아울렀고, ‘광장 꽃, 피다!’와 ‘노란봉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린다. 이어지는 ‘킬링타임’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숨겨진 7시간을 공연에 끌어낼 예정이다.
처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굳이, 그리고 특히 왜 문화를 탄압하고, 제재 아래 두려 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블랙텐트를 찾다보니 몸소 느끼게 됐다. 문화 예술은 호소의 힘이 있다. 대사 하나하나에 힘이 있고, 공연을 보고 나서는 지금 처한 현실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든다. 한동안 여러 이슈에 묻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검열 이야기를 공연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세월호 가족의 공연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배우들이 그럴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야기 방식은 유쾌하기도, 엄숙하기도, 때로는 차갑기도, 따뜻하기도 하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슴에 그 이야기들이 들어온다.
광화문 광장 캠핑촌의 총 관리자이자, 이젠 ‘광장의 시인’으로 불리는 송경동 시인은 “문화 예술은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 꿈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윤택 연출은 “연극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바라보기 위한 꿈”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 꿈의 자유에 억압을 둬서는 안 되고, 어떤 한 기준에 맞춰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이런 문화 예술의 힘을 일찌감치 알았기에, 두려웠기에 억압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문화 예술을 너무 얕봤던 것 같다. 자본주의 논리 아래 지원금을 옥죄거나 설 무대를 빼앗아가는 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예술인은 힘을 모아 스스로의 임시 공공극장을 세웠다. 그리고 이 극장에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들고 있다. 블랙텐트를 매번 찾을 때마다 전회 만석의 현장을 봤다. 어린 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들은 추운 텐트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함을 더했고, 열기는 대극장 못지않게 뜨거웠다.
블랙텐트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국가·사회·인간에 대해 질문하는 공론장이 되겠다”고 했다. 스스로도 문화 기자로서 공연 편식을 하고, 무의식중 불편해서 보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를 블랙텐트를 통해서 다시금 만나고 있다. 그래서 내일도 블랙텐트에 갈 것이다. 블랙텐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깨닫고, 알아가고 싶다.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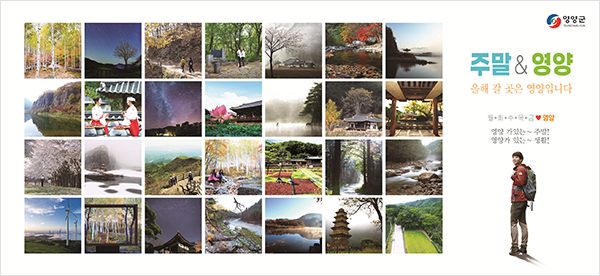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