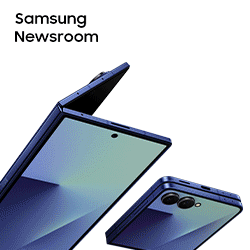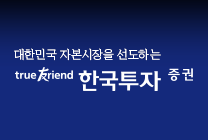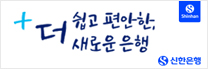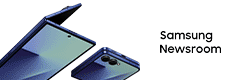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서울역 광장의 일반 공중전화 부스(왼쪽)와 지난 2013년 9월에 설치된 기업은행 길거리점포 1호점(오른쪽)의 11일 모습. 길거리점포는 기존 공중전화 부스를 리모델링해 은행자동화기기(ATM), 자동심장충격기(AED), 공중전화기가 결합된 형태다. 기자가 머문 30여분 동안 이용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진=이성호 기자)
ATM과 공중전화 결합한 무인점포
고객 외면, 5년간 1460억원 손실
“혈세 낭비” vs “공익성 고려해야”
길거리점포는 기업은행이 KT링커스와 손잡고 기존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리모델링해, ATM과 공중전화를 결합한 무인점포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부스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도 배치해 고객 편의와 국민 건강을 챙기고 있다.
2011년 9월 서울역에 첫 선을 보인 이후 2년 만인 2013년 10월에 2000호점(2000대)까지 확대됐고 현재는 1939대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기업은행의 ‘길거리 점포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링커스에 지급하는 부스 임차료·제작비·광고비용 등을 더해 ATM 한 대당 운영비용은 연간 약 2000만원 선이다.
전체적으로 매년 400억원 가까이 소요되지만 극심한 적자 구조라는 것.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은행이 길거리 점포사업에 2012년~2016년 6월까지 1480억원을 쏟아 부어 무려 146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현금 사용률이 줄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핀테크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진 현실에서 수수료 수익은 연간 5억원 수준으로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19억30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역에 설치된 기업은행 길거리점포. (사진=이성호 기자)
은행창구 내 설치 등 기업은행의 일반 ATM 3489대의 대당운영비용은 약 500만원으로 길거리점포의 4분의 1 수준이다. 같은 기간(2012년~2016년 6월) 총 920억의 운영비가 들었고 수수료 수익은 723억으로 운영비에서 수익을 빼면 199억의 손실이 발생, 길거리점포와 손익비교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을 2021년까지 끌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2011년 기업은행은 KT링커스와 10년 단위의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학영 의원 측은 길거리점포가 계속 유지된다면 2021년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대략 2000억원의 손실액을 부담해야 된다며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조준희(왼쪽) 기업은행장이 서울역 광장의 길거리 점포에 설치돼 있는 자동심장 충격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있다. 도입취지가 좋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다.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길거리점포는 2011년 당시 경쟁은행에 비해 부족한 점포망을 보완하고 고객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채널로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런 취지를 살려 폐쇄 보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측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CNB에 “사실 ATM은 은행창구에 있든 외부에 있든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며 “길거리점포는 애초에 이득을 가지려고 설치하지 않았고 홍보 및 창구업무를 대체하는 효과,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스는 KT링커스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의 하에 폐쇄하는 등 유동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다”며 “비효율적인 부문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CEO신년사 행간읽기①] KB·신한·하나·우리금융…“AI로 새판짜기” 한목소리](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2/art_1767918997_176x135.jpg)

![[기자수첩] 조용히 ‘윤봉길 현장’ 찾고도 “협력 외교” 강조한 李대통령의 실용-공익](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2/art_1767840869_176x135.jpg)

![[뉴스텔링] ‘국회의장發 개헌’ 속도내나…헌법에 ‘5.18정신’ 담아 국민투표 가능?](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2/art_176783660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