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첫 주거보전사업 구역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17일 백사마을 전경.(사진=유명환 기자)
서울시, 유네스코 보존 원칙 고수
LH “개발하면 적자” 사업 포기
주민들 “시가 한발 물러서 주길”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일대에 자리 잡은 백사마을은 도심개발로 강제 철거된 판자촌 주민들이 1967년부터 옮겨오면서 형성됐다. 청계천, 영등포 등에서 철거당한 1135세대 주민들이 불암산 자락을 맨손으로 깎으면서 마을의 모습을 갖췄다.
매해 겨울이면 대기업과 유명인들이 이곳을 찾아 주민들에게 연탄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갖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17일 백사마을에서 만난 임실복(여·65·가명) 할머니는 “연탄과 식료품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탄이 필요 없는 따뜻한 집”이라며 “서울시가 우리에게 새집을 지어 준다고 약속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백사마을 곳곳에는 주민대표회의에서 붙인 호소문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문, 과거 주민대표회의를 규탄하는 벽보 등이 어지럽게 붙어 있다. 벽화 속의 아이들은 웃고 있었지만 실제 주민들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은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였다가 2008년 1월 개발제한이 해제됐다. 그러다 2009년 5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발이 멈춘 이유는 뭘까?
이는 마을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려는 서울시와 개발수익을 거두려는 시행사와 주민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을 현재 상태에서 크게 바꾸지 않고 개발하면 그만큼 시행사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아이들이 떠난 유치원 놀이터.(사진=유명환 기자)
서울시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르면, 백사마을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지상 최고 20층 17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저층 주거지보존구역은 시가 매입해 저층 임대주택 600여 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였던 LH는 지난 1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LH는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원구에 녹지공간 축소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LH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111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조합원(거주주민) 추가 분담금도 주택 평형에 따라 1억7700만~3억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실복(여·65·가명)씨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주민들은 대체로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 계획대로 할 경우, 선뜻 나서겠다는 시행사가 없어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종민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백사마을을 주거지 보존지역으로 떼어낼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 주민 대부분이 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곳을 ‘역사 마을’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접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지난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주거지 보존구역과 그린공원 부지를 축소하는 계획이 부결됐다”며 “앞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H 대신 SH공사가 추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의 용적률 상향, 녹지공간 축소 등 요청에 대해서는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변경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고 그간 추진경위, 행정의 일관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계획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같은 서울시 입장에 대해 “사업이 전면 취소돼 여기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몇 년 동안 방치된 폐가로 인해 주민들이 치안과 화재 위험으로부터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사진=유명환 기자)
수돗물도 잘 안 나와…고통의 나날들
이처럼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백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로 극빈계층이 대다수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목재와 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허름한 주택이 대부분인 데다 상수도 시설이 산 끝자락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옥의 지붕엔 파란 천막이 덧씌워 있었다. 파손 지경에 이른 지붕이 방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발사업으로 몇 년 동안 방치된 폐가로 인해 주민들에 치안과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실제 빈 집으로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워낙 주거환경이 낙후되다보니 이미 이곳을 떠난 이들도 많다. 전체 약 1500가구 중 9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남은 이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돼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민(67세·가명)씨는 “해마다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찾아와 재개발을 약속한 게 한 두 번이 아닌데 도대체 언제쯤 이곳에서 벗어나 깨끗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선 상수도 시설 정비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CNB=유명환 기자)




















![[국힘 경선] 반탄 vs 찬탄 2:2 황금구도... '尹탄핵' 뜨거운 감자](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370539_176x135.jpg)


![[구병두의 세상읽기] 유비무환과 하인리히 법칙](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372441_176x135.jpg)
![[ESG경영시대(124)] “친환경부터 동반성장까지”…KB국민카드의 더불어삶](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6/art_1744616890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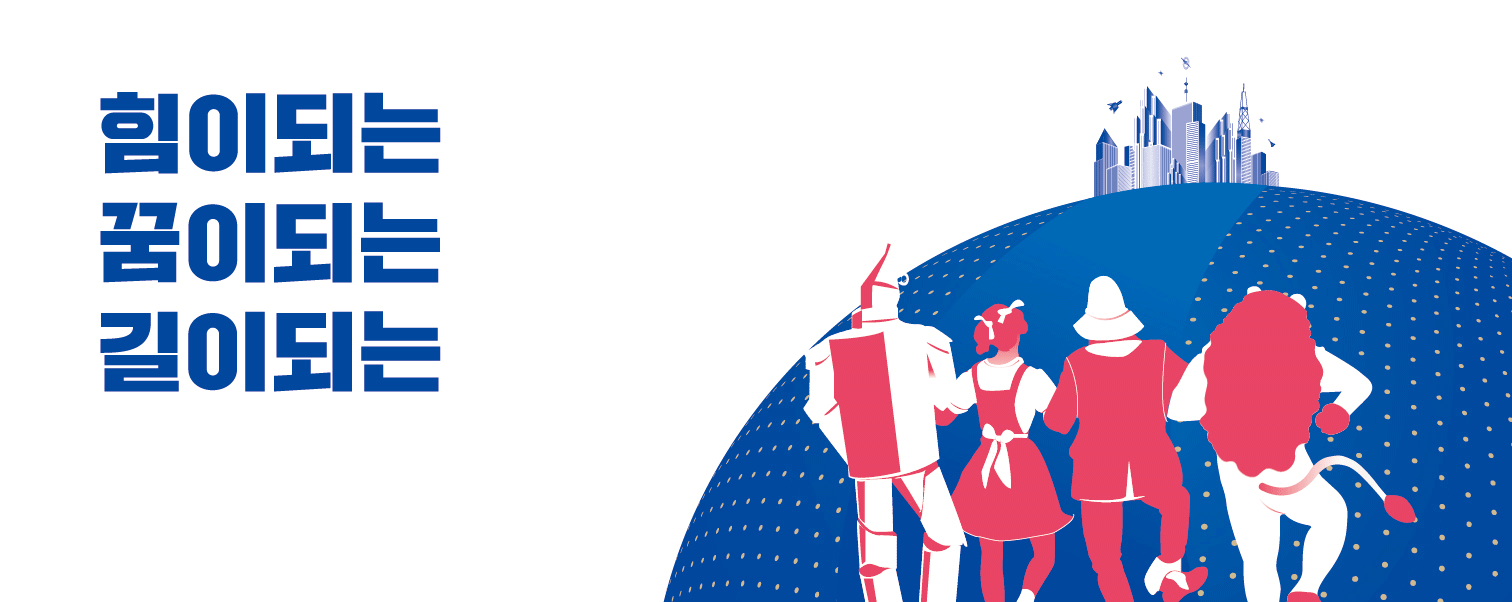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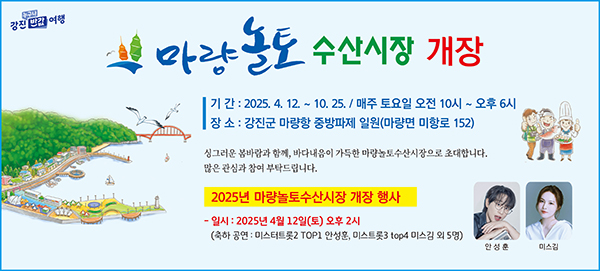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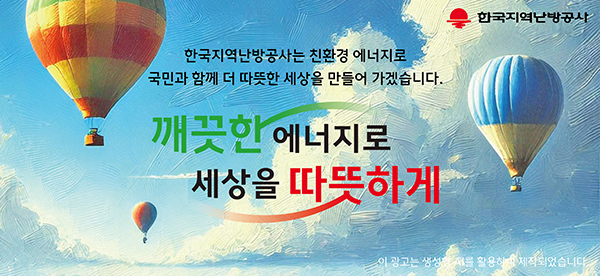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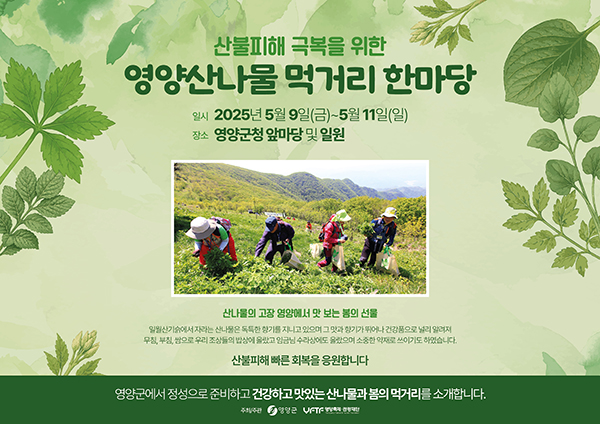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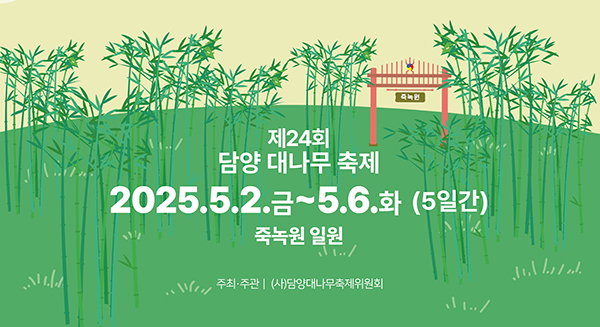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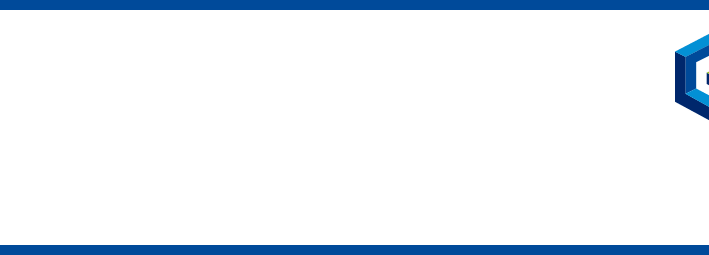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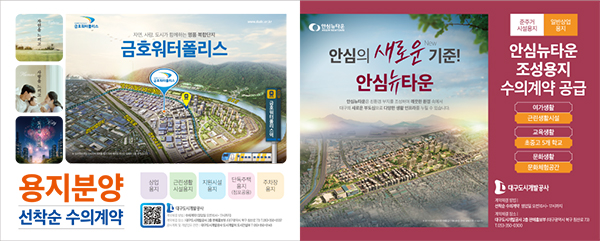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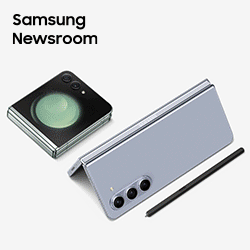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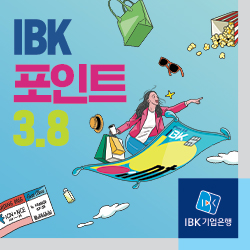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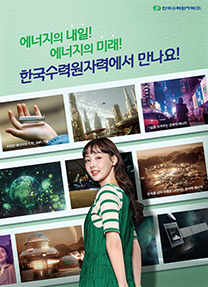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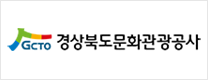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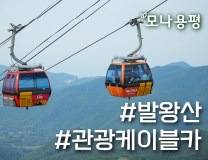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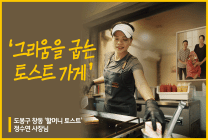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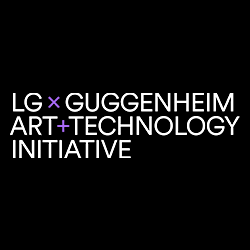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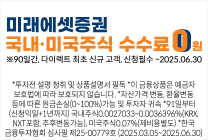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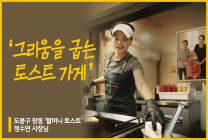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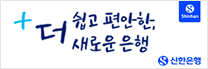


![[국힘 경선] 반탄 vs 찬탄 2:2 황금구도... '尹탄핵' 뜨거운 감자](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370539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