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부터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월 임대료 최대 186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과연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9월부터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월 임대료 최대 186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과연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지구의 전용면적 84㎡ 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7000만원, 월세 186만원이다. 실제 이 주변 지역의 월세 시세가 171만원(브라운스톤 용산)~202만원(용산 e편한세상)인 것으로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 없는 금액이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퇴거 걱정 없이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정부가 주장하는 중산층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14년 가계수지에 따르면 세금과 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평균 소득을 약 280.7만원으로 측정하고 있다.
중산층 즉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1만 9000원인 셈이다. 여기서 월세로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득대비 임대료(RIR:Rent Index Ratioin) 지수는 34%가 된다. 110만원의 경우에는 37%까지 치솟는다.
보증금에 관리비까지 환산하면 RIR 수치는 더 높아진다. 2014년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RIR는 24.2%이고 중산층의 경우에는 23.1%인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OECD가 권고하는 적정 RIR 지수가 20% 이하이며, 선진국에서는 RIR 지수 30% 이상인 계층을 주거 빈곤층으로 보고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임대료 수준인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300만원도 못버는 이 나라의 중산층들에게 200만원 좀 안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내야 하는 뉴스테이를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권하고 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뉴스테이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 '우리'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힘 경선] 반탄 vs 찬탄 2:2 황금구도... '尹탄핵' 뜨거운 감자](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370539_176x135.jpg)


![[구병두의 세상읽기] 유비무환과 하인리히 법칙](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372441_176x135.jpg)
![[ESG경영시대(124)] “친환경부터 동반성장까지”…KB국민카드의 더불어삶](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6/art_1744616890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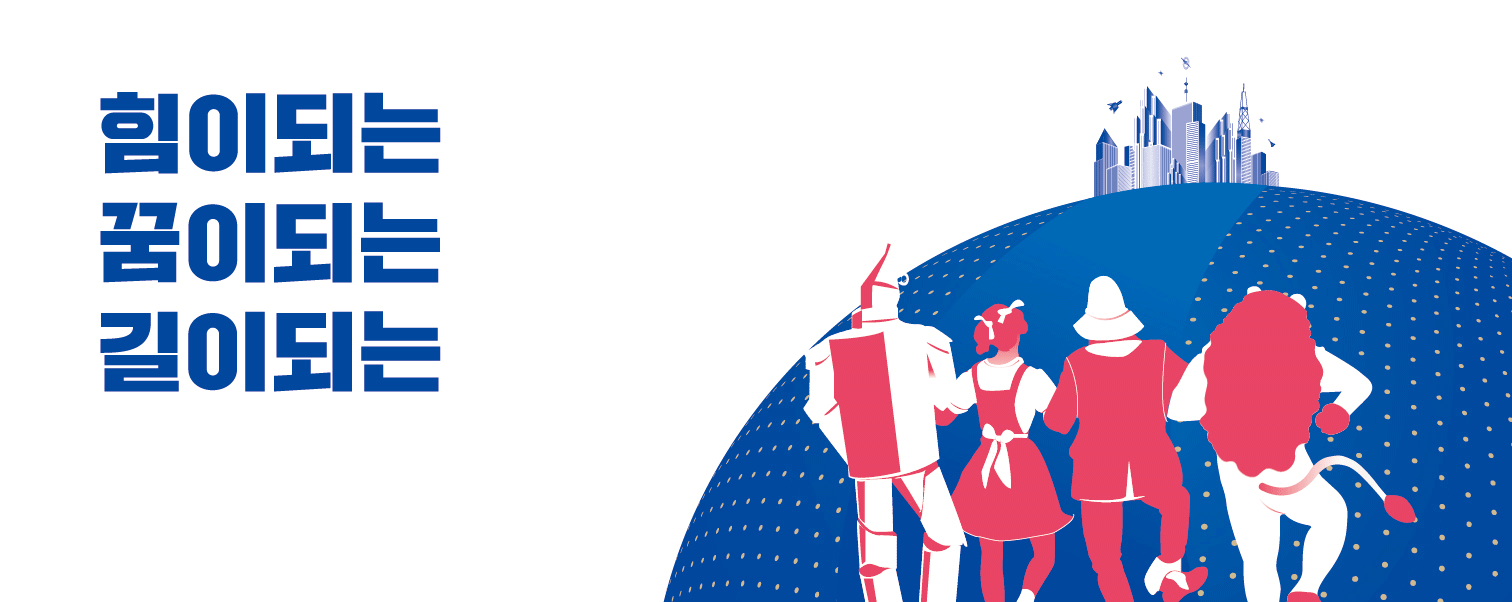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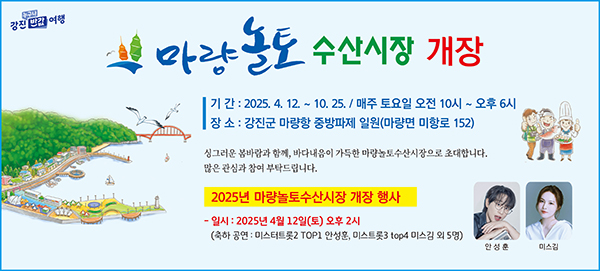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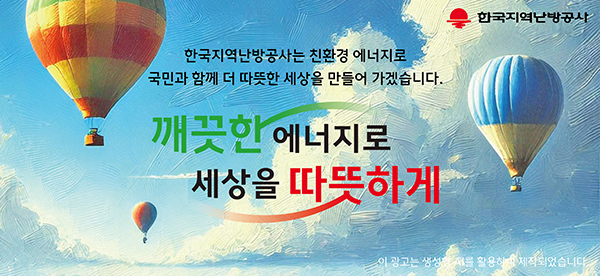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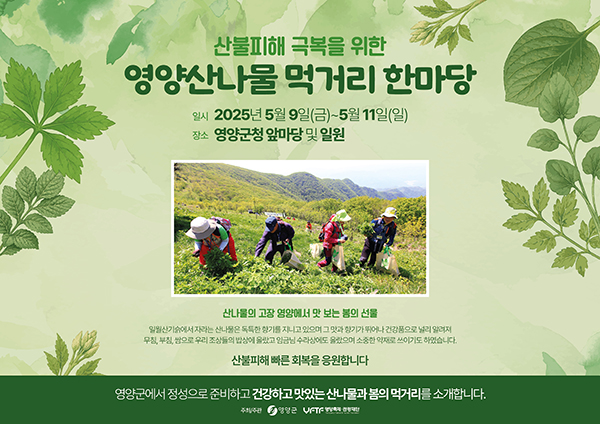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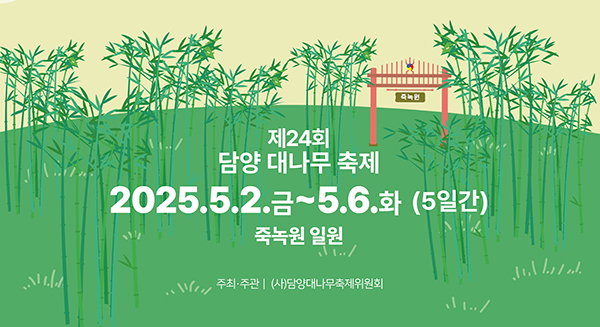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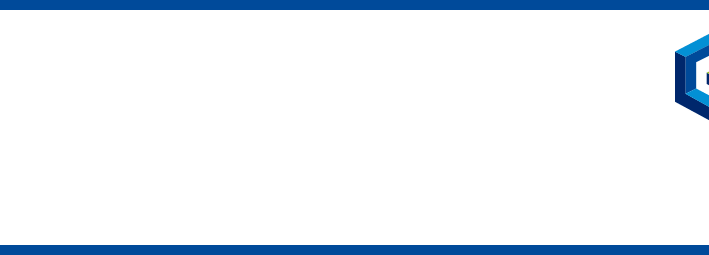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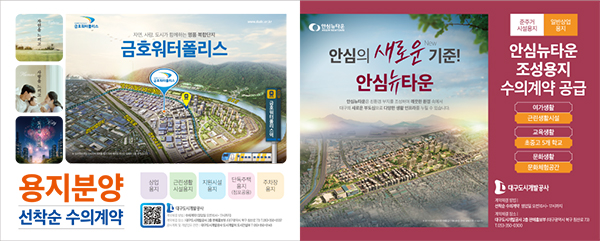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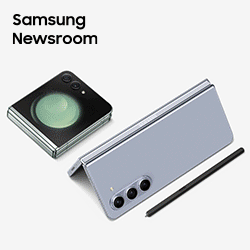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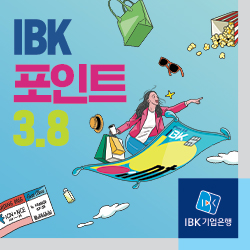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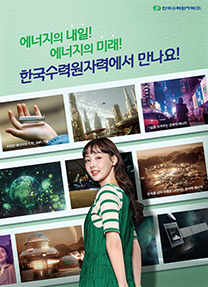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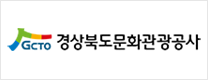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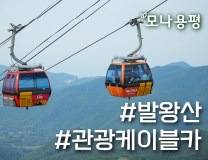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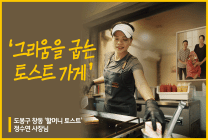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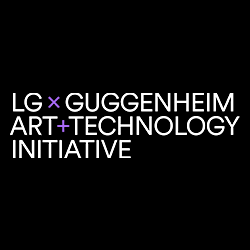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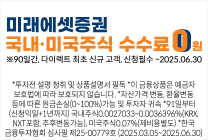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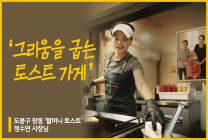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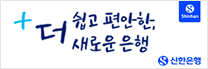


![[국힘 경선] 반탄 vs 찬탄 2:2 황금구도... '尹탄핵' 뜨거운 감자](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1745370539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