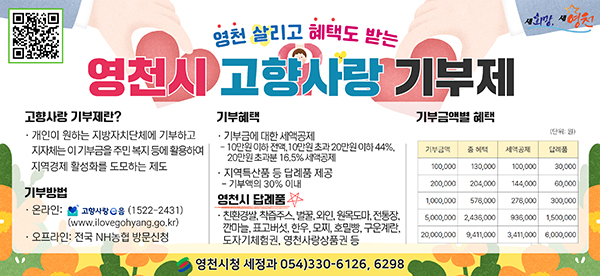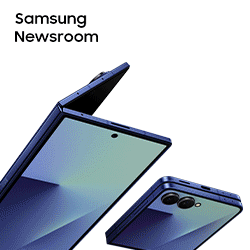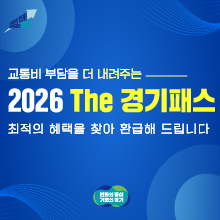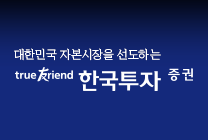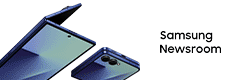도시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농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14년 기준 61.5%로 하락했고 농촌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9.6%로 감소했다. 농촌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7.3%에 달한다. 최근 도시의 성장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의 급증 추세는 농촌기능 회복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농촌공동체의 개선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공동체는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기능 회복수단으로 대두되어 2010년 전후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저탄소녹색마을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농촌공동체의 경우, 소규모 업체 및 적자 상태의 사업체 비중이 높아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 발굴보다는 체험, 단순가공 등 유사·중복된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공동체간 경쟁과 갈등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수행 연구위원은 "정부지원에 기초한 유사형태의 농촌공동체 증가는 공동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면서무분별한 경쟁을 최소화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R&D기관, 기업이 참여한 농촌공동체 중심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지원체계 마련, 공동체 간 연대를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농촌 간 수요를 상호 충족시키는 도농 공동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촌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해 농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농촌공동체 DB구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마련과 농촌공동체 지원 플랫폼 구축, 농촌공동체의 질적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CNB=이병곤 기자)






















![[CNB뉴스 위클리픽-통신] 통신 3사,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 정식 도입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4/art_1769127992_176x135.jpg)
![[생생르포] ‘외국인 맵찔이’도 인증샷…농심 ‘너구리의 라면가게’ 가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4/art_1769071058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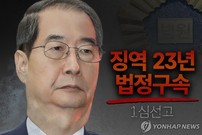
![[CEO신년사 행간읽기②] 증권업계 “코스피 5000은 시작일 뿐…AI·디지털이 新사업 뿌리”](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4/art_1769042129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