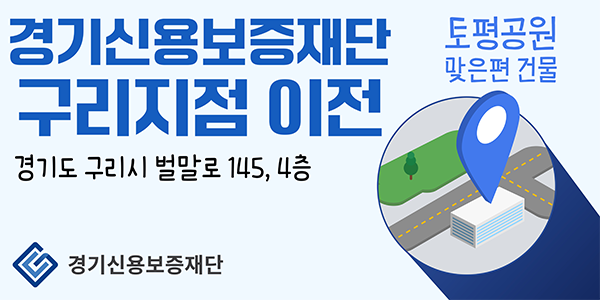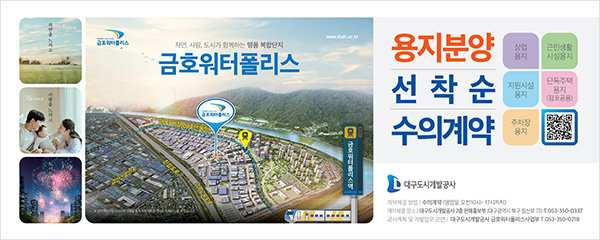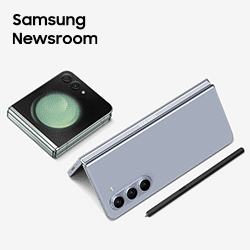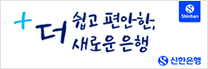사람들은 김치·소고기·돼지고기 등 식품에는 원산지가 표시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 것에 적지 않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의약품 원료의약품의 원산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있어왔음에도 왜 의약품 원산지는 공개되지 않는 것일까.
‘발사르탄’ 논란 이후에도 소비자는 의약품 원산지를 모른다
지난해 제약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고혈압약 원료인 ‘발사르탄’ 관련 논란이었다. 중국의 제지앙 화하이와 주하이 룬두사가 한국에 수출한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자 생긴 것이다. 당시 상당수의 발사르탄 제제 의약품이 반품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의료기관과 환자들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겪었다.
그동안 중국산 원료는 ‘품질이 낮다’는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원가로 인해 많이 사용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논란이 터지면서 중국산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 원료에 대한 논란은 처음 벌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09년 탈크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중국산 탈크가 발견되자 이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들이 문제가 됐었다.
일본산 원료도 논란이 됐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일본산 원료 의약품이 들어간 의약품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인도산 의약품 원료와 관련된 논란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3년 약 160개의 인도 제약공장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했으며, 인도내 최대 제약회사인 란박시를 대상으로 불순물이 함유된 의약품 제조혐의로 5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이 수입금지한 란박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수입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공식적으로 수입정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란박시에서 원료를 공급받았던 제약사가 어디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슬쩍’ 넘어갔다. 지금도 란박시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던 국내 제약사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의사들 사이에서도 원산지 표시제 주장은 나왔다
이처럼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논란이 일 때 마다 의약품 원료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우선 일본산 의약품과 관련, 2013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회에서 의약품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원전 사고지역과 인근 15개 현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뒤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다.
의사들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도 고혈압 복합제인 ‘엑스포지’ 제네릭 의약품들의 원료 원산지를 공개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의약품을 구입할 때 이 약의 원료가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인도산인지 알지 못한다. 의약품 원산지가 표기돼 있지 않아서다. 그 사이 문제가 제기된 중국산, 인도산 저가 원료 의약품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2013년 원료의약품 중 국가별 비중은 중국 21.64%(3억6689만달러), 인도 8.95%(1억5166만달러)였으나 2017년에는 중국 30.53%(5억5227만달러), 인도 15.80%(1억6878만달러)로 증가했다. 중국과 인도는 대표적인 저가 원료의약품 생산국이다.
특히 중국산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비선호도가 높은데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DMF제도 있으니 안전” … 그러면 왜 자꾸 문제가?
그렇다면 왜 의약품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일까. 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일단 반대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전 탈크 사태 때나 발사르탄 논란 때를 제외하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들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원산지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위에 언급한 의사 단체들이 원산지 표기 의무화 주장과 관련 2013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식약처는 “품질에 관한 자료는 제약사의 기밀사항으로, 동 자료 공개 시 제조법 등 자사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의약품이나 건기식은 식품에 비해 더욱 꼼꼼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굳이 원산지를 밝힐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자신 있게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답한 근거는 바로 원료의약품등록제도(drug master file, DMF)다. DMF란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준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까지 해야 원료의약품 제조소로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은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DMF 제도는 상당한 허점이 있는 제도다. 무엇보다 국내 제조소와 해외 제조소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 국내 제조소는 식약처의 관리가 용이한 편이지만, 해외 제조소는 교통비 문제로 처음 DMF에 등록될 때를 제외하면 자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최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사르탄 사태 재발 방지차원에서 3월까지 허가·등록 시 제조업체로 하여금 불순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한 뒤, 해외에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해 오는 경우 해외 제조업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소를 우선순위로 현지실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얼핏 보기에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내 제조소였다면 일제 점검을 해야 할 판이지만, 해외제조소다 보니 식약처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제조소가 아닌 수입업체에게 안전성자료 사전등록을 강제하고, 정작 해외제조소는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소’를 우선순위로 현지실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세계각국에 흩어진 원료의약품 제조소를 식약처가 몇 년에 걸쳐 실사를 진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비슷한 발표는 과거에도 이뤄졌었다. 지난 2014년 식약처는 “품질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소부터 해외 실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입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모두 등록한 후, 품질관리가 취약한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뒤인 2018년 ‘발사르탄’ 논란이 벌어진 뒤 비슷한 내용의 발표가 재탕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아니면 2014년 식약처가 발표와 달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게다가 DMF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DMF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한다고 하며 미국산과 중국산, 국산 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제약사가 중국산만 100% 사용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국산 포비아’ 아닌 소비자 권리를 생각해야
소비자가 의약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꼼꼼하게 막아야 하는 것일까.
물론 무작정 ‘중국산 포비아’를 부추키는 것은 해당 국가와의 무역마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선량한 원료의약품 제조소들을 매도하는 것 일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문제가 된 국가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의약품을 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식약처는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야 하는 정당성은 또 하나 있다. 바로 국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다. 원산지표시제는 저가 수입의약품이 아닌 국내 식약처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산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제약업계에 일종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지난 1991년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의약품에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 똑같은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더라도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과거 기자는 이 문제와 관련 다수의 제약사 관계자들과 이야기 해 본 일이 있다. 당시 제약사 관계자들의 입장은 “국내 약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저렴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저렴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제약업계도, 식약처도 원료의약품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의약품 원산지를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CNB=이동근 기자)

























![[단독] SK 최태원-노소영 재판 열쇠…‘노태우 비자금’의 비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1147/art_173217661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