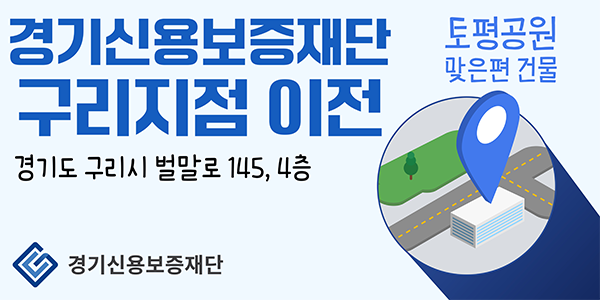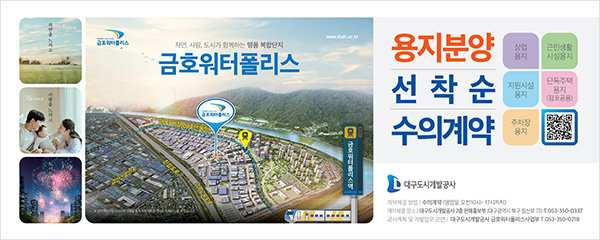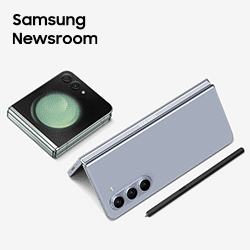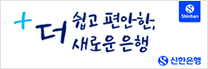▲지난 2월 제주공항에 또다시 폭설이 내려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이날 오전 공항 내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가 승객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저가항공사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취항 스케줄과 잦은 지연, 수하물 서비스 미비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책임 입증이 힘들어 보상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CNB가 저가항공사의 서비스 실태에 관해 들여다봤다. (CNB=김주경 기자)
잦은 비행기 지연에 소비자 불만 폭주
1시간미만 지연은 보상규정 따로 없어
보상기준 개정됐지만 국제수준 못미쳐
직장인 이모 씨(31·남)는 저가항공사(LCC)를 통해 휴가를 떠나려고 3개월 전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둔 보름 전에 ‘비행기 시간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항의했지만 “국토부의 운항 스케줄이 변경돼 비행기 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환불은 해줄 수 있지만 보상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봄을 맞아 저가항공을 통해 제주도나 가까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항공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저가항공사를 선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저가항공사(LCC) 국제선 수송여객은 2030만 21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1.9% 늘었다. 기업별로는 제주항공이 582만5360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았고, 진에어 485만9493명, 티웨이항공 327만8069명, 에어부산 300만3639명, 이스타항공 251만4596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적항공사 이용률은 2016년 3290만2778명에서 2017년 3226만8468명으로 1.9% 하락했다.
수익도 크게 증가했다. 제주항공 순이익은 2014년 320억원에서 2017년 642억원으로 3년 새 2배 늘었다. 진에어는 2014년 131억원에서 2015년 227억원, 2016년 393억원, 2017년 576억원으로 5배 순이익이 발생했다. 에어부산은 2014년 46억원에 불과했던 당기순이익이 불과 3년 만에 600%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다.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늘면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등은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부산 간 KTX 비용보다 저렴한 제주도 항공권은 소셜커머스에서 할인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용실적에 따라 공짜표도 손에 넣을 수 있다.

▲지난달 6일 제주공항에 폭설이 내려 활주로가 한때 폐쇄돼 항공편이 결항하고 회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사진=연합뉴스)
운항횟수 늘며 ‘하늘길’ 자주 막혀
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간한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국내선 항공기 지연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4%에 불과했던 지연율이 2013년 5.5%, 2014년 7.5%로 늘었고 2015년에는 10.4%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8.6%까지 증가했다.
이 중 국내선은 진에어가 15.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제주항공(13.5%), 티웨이항공(13.0%), 에어부산(12.5%), 아시아나항공(11.5%), 이스타항공(10.9%), 대한항공(10.1%)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제선은 아시아나항공(8.4%)이 가장 높았고, 대한항공(5.8%)과 이스타항공(5.7%), 티웨이항공(5.3%), 진에어(4.0%) 순이었다.
지연 사유로는 ‘항공접속’과 ‘공항사정에 따른 항로변경’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4만6334건의 지연횟수 중 ‘항공접속에 따른 지연’이 4만2492건으로 91.7%를 차지했고, ‘항로변경’은 0.8%였다. 국제선은 2만4910건의 지연횟수 중 ‘항공접속에 따른 지연’이 1만3540건으로 54.3%를 차지했고, ‘항로변경’은 5077건으로 20.4%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는 저가항공의 운항 횟수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행기 지연이 발생하면 국적항공사는 비교적 보상이 원활하지만, 저가항공사는 상대적으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 분쟁팀 관계자는 CNB에 “저가항공사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비행기 좌석 판매에만 급급해서 소비자보호는 뒷전”이라며 “고객들이 항공기 지연에 따른 좌석 취소를 요구해도 일반 가격에 비해 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항공여객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 (자료=공정거래위 제공)
공정위가 내놓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비행기 지연 시간과 항공료에 따라 배상금이 다르다.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 100~200달러(대체편에 따라 상이)를 배상하고 4시간이 초과되면 200~400 달러(대체편에 따라 상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배상 기준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기준의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등)가 발생하면 배상이 안된다. 하지만 국제기준은 경우에 따라 배상해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정이 국제수준의 항공규정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달 28일부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기준 핵심은 항공운송 불이행과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을 200~600(대체편 제공 여부 상이)달러로 높이고 관련 약관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수 고객들은 개선된 공정위의 분쟁 해결기준이 여전히 약하다는 입장이다. 해외민간항공정보기구(OAG)는 15분 이상 비행기가 지연되면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시간(국내선 30분) 이상 지연돼야 배상이 진행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CNB에 “공정위가 제시한 보상기준은 여전히 기업의 시선에 맞춰져 있다”며 “그렇다보니 승객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분쟁기준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 법적 규제수단도 없다보니 일부 저가항공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B=김주경 기자)

























![[단독] SK 최태원-노소영 재판 열쇠…‘노태우 비자금’의 비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1147/art_173217661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