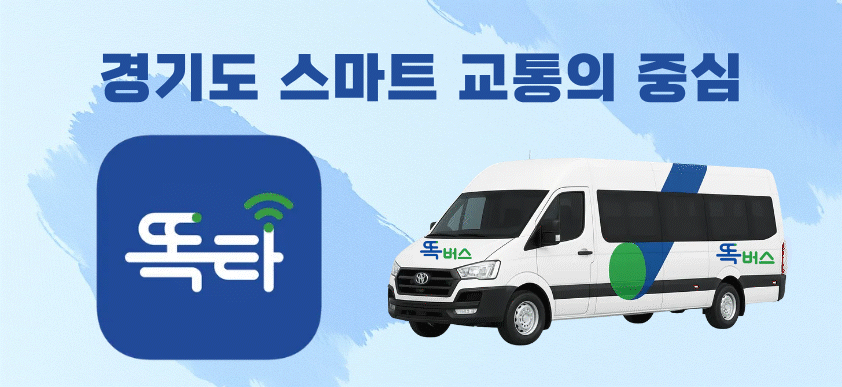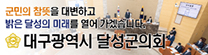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외제약, 한미약품, GSK 등 총 32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액은 연간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제약회사가 의사나 병원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제공받은 ‘의료인’ 모두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외제약, 한미약품, GSK 등 총 32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감사원의 감사 결과 8785억원)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일부 제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액은 연간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언뜻 보면 뒷돈을 건네는 쪽 잘못으로만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일반 상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은 약값을 지불하는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지 않고, 오로지 처방하는 의사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있다. 제네릭은 ‘복제약’을 뜻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약이 개발되기까지 투자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인정해 15년 동안 특허권을 부여, 독점으로 개발 제약사가 판매권을 갖는다. 특허권 만료 후 모든 제약사들은 복제해 판매할 수 있으며, 약효는 오리지널과 동일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자체 개발 신약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매출이 ‘제네릭’에서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의사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제품 이름만 다를 뿐 효능이 똑같은 약을 팔 때, 차별적인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뒷돈을 제공하게 된다. 즉 의사나 의료기관에 “어차피 약의 효과는 같으니, 대신 우리 회사 약으로 처방전을 써주시면 매출의 몇%를 드리겠다”는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얘기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는 가격이 더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하기보다는 검은돈을 건넨 특정 제약사 제품을 처방 하게 되며, 심지어는 과잉처방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소득 대비 의료보험비를 정부에 납부하며, 의료비 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38%, 나머지 62%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장해주지만, 결국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제약사들’은 “‘갑’인 의사가 요구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 아니면 “다른 제약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핑계대기에 앞서 제약사 스스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의사’의 양심을 시험하는 제약사가 악질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여기며 양심을 팔아넘긴 행위는 중죄다. 윤리지침에 앞서 양심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실제 적발 금액이 1조원 이상임에도 제약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부도 리베이트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보건의료 사기(healthcare fraud)’라 하며, 연방정부·주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약사와 의사, 정부 모두 리베이트 이슈가 있을 때 반짝하고 여는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말로만 척결 의지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들이 가장 눈치를 봐야 하는 ‘갑’은 서로가 아니라 ‘국민’이다.
(CNB=김유림 기자)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
![[내예기] ‘K-워터’ AI로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도전과 혁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16194_176x135.jpg)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전자, 삼성 월렛에 기후동행카드 탑재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99160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