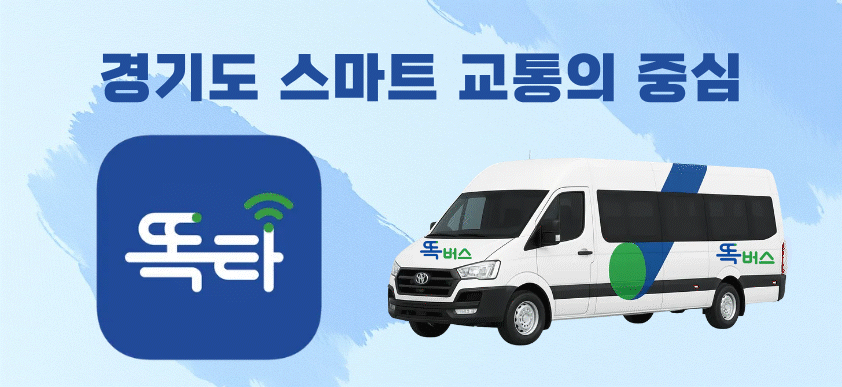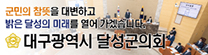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올해 역시 국내 제약사들의 공통된 경영 화두는 ‘기술수출’이다. 이에 따라 R&D 투자가 어느 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동제약,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품 연구센터.
한미약품 '쓰나미'에 제약업계 R&D 투자 ‘급증’
신약개발 실상은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매각’
자본력·마케팅 태부족…‘죽 써서 남 좋은 일’
제약업계의 기술수출 열풍은 한미약품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약품은 2006년부터 연 매출 대비 평균 10%대를 연구개발(R&D)에 투자했으며, 2014년부터는 매출의 20%의 자금을 투자, 업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노피, 얀센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8조원대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한미약품은 창립 43주년 만에 가장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유한양행을 제치고 제약업계 왕좌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매출 1조3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1% 늘어났으며, 영업이익은 514.8% 급증한 2118억원을 기록했다.
한미약품 효과, ‘신약개발’ 투자 급증
천문학적인 기술수출 성과를 올린 한미약품의 대박 행진에 그동안 제네릭(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에만 치중하던 제약업계에 신약 개발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제약사들의 국내 개발 신약 허가 수는 2011년과 2012년 각 2건, 2013년과 2014년 각 1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5건을 기록하며 급상승했다.
‘기술수출’ 사례는 2001년~2005년 26건, 2006년~2010년 45건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2015년 8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신약 개발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기술수출은 신약개발과는 엄연히 다르다. ‘신약개발’은 한 제약사가 A~Z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끝마친 후 시판까지 성공한 경우다. 반면 ‘기술수출’은 제약회사가 신약으로 발전 가능한 후보 물질을 발굴해 글로벌 제약사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제약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신약 수출 대박’ 소식은 실상 국내 제약사가 독자적인 개발까지 이루지 못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동아ST에서 개발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시벡스트로’는 2007년 미국 제약사 트리어스 테라퓨틱스사(현 머크사)와 기술수출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판권과 기술료 650만달러(한화 약 80억원), 연 매출 5~7% 로열티를 가져오는 데 그쳤다.
한미약품 역시 대부분 기술수출 계약이다. 지난해 11월9일 맺은 얀센과의 계약을 살펴보면 계약금 1억500만달러(한화 약 1300억원)을 받고, 임상시험과 허가·시판 단계별로 8억1000만달러(약 1조14억원)을 받는다. 제품 상업화 이후 두 자릿수 퍼센트의 로열티를 받을 예정이며, 판권은 한국과 중국만 갖게 된다.
만약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후속 단계에서 지급 예정이었던 금액은 모두 백지화된다.
왜 끝까지 독자 개발 못 이루나
국내 제약사들은 왜 ‘기술수출’이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됐을까. 애써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을 독자적인 노력으로 상업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신약개발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통 수십 년이 소요된다. (사진=유한양행 연구소)
신약개발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통 수십 년이 소요된다. 주로 6~7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기초탐색과정’이다. 의학적 연구를 통해 신약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다.
다음으로 ‘전임상시험’이다.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독성시험(동물·세포주 실험)이나 약리·물리·화학시험을 통해 신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단계다.
이후 ‘임상 1~4상’ 단계를 거친다. ‘임상 1상’은 신약을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게 되는 시험 단계다. 건강한 지원자 20~80명에게 투여해 최대 사용 가능 용량 및 부작용 등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임상 2상’은 임상 1상에서 정해진 용량을 토대로 100~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약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또한 임상 1상에서 확인된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임상 3상’은 신약의 유효성이 확립된 후 환자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 기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신약 물질에 따라 지역별·국가별·인종 등 광범위하게 비교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3상 시험이 성공하면 시중 판매가 가능하다.
마지막 단계는 ‘임상 4상’이다. 시판 후 기존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새로운 적응증을 관찰하는 것. 앞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관찰 가능한 환자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드문 빈도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임상 4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를 국내 제약사 단독으로 끝마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임상 3상’ 단계에서 두 손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판매 목적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면 ‘임상 3상’의 대상이 내국인에 국한되지만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FDA)이나 유럽(EDQM), 일본(후생성) 등 전 세계에 시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국가별·인종별 등 각국의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방대한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임상 3상’은 제약사가 투자해왔던 R&D 비용의 5~6배, 5000억~1조원까지 투입된다. 2014년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한 한미약품이 매출 대비 20%(1525억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힘든 과제다.
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임상이 도중에 실패해도 그동안의 투입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본’이 있다.
실제로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2014년 총매출액은 513억달러(한화 약 60조원)이며, 이 중 99억달러(약 11조원) 가량을 R&D 부문에 투자했다. 국내 제약사와 비교하면 ‘대형마트’와 ‘구멍가게’ 차이다.
또 기술수출의 이유 가운데 ‘속도전’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의약품은 6개월, 1년만 늦어져도 그 가치가 몇 조씩 떨어지게 되며, 임상 시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자금이 투입된다.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의 역사가 짧은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임상 시험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개발 시기는 늦춰지게 된다.
만약 시행착오 과정 중 이미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똑같은 신약 물질 개발에 먼저 성공하게 되면 수십 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투자금은 물거품이 된다.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역량 부족도 기술수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용화가 됐을 때 잘 팔리는 약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글로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시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마케팅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사 중 세계 제약시장 1위 북미(40%)와 2위 유럽(22%)에서 자사 개발 신약을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 지사가 있고, 판매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손을 잡는 선택을 하게 된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8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국내벤처→대형제약사→글로벌제약사 ‘먹이사슬’
제약업계는 기술수출을 두고 “이미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초연구단계에서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많지만 임상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보니, 벤처회사로부터 신약 후보 물질을 사들여 전임상, 임상 1상 등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진행한다”며 “이후 최종 상업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바이오벤처사의 ‘기술’을 국내 제약사가 ‘자본’으로 사들이고, 국내 제약사의 ‘기술’을 다시 글로벌 제약사 ‘자본’이 사들이는 식의 ‘먹이사슬’ 구조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CNB에 “제약산업에서 기술수출은 빈번하고, 당연한 일이었다”며 “단순히 회사가 돈이 없어서 기술수출을 선택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내 제약사가 잘할 수 있는 것, 글로벌 제약사가 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 역시 “기술수출은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미 제약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CNB=김유림 기자)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