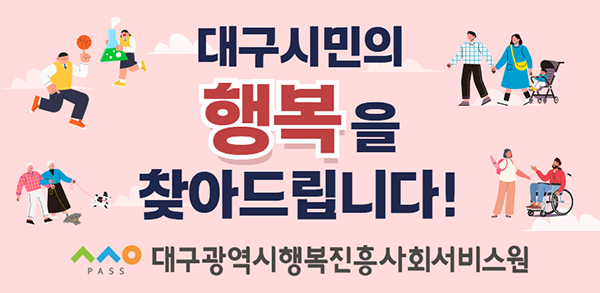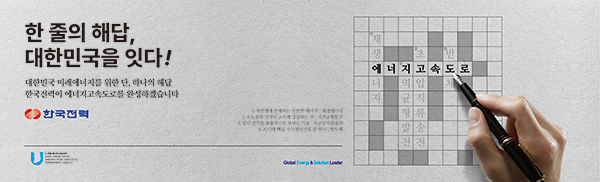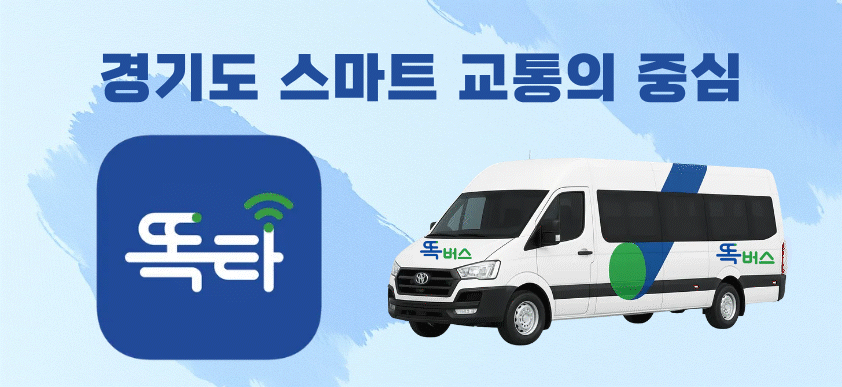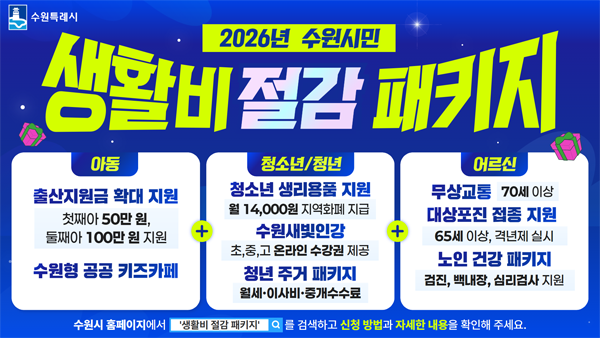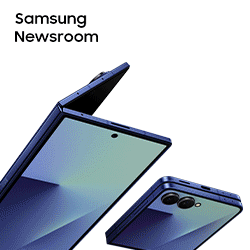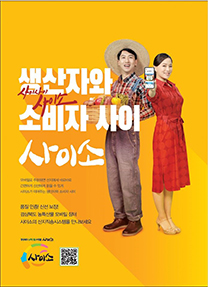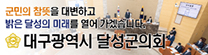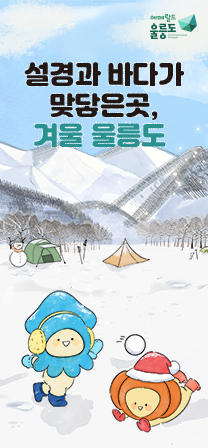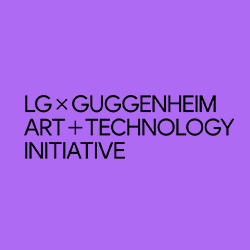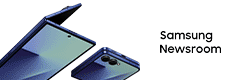▲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난달 28일 입국 모습.(사진=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서울발 기사에서 재벌닷컴을 인용해 한국에서 거대 재벌기업 40곳의 절반에 가까운 18개 그룹에서 경영권 승계 분쟁이 일어났다며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신씨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매체는 가장 치열했던 가족간 경영권 분쟁의 예로 지난 2000년대 초반 현대그룹을 셋으로 분리시킨 ‘왕자의 난’을 언급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최근 몇 년 간 형제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지수 변호사는 WSJ을 통해 “한국에서 대기업은 군주제이며 회장직은 왕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WSJ은 또 족벌기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거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0억 달러(1조 1680억 원)가 넘고 가족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이른바 ‘족벌기업’의 76%가 아시아에 몰려 있는데, 이는 북미의 6%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는 13%, 중남미는 5% 수준이었다.
홍콩중문대학교의 조지프 판 금융학 교수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부 기업들이 신뢰를 심어줬지만, 부패 수준이 상당하고 취약한 수준의 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와 함께 경영권 교체에 관한 확실한 체계가 없어 80대나 90대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일이 흔하다며, 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 홍콩의 리카싱 회장(87세)이나 스즈키 자동차의 스즈키 오사무 CEO(85세), 홍콩 카지노 재벌 스탠리 호(93세) 등의 사례를 꼽았다.
판 교수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은 기업 가치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의 재벌기업 약 200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영권 이양이 이뤄지는 몇 해 사이에 이 기업들의 가치가 평균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지난 6일까지 롯데그룹 주의 시가총액은 5일새 2조원이 증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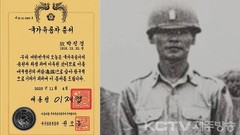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
![[내예기] ‘K-워터’ AI로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도전과 혁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16194_176x135.jpg)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전자, 삼성 월렛에 기후동행카드 탑재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99160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