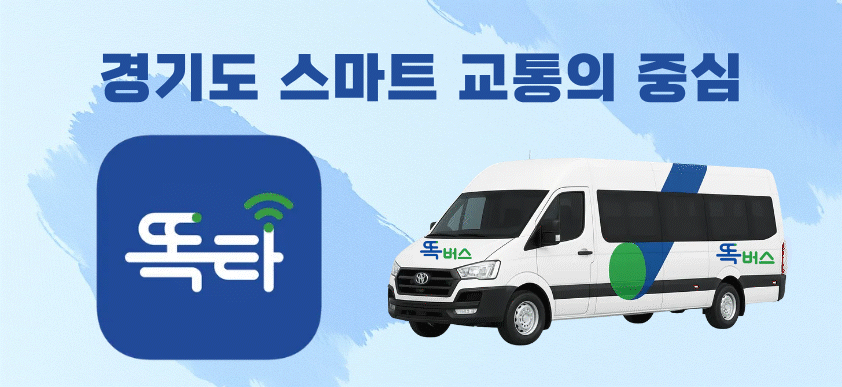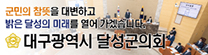▲베틀에 올라 무명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백문기 장인.(사진/김락현 기자)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하는 사람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들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북도는 현재 42개 종목(국가지정 12개 종목, 도지정 30개 종목), 47명의 보유자와 14개의 보존회(국가지정 4개 종목, 도지정 10개 종목)가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중심이 되는 개인종목(국가지정 8개 종목, 도지정 2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들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전승·보존을 위해 전승지원금 지급, 전수교육관 운영 등 적극적인 무형문화자산에 대한 유지관리, 무형문화재 인프라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의 손길이 부족한 무형문화재가 다수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자료를 한 국회의원이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유자가 없어 빛을 잃은 문화재가 6개 종목, 전수조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재가 26개 종목이며, 이수자가 없는 문화재도 3개 종목이나 된다.
이렇듯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생활의 현대화로 전통문화 전승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길게는 수 백 년을 이어온 우리의 문화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무관심으로 그 찬란한 빛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단 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선조들의 유산을 후대에 전할 수 없다면,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조들의 유산을 후대에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향토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경북 장인들의 일상과 삶의 공간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중한 우리의 전통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열일곱부터 70여 년 간 전통 무명짜기 전통을 이어온 백문기 장인.(사진/김락현 기자)
‘냇물 건너가서 쑥대밭을 쫓아내고 / 한쪽에는 뽕을 심고 한쪽에는 목화 심고 / 뽕잎일랑 누에 치고 목화송이 솜을 타서 / 고치고치 새 고치를 오리오리 잦아내어 / 모슴모슴 뽑아내어 무명명주 짜내보세’
경상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 무명짜기 기능보유자인 백문기(86·여) 장인이 1995년 직접 지은 노래 ‘두리실 베틀노래’이다. 노래 도입부의 냇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두의천을 말한다.
꽃 같은 나이 열일곱에 안동권씨 문중으로 시집온 이후 한시도 손에 놓은 적 없는 길쌈과 베틀은 그의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서두른 결혼이었다. 배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어린 신부를 기다린 건 남편과 길쌈이었다.
‘촤르르륵’, ‘찰탁탈탁’, 시집온 이후 1년 365일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늘 실과 베틀 돌아가는 소리는 그의 곁에 맴돌았다.
이 소리는 지난날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들의 삶을 대표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누구나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육아와 가사, 그리고 생계까지 꾸려가야 했던 여인들의 한숨과 애환이 담긴 소리이기도 하다. 그건 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요즘이랑은 달라. 서럽던 한스럽던 식민치하에서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 한글을 쓰거나 우리말을 하면 가차 없이 학교에서 벌을 받았어. 더욱이 나는 국민학교(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
또 그가 시집온 70여년 전만해도 집안 여자들에게 바깥일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길쌈 잘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논밭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촌에서 길쌈은 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경제활동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목화를 재배해 무명을 짜기 시작한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이후 일제시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통직물인 무명, 의복의 재료 이외에도 이불 재료나 기타 생활용구를 만드는 재료로 가장 많이 이용됐다.
무명짜기 기법이 그가 시집온 성주 용암면의 두리실마을에 도입된 시기는 15세기경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때부터 500여 년 동안 목화재배 및 무명짜기 기법을 이어오고 있다.
안동권씨 집안은 대대로 여인들이 길쌈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름난 길쌈꾼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동서지간이었던 명주짜기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된 고(故) 조옥이 선생으로부터 전통길쌈 기법을 전수 받았으며, 마을의 자연적 조건을 이용해 양질의 목화를 재배했다.
그는 “처음엔 문중 손윗동서들이 길쌈하는걸 보니까 막막했다”며 “기껏해야 집에서 바느질 조금 해본 게 다인 내가 어떻게 저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백문기 장인(오른쪽)과 전수자인 질부 안옥란 할머니.(사진/김락현 기자)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을 좋아하던 그의 솜씨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이었다. 문중 여인들 중 길쌈 잘하기로 손에 꼽힐 실력이 됐다.
그렇게 70여 년 전부터 그는 뛰어난 기법으로 연간 5필 이상의 9∼10새 무명을 짜고 있으며, 1988년·1989년·1998년 전승공예대전 직물부분에서 입선과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질부와 함께 500여년 전통 무명짜기 명맥 이어가
특히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사랑채에 대대로 물려받은 베틀을 항시 설치해 두고 집을 찾아오는 손들에게 작업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사랑채에 놓인 베틀은 시집왔을 때부터 사용해온 것”이라며 “베틀은 요즘 기계들처럼 쉽게 고장 나지 않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말했다. 그의 손때가 묻은 베틀엔 여기저기 오랜 세월의 흔적도 묻어있다.
제작과정은 목화재배와 수확, 씨앗기와 솜타기, 고치말기, 실잣기, 무명날기, 베매기, 무명짜기 순으로 나뉜다. 씨앗기와 솜타기는 목화에서 씨를 빼내고 솜활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솜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다. 고치말기는 솜을 말판 위에 펴놓고 말대로 비비는 과정이며, 실잣기는 물레를 이용해 실을 뽑고, 뽑은 실을 가락에 감는다.
무명날기는 실의 굵기에 의해 한 폭에 몇 올이 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이다. 무명날기가 끝난 날실을 팽팽하게 하는 베매기와 풀 먹이기 과정을 거친 후 베틀을 이용해 무명을 짠다.
이 같은 작업은 1년 내도록 반복된다. 4월 하순 곡우를 전후해 목화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해 5월에 목화를 솎고 김매기를 하고, 6월에 목화순을 잘라주고 다시 김매기를 한 후 10월 초에 목화송이를 수확한다. 9월 중순이면 목화솜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밭에서 딴 목화는 11월에 고르기와 씨앗기, 12월에 솜타기와 고치말기, 이듬해 정월에 실잣기, 3·4월에 실뽑기, 날기, 매기, 꾸리감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베를 짤 준비가 끝난다. 농사는 농한기라도 있지만 길쌈은 한가할 여가가 없는 고된 노동이다.

▲고된 무명짜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백문기 장인의 손.(사진/김락현 기자)
“시간 여유라곤 없어. 부엌에서 밥 한 숟가락 뜨면 또 일하러 가야 했지. 마실도 못가고 경로당에 화투 치러도 못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질부 안옥란(75·여)할머니는 “화투 치러 갈 시간은커녕 화투 배울 여가도 없었다”며 웃었다. 안씨는 30여 년 전부터 그에게서 무명짜기를 전수받고 있다.
이처럼 무명 1필은 온몸을 이용한 힘든 노동과 한 올 한 올에 쏟은 정성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광폭직기들이 빠른 속도로 각종 화섬직물들을 대량으로 짜내고 있으니 전통 무명짜기는 점차 잊혀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그와 안옥란 할머니는 일흔과 여든을 넘긴 고령이고, 그들의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젊은 사람도 없다고 했다. 전통 무명짜기는 재래식 수공업이라 너무 힘들고, 그 노동력에 비해 수익성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나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 무명짜기 기술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식구들이고 동네사람들이고 이제 그만하라고들 하지만 열일곱부터 해오던 일은 손에서 놓는 게 어디 쉽겠어?”
집안 내력과 생계를 위해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그의 곁으로 7번이나 강산이 바뀔 정도로 세상은 변했다. 또 집집마다 한 대씩 있던 베틀과 쉽게 볼 수 있었던 무명짜는 모습은 어느덧 한 마을, 한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풍경이 됐다. 하지만 스스로 지은 노래처럼 그는 오늘도 여전히 무명을 짜며 지난 세월과 시름을 덜어내고 있다. (경북=김희정 기자)






















![[내예기] “AI부터 애니메이션까지”…‘똑똑한 홍보’ 정조준한 롯데칠성음료](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39431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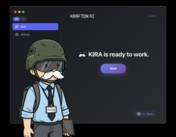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