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도기천 편집국장)

앨런 룬드, 가장 놀라운 귀를 가진 지휘자.
프랭크 가브린, 남편 품에서 숨을 거둔 응급실 의사.
마르코 디프랑코, 말문이 막힌 적 없던 경찰관.
미구엘 마르테, 오클랜드 에슬레틱스 소속 전직 마이너리그 선수.
조나단 페레이라, 인류학 학위 취득을 추구한 청년.
마이크 필드, 9·11 테러 당시 응급의료요원.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4일자 1면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로 채웠다. 미국 내 사망자 10만여명 중 1천명의 이름을 촘촘히 나열했다. 기사나 사진, 그래픽 하나 없이. 신문은 “이들은 우리였다”고 추모했다.
작년 11월 21일자 경향신문 1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덮였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제목의 기사는 “매일 ‘김용균’(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이 있었고, 내일도 ‘김용균’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앞에서 잊었던 게 있다. 사람이다.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이태원이냐 신천지냐, 몇명이 발병했나, 동선이 어디냐를 따진다. 도대체 왜 거기를 갔냐는 비난도 빠트리지 않는다.
감염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사망자가 어떤 삶을 살다 떠났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들이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나이고 동생임을 알지 못한다. 앱으로 확인하는 확진·사망자 숫자는 그저 매일 올라가는 그래프일 뿐이다.
CNB 또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CNB뉴스가 코로나에 대해 첫 보도를 시작한 것은 1월21일이다. 이후 6월3일까지 생산한 코로나 관련 기사는 2411건에 이른다. 한달에 500건 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대부분이 확진자 현황과 보건당국의 대응, 발병 사례, 자자체·기업의 지원, 코로나로 달라진 소비문화 등에 관한 것들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 끝없고 힘겨운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은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다. 혹독한 병마와 싸우는 이도 사람이고, 더불어 고통을 나누는 이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루 수백명씩 감염자가 나오던 대구·경북으로 달려간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졸업식을 마치자마자 대구에 투입된 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 엄청나게 늘어난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끼니를 거르고 뛰어다닌 택배종사자들, 재난지원금을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은 수많은 서민들, 헌혈에 동참한 시민들, 주말을 반납한 공무원들….
세계가 칭송하는 ‘K방역’은 보건당국의 첨단역학조사와 ICT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사람 공동체’가 만들어낸 눈물겨운 성과다.
마침 6월이다.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은 공동체의 발로였다. 회사원들은 학생시위대를 지지하기 위해 건물 창문 밖으로 두루마기 휴지를 늘어뜨렸고, 중년의 여성들은 아들 또래 전경들 가슴에 꽃을 달아줬다. 교회 사찰 성당은 저항의 의미로 타종을 했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다. 서슬퍼런 군부독재 총칼을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무기로 무너뜨린 현대사 최초의 사건이었다.
우리가 마주한 저 병마는 어쩌면 군부독재보다 더 혹독한 존재일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백신이 바로 ‘우리’임을 의심치 않는다. 매일 바뀌는 확진자 사망자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웃이고 가족이고 나의 이야기임을 잊지 않는 한, 33년전 그날처럼 우리는 또 해낼 것이다.
(CNB뉴스=도기천 편집국장)





















![[내예기] ‘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들…시공 넘어 운영까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6/art_1713492683_176x135.jpg)

![[데스크칼럼] 4.19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6/art_1713316995_176x135.jpg)
![[가보니&비즈] “샀으면 가져가세요”…작품 파는 현대백화점 ‘아트 투 고’ 방문기](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6/art_1713249457_176x135.jpg)



![[가보니&비즈] “암표 상상불가”…현대카드, ‘NFT 티켓’으로 전시회 열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6/art_1713331786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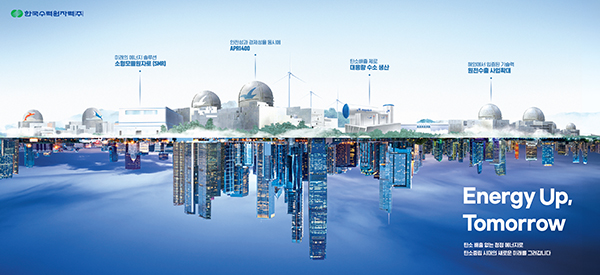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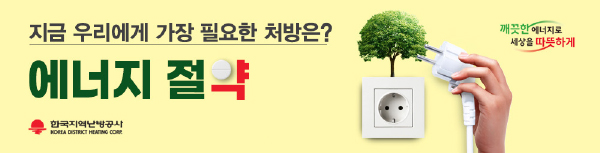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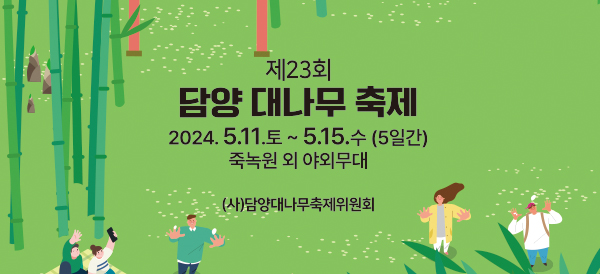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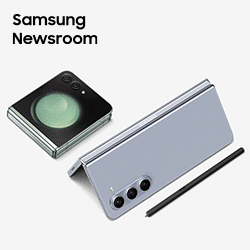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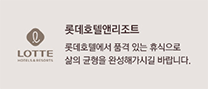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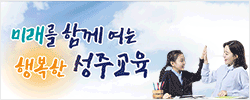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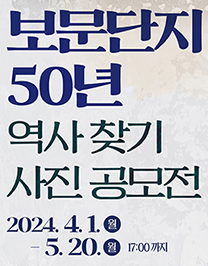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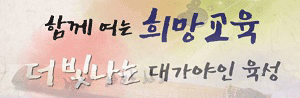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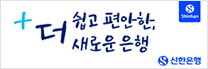





![[내예기] ‘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들…시공 넘어 운영까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6/art_1713492683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