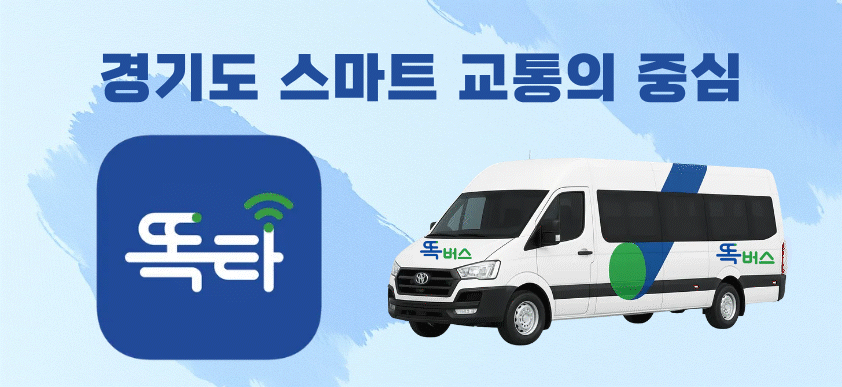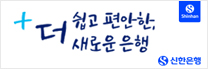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으나 노조의 출근저지투쟁에 막혀 일주일이 지난 현재(9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의 반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 언제쯤 정상적 업무개시가 가능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논리는 간명하다. 윤 행장이 ▲외부에서 투입된 낙하산 인사이고 ▲정통 금융인이 아닌 관료 출신이라는 점 ▲지난 10년간 3번에 걸쳐 내부인사 임명이 이뤄져 관행으로 정착됐는데 외부인사를 내려꽂는 건 ‘관치금융’으로의 퇴보라는 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엔 낙하산에 반대하다 자신들이 집권한 후엔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다.
알기 쉬운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도 노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대중 여론도 청와대나 여당에 호의적이지 않다. 자칫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문재인 정부의 패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상 일이 과연 그렇게 간단명료할까?
금융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기업은행 낙하산 논란이 어쩌면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노조의 ‘조직이기주의’의 발현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업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정부가 정책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은행이다. 민간은행과는 달리 수장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런 이유로 역대 기업은행장은 대부분 재무 관료들 몫이었다.
기업은행 내부인사가 수장이 된 경우는 2010년 이전까지 2회에 불과했고, 이후 10여년간 조준희(2010~2013), 권선주(2013~2016), 김도진(2016~2019) 등 3명이 내부 출신 수장이었다.
그런데 내부 출신이든 외부 출신이든 간에 리더십과 실적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국책은행 특성상 금융당국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다들 무난하게 임기를 마쳤다.
바로 직전 행장이던 내부 출신 김도진 전 행장의 경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은행이 ‘금융권 적폐’로 지목되고, 김 전 행장의 조기 교체가 거론됐지만, 임기는 별탈없이 마무리됐다. 임기 동안 실적도 많이 향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이 더 많다. 외부 출신인 2010년 이전의 행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대부분의 조직은 자체 개혁이 어렵다. ‘고인 물’ 조직에 변화와 혁신의 기풍을 불어넣으려면 인적 쇄신,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외부 인력 수혈도 그 일환이다. 단순히 ‘낙하산은 나쁘다’는 논리로만 접근하면, 히딩크 감독의 2002년 성공도,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성공담도 불가능해진다.
‘순혈주의’는 대부분의 경우 조직을 망치기 십상이다. 그 조직이 국책은행이라면 더욱 그렇다. 노조를 비롯한 기업은행 구성원들은 ‘낙하산’이라는 자구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중정상회담] 새 판다 한쌍 광주동물원 오고, 한중가요제 부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2/art_1767750325_176x135.jpg)

![[내예기] “K-참치 넘어 K-연어”…‘연어 수출국’ 꿈꾸는 동원그룹](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2/art_1767659652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