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투운동(Me Tooㆍ나도 당했다)으로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처음으로 폭로한 이후 2달 만에 문화계·연예계·정치계 등으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더 충격인 것은 도덕적으로 투명한 진보진영에서 발생했기 때문. 문화계 이윤택 연극 연출가를 비롯해 고은 시인, 김기덕 감독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봉주 서울시장 예비후보,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 등 진보진영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권력 중심축이 바뀌면서 그동안 쉬쉬했던 도덕성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보았다.
이번사태를 놓고 혹자는 일련의 흐름을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투운동이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계략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미투운동의 본질은 ‘진보진영의 권력형 나르시시즘’으로 귀결된다.
남·여 막론하고 유명 진보 인사가 권력이라는 힘으로 약자에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지칭)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해 저항하고자 미투운동이 탄생했다.
미투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보 진영에서 유독 도덕성을 내세운 데에 대한 환멸감이 컸기 때문. 실제로 지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도덕성 면에서는 크게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금 시점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은 운동권 세력이 부르짖었던 민주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권력체제는 보수와 진보 구도로 양분화되어 있다. 이 구도는 30년 전 민주화운동과도 맞닿아 있다. 1970년대 당시 민주화를 외쳤던 운동권 세력들은 공안정권의 탄압을 피해 음지로 숨어 다녀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던 남성들은 자신의 억눌렸던 복합적 욕망을 동지라는 이름의 여성들에게 쏟아 부었다는 얘기가 후일담으로 들린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여성들은 왜 저항하지 못하고 쉬쉬했던 것은 직접 폭로하고 싸우기에는 권력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이 염원했던 민주주의 시대가 오고 그들은 어렵게 권력을 쟁취했다. 하지만, 이들도 보수 세력의 별반 다르지 않았다. 권력에 취해 그들을 뒤따르는 힘없는 직원(정치권에서는 참모)을 향한 성폭력을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밝히면 이 바닥에 설 수 없게 만들겠다’,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괘념치 말아라’, ‘너만 눈감으면 덮을 수 있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 암암리에 행해져왔고, 권력자를 둘러싼 문고리 측근들은 권세를 향한 야망에 눈이 멀어 피해자들의 절규는 애써 외면했다.
어쩌면 이런 관행이 당연시됐던 일종의 정서가 무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혔다. 표면적으로는 철저하게 도덕성을 부르짖었던 반면 음지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욕망을 채웠던 이중성이 이제야 표출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권력형 나르시시즘이 쉽게 해체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전문가들도 “미투운동이 개인의 도덕성에 포커스를 둔다면 ‘미 퍼스트’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윤리에 의해 해결되어선 안 되며, 이럴 때일수록 조직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직이라는 방패를 통해서 성폭력 대처 방법을 훈련하고 목소리를 낼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준다면 ‘미 퍼스트(Me firstㆍ성폭력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겠다)’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갤럽] '이재명 무죄 주'에 윤 탄핵 찬성>반대 차이, 19%p로 최대 벌어져](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3128018_176x135.jpg)
![[생생르포]](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3133388_176x135.jpg)

![[CNB뉴스 위클리픽-IT] SK텔레콤, 美 스타트업과 협력…글로벌 AI 리더십 강화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3121859_176x135.jpg)
![[ESG경영시대(121)] CJ대한통운, 전국 ‘오네’ 배송망이 순환경제 인프라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3121181_176x135.jpg)
![[ESG경영시대(120)] “금융으로 이롭게”…우리카드의 녹색 동행](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3040006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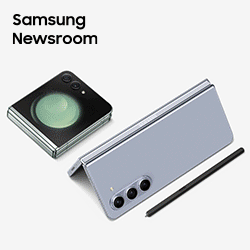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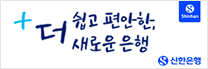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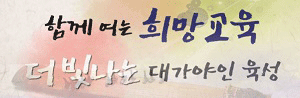












![[갤럽] '이재명 무죄 주'에 윤 탄핵 찬성>반대 차이, 19%p로 최대 벌어져](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313/art_1743128018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