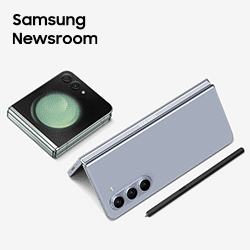▲키부티 作
키부티는 누구인가
키부티(1947~)는 세계 미술계에서 탄자니아의 릴랑가(Lilanga)와 함께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케냐의 작가로 손꼽힌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키부티는 비누와 목탄 판매로 생계를 꾸리다가 사파리의 요리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취미에 불과했던 그림은 그가 29살이 되던 해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저자 카렌 블릭센을 만나면서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키부티는 인간과 자연의 의미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모습을 독특한 색채로 풀어내고 있다. 몇몇의 서양 평론가들은 그를 “단순하게 살며, 단순한 작품을 만드는, 단순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키부티는 자신의 뿌리인 아캄바(Akamba)족의 일상과 설화를 오랫동안 그려 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미술계의 흐름과 컬렉터들의 취향에 부합되지 않는 색연필과 잉크를 고집한 것도 결국 그의 독자성과 순수한 심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키부티가 말하는 초자연이란?
키부티는 ‘초자연(supernature)’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초자연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먼저 교화되었기에 동식물을 아우르고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을 지녔다고 한다. 인간 간은 물론 인간과 자연과의 하모니(harmony)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인간과 자연의 존재의미로 부각시키는 것이 초자연이라는 것이다.
초자연의 내용은 서로 다른 세계들 간의 하모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고픈 하이에나에게는 먹이를 주며 남의 먹이를 함부로 뺐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이에나는 먹이 때문에 인간의 곁에 머무르지만,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인간을 지켜주는 관계로 전환된다. 이때 하이에나는 초자연이 된다.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서로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이다. 키부티는 낮잠을 자고 있는 개를 응시했다. 개의 조상에 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초자연의 범주는 식물에게까지도 확대된다. 키부티의 시선이 나무로 향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나무에는 새가 앉아 있고, 주변에는 인간과 동물이 있다. 간혹 나뭇가지를 이고 가는 원숭이도 보인다. 나무는 동물에게 휴식처를, 그리고 인간에게 땔감을 제공한다. 그래서 나무는 초자연이 된다. 주변의 모든 것도 초자연이 된다. 나무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인간과 동물은 나무의 씨를 널리 퍼뜨리기 때문이다. 키부티는 우리들의 세상에 나무가 없어지는 이유는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란다. 결국 하모니다.
초자연의 궁극성은 땅에서의 평화이다. 키부티는 물이 충만한 곳에서 인간과 동물이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 물이 바로 초자연이 되는 순간이다. 보라색의 땅은 초록색으로 감사해하고, 나무는 잎으로 감사해하고, 그리고 흩어진 동물들은 한곳으로 모여짐에 감사를 드린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감사를 드리는 평화의 세계이다. 초자연이다. 키부티를 가슴 벅차게 하는 것, 평화가 바로 키부티의 궁극성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키부티의 존재의미이기도 하다.
정해광 (아프리카미술관 관장·철학박사)
























![[유통통] 여전한 프리미엄·달라진 과일세트…백화점 설 선물세트 뜯어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103/art_1736994505_176x135.jpg)